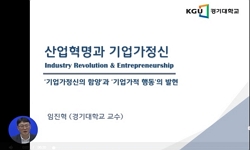대개의 문학사들은 1922년, 1923년 즈음을 침체기로 규정하면서도 문학의 발표 공간으로서 『개벽』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당시는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이 일단의 막을 내린 시기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 Between 'the literature' of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proletaria, and < Gae-byeok >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736877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
-
주제어
『개벽』 ; 동인지 ; 문예면 ; 방정환 ; 천도교 ; 문단 ; 혁명 ; ‘문인회’ 등 ; < Gae-byeok > ; literary coterie magazine ; the literary section ; Bang Jung-Hwan ; Chon-Do-Gyo ; literary world ; revolution ; Literary Society ; etc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61-194(34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대개의 문학사들은 1922년, 1923년 즈음을 침체기로 규정하면서도 문학의 발표 공간으로서 『개벽』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당시는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이 일단의 막을 내린 시기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에도 문학을 위한 공간은 할애되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관심은 지속되지는 않았다. 『개벽』 문예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22년 중반인데, 그것은 새로운 필진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문예면에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문예특집’에 가깝게 꾸며진 1923년 신년호였다. 이전까지 문예면의 필진은 ‘개벽사’의 사원이거나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은 방정환이었는데, 그는 천도교의 간부로 일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다. ‘동경’ 유학을 통해 문학이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된 방정환은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견인해 근대문학의 토양을 마련하려 했다. 그런데 1923년 1월 이후 『개벽』 문예면에서 필진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예면의 변화가 한계를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기진은 『개벽』에 일련의 글을 발표하면서 조선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정초해 나갔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학을 그 도구로 위치시켰지만 곧 환멸에 빠지고 만다. 당시 취업을 위해 ‘매일신보사’를 찾아간 행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새로운 경향’의 문학에 대한 모색이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개벽』 문예면의 개방이 몇몇의 문인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점 등은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벽』 문예면의 음영을 되짚어 보는 작업은 문학과 생활의 관계에 대해 거듭 환기하고자 했던 ‘문인회’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1922 and 1923 are regarded as stagnation periods, bet < Gae-byeok > was admitted as a space for presentation of literature. At that time, the literature of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1920s almost ended. Also, ...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1922 and 1923 are regarded as stagnation periods, bet < Gae-byeok > was admitted as a space for presentation of literature. At that time, the literature of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1920s almost ended. Also, there was no space for literature in the newspaper media. The media was interested in literature and writers, but it was not persistent. It was in mid-1922 that the literary section of the < Gae-byeok > changed. It was the issue of January 1923 that symbolically showed the change of the literary section. Previously, the writer was an employee or related person of < Gae-byeok >. The person who led the change in the literary section was Bang Jung-Hwan. He took an interest in literature while working as an executive at Cheon-do-gyo. He realized the status of literature anew through studying in 'Tokyo'. Since January 1923, the change of the literary section has not continued. The first reason was that there was no category of ‘literary world’ at the time. The following reason is that < Gae-byeok > was published as a Chon-Do-Gyo's journal.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opening of the literary section was achieved through human interchange. Kim Gi-jin published a series of articles in < Gae-byeok >, which was the process of pioneering 'new trend' literature in Joseon. He emphasized the proletarian revolution, but soon fell into disillusionment. His visit to < Mae-Il Newspaper > for a job is also related to this. It was contradictory that the claim of revolution was made in < Gae-byeok >, which paid expensive manuscript fees.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 opening of the literary section was limited to a few people. Discussing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ry section of < Gae-byeok > brings to mind the arguments of the 'Literary Society'.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화, "歷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三慶出版社 1979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3 박현수, "프로문학의 제도적 연원 - 김기진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소 (60) : 259-295, 2016
4 "폐허이후"
5 "폐허"
6 "청춘"
7 "천도교회월보"
8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80년사" 글나무 2000
9 "창조"
10 "조선일보"
1 박종화, "歷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三慶出版社 1979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3 박현수, "프로문학의 제도적 연원 - 김기진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소 (60) : 259-295, 2016
4 "폐허이후"
5 "폐허"
6 "청춘"
7 "천도교회월보"
8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80년사" 글나무 2000
9 "창조"
10 "조선일보"
11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문제연구소 (78) : 322-357, 2007
12 "조선문단"
13 "조광"
14 한기형, "잡지 『新靑年』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회 26 : 2002
15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 『근대사조』 『삼광』 『폐허』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16 前田愛, "일본근대독자의 성립" 이룸 2003
17 "유심"
18 Pierre Bourdieu,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1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20 "어린이"
21 "신천지"
22 "신동아"
23 "시대일보"
24 "세대"
25 민족문학사연구소, "새 민족문학사강좌 2" 창비 2009
26 "별건곤"
27 "백조"
28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미공개월탄일기평설" 성균관대 출판부 1992
29 이동희, "박영희 전집 Ⅱ" 영남대 출판부 1997
30 "매일신보"
31 "동아일보"
32 "동명"
33 "대한일보"
34 홍정선, "김팔봉문학전집 Ⅱ" 문학과지성사 1988
35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36 "개벽"
37 민규호, "韓國言論人物史話: 8・15前篇 上" 大韓言論人會 1992
38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성문각 1969
39 鳥越信, "近代日本兒童文學史硏究" おうふう 1994
40 仲村修, "方定煥硏究序論-東京時代を中心に" 14 : 1999
41 紅野謙介, "文化の市場:交通する" 東京大學出版部 2001
42 藤田圭雄, "兒童文學" 有精堂 1977
43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44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23) : 27-59, 2005
45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와 문학의 교차 -필화사건, ‘문예특집’, ‘문인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소 (74) : 295-331, 2020
46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에서 나도향 소설의 위치-『동아일보』, 『개벽』 등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42 : 231-266, 2014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芳村弘道 ( Yoshimura Hiromichi )
- 2021
- KCI등재
-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劉薔 ( Liu Qiang )
- 2021
- KCI등재
-
한국 소장 중국 간본(刊本) 통속소설에 대한 술론(述論)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潘建國 ( Pan Jian-guo )
- 2021
- KCI등재
-
19세기 환곡(還穀)의 고갈과 고리대적(高利貸的) 운영 강화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林成洙 ( Im Seong-soo )
- 2021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4-08-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EDONG MUNHWA YEON'GU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6-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te of Eastern Studies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9 | 1.09 | 0.9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5 | 1.776 | 0.3 |




 KCI
KCI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