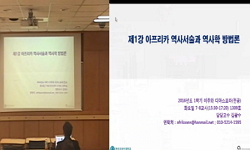Phenomenon of increasing migration from Seoul to Jeju is considered a social practice of decentralization, urging you to “escape from Seoul” and even “escape from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social subconsciousness of this phenomen...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258800
-
저자
김명진 (연세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일상성 ; 제주 ; 이주 ; 헤테로토피아 ; 헬조선 ; 반공간 ; 비장소 ; Everyday Life ; Jeju ; Migration ; Heterotopia ; Hell Joseon ; Counter-Space ; Non-Place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137-161(25쪽)
-
KCI 피인용횟수
6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ct that migration to Jeju has been a big lifestyle craze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in 2010s is related to the discourse of “Hell Joseon(Hell Korea)” In this context, Jeju is not just a place with spectacular views, but also a dream land that is outside the harsh socioeconomic order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ucault’s Heterotopia is a situated middle-zone between unrealistic utopia and realistic dystopia. Heterotopia Jeju functions as both “counter-space” and “non-place” against the undesirable reality, embodying a set of Heterotopian principles such as an objection, deviation, heterochrony, isolation/exclusion, and reverie.
Through investigating how the migrants constitute Heterotopian narrative in their daily life, we can discover the continuing resistant discourses spatially practiced in a form of alternative lifestyle. Ultimately, this will lead us to outline how social discourse is constructed and circulated as cultural narrative along with the everyday life practice of ordinary people.
Phenomenon of increasing migration from Seoul to Jeju is considered a social practice of decentralization, urging you to “escape from Seoul” and even “escape from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social subconsciousness of this phenomenon along with the concept of Heterotopia suggested by Michel Foucault, analyzing narrative of Jeju migrants in books published in 2014-2016. This methodology is based on a social psychological premise that the social phenomenon is constructed by ordinary people’s everyday life practice with deep emotional structure, a type of archetype.
The fact that migration to Jeju has been a big lifestyle craze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in 2010s is related to the discourse of “Hell Joseon(Hell Korea)” In this context, Jeju is not just a place with spectacular views, but also a dream land that is outside the harsh socioeconomic order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ucault’s Heterotopia is a situated middle-zone between unrealistic utopia and realistic dystopia. Heterotopia Jeju functions as both “counter-space” and “non-place” against the undesirable reality, embodying a set of Heterotopian principles such as an objection, deviation, heterochrony, isolation/exclusion, and reverie.
Through investigating how the migrants constitute Heterotopian narrative in their daily life, we can discover the continuing resistant discourses spatially practiced in a form of alternative lifestyle. Ultimately, this will lead us to outline how social discourse is constructed and circulated as cultural narrative along with the everyday life practice of ordinary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헬조선’ 담론이 부상한 2014년을 전후로 제주이주는 이미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는데 이때의 제주는 ‘육지’로 대변되는 대도시, 서울, 나아가 한국적인 삶에 대항하기위한 실천적 공간이자 삶의 양식으로 표상된다. 그것은 현실세계라는 디스토피아에대항하는 실천적 공간인 동시에 상상적 유토피아의 실현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현실적 장소로 실재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와 신화의 세계,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가 교차하는 혼종적 성격의 헤테로토피아를 암시한다. 나아가 제주이주 서사속에서 포착되는 이의제기, 일탈, 헤테로크로니아, 고립과 배제 같은 일련의 헤테로토피아적 특징들은 제주가 현 한국사회의 ‘반(反)공간’이자 ‘비(非)장소’적 기능을수행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감정구조와 조응하는 서사가 확산되고 그것이 다시 여타 문화콘텐츠의 자원으로 순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제주이주 현상을 탈(脫) 중심, 탈(脫)도시, 나아가 탈(脫)조선의 실천양식으로 규정짓고, 그 현상 이면에내재된 사회무의식의 구조적 ...
이 글에서는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제주이주 현상을 탈(脫) 중심, 탈(脫)도시, 나아가 탈(脫)조선의 실천양식으로 규정짓고, 그 현상 이면에내재된 사회무의식의 구조적 원형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2014-2016년 사이 출판된 제주이주 붐 1세대들의 이주체험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제주이주 현상에대한 사회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기존에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분석을 시도하는 대신 제주이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세계 및 정신세계 기록을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을 대중문화 담론이 아닌, 개인들의일상성에서 찾아보기 위함이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고백하듯 기록한 글에서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인식의 원형을 환기해 봄으로써, 제주이주를 우연히 나타난 개인들의 일시적 유행이나 대중문화 트렌드를 넘어 자발적 라이프스타일 기획과실천의 징후로 파악하고자 한다.
‘헬조선’ 담론이 부상한 2014년을 전후로 제주이주는 이미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는데 이때의 제주는 ‘육지’로 대변되는 대도시, 서울, 나아가 한국적인 삶에 대항하기위한 실천적 공간이자 삶의 양식으로 표상된다. 그것은 현실세계라는 디스토피아에대항하는 실천적 공간인 동시에 상상적 유토피아의 실현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현실적 장소로 실재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와 신화의 세계,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가 교차하는 혼종적 성격의 헤테로토피아를 암시한다. 나아가 제주이주 서사속에서 포착되는 이의제기, 일탈, 헤테로크로니아, 고립과 배제 같은 일련의 헤테로토피아적 특징들은 제주가 현 한국사회의 ‘반(反)공간’이자 ‘비(非)장소’적 기능을수행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감정구조와 조응하는 서사가 확산되고 그것이 다시 여타 문화콘텐츠의 자원으로 순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창,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2) : 107-158, 2016
2 Foucault, Michel,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3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 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한국미학회 83 (83): 105-141, 2017
4 "착한 여행 ‘효리네 민박’ 힐링의 천국인가"
5 김재이, "제주에서 당신을 생각했다" 부키 2016
6 손명주, "제주에서 2년만 살고 싶었습니다" 큰나무 2015
7 김민영,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연구원 (50) : 39-78, 2015
8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9 비하인드, "제주, 소요(逍遙)" 미래시간 2016
10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소 19 (19): 107-141, 2013
1 이우창,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2) : 107-158, 2016
2 Foucault, Michel,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3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 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한국미학회 83 (83): 105-141, 2017
4 "착한 여행 ‘효리네 민박’ 힐링의 천국인가"
5 김재이, "제주에서 당신을 생각했다" 부키 2016
6 손명주, "제주에서 2년만 살고 싶었습니다" 큰나무 2015
7 김민영,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연구원 (50) : 39-78, 2015
8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9 비하인드, "제주, 소요(逍遙)" 미래시간 2016
10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소 19 (19): 107-141, 2013
11 "유배는 감금 아닌 힐링…이왈종-이효리처럼 ‘셀프 유배인’ 늘어"
12 Maffesoli, Michel, "영원한 순간" 이학사 2010
13 "성인 10명 중 7명은 ‘탈조선’을 꿈꾼다…가장 이민가고 싶은 나라는?」"
14 Augé, Marc, "비장소" 아카넷 2017
15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6 김동윤,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원천으로서의 일상성․원형․상상력 - M. 마페졸리의 포스트모더니티 개념을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학회 (43) : 73-98, 2016
17 태지호, "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의 토대에 대한 모색: ‘문화’와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인문콘텐츠학회 (41) : 75-96, 2016
18 "매년 많게는 79권까지…출판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민섬 제주"
19 Foucault, Michel,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20 이신아, "당신도 제주" 루비콘 2014
21 Williams, Raymond,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22 Lefebvre, Henri,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23 이민영, "‘헬(hell)조선’ 탈출로서의 장기여행: 인도의 한국인 장기여행자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소 22 (22): 291-328, 2016
24 통계청, "2017년 3월 국내 인구 이동"
25 통계청, "2013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26 은지희, "2000년대 한국 독립출판물 생산자 연구-미디어ㆍ문화 생산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6
27 "'“조센징이라 센송하무니다”… 부조리 사회 냉소하는 젊은이들"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인문콘텐츠학회
- 박치완
- 2018
- KCI등재
-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에 재현된전통문화의 변용 양상 연구
- 인문콘텐츠학회
- 염원희
- 2018
- KCI등재
-
한ㆍ일 영상콘텐츠의 원형성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분열형태적 구조와 신비적 구조의 대비 -
- 인문콘텐츠학회
- 유제상
- 2018
- KCI등재
-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 -
- 인문콘텐츠학회
- 장충희
- 2018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9-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2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1 | 1.17 | 2.031 | 0.23 |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