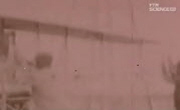ꡔ언어로의 도상ꡕ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작품의 제목은 그의 존재사유의 핵심적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이데거 ꡔ언어로의 도상ꡕ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28666
- 저자
-
발행기관
-
-
발행연도
2004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하이데거 ; 언어로의 도상 ; 논구 ; 장소 ; 시 ; 시적 작품 ; 시에 대한 논구 ; 시인의 위대함의 척도 ; 규명 ; 사유와 시작의 대화 ; 나그네 ; 영혼 ; 영혼에 대한 통념 ; 몰락 ; 노을 ; 해(年) ; 푸른 하늘 ; 성스러움 ; 푸른 들짐승 ; 고통 ; 이성적 동물 ; 방랑객 ; 죽은 이 ; 이제까지의 인간 ; 정신적 노을 ; 푸른 영혼 ; 남들 ; 족속 ; 부패하는 족속 ; 세상을 여읜 이 ; 저녁 ; 광인 ; 어려서 죽은 이 ; 소년 엘리스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 시간 ; 원초 ; 통상적 시간 ; 참된 시간 ; 거룻배 ; 정신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존재는 자신을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언어로서 다가온다. 존재는 항상 ‘언어로의 도상’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일 수 없다. 언어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인간에게 침묵으로 다가오는 존재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언어에 응답함으로써 존재의 무언(無言)의 낱말을 자신의 언어로 가져와야 한다. 존재의 언어에 대한 응답이 곧 인간의 본질적 언어가 된다. 따라서 ‘언어로의 도상’은 이중적 사태를 의미한다. ‘언어로의 도상’은 한편으로는 존재가 자?탔?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언어로서 다가오는 사태를 의미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도래하는 존재의 언어에 육박하여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가져오는 사태를 의미한다.
인간 현존재는 언어로의 도상에 있다.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말 걸어오는 존재의 무언(無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감추어진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존재사유는 자신을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도래하는 존재의 언어에 응답함으로써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하는 것이다. 존재‘의’(of) 사유란 존재에 ‘의한’(by) 존재를 ‘위한’(for) 사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발견한다. 존재가 언어로서 인간에게 현성하는 한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인간 현존재는 ‘?맛瑛? 집’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인간 현존재는 이미 존재의 개방성 안에 피투되어 있다면, 인간 현존재의 본질은 존재의 언어를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심려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도 ‘언어로의 도상’과 마찬가지로 이중적 사태를 의미한다. 즉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는 한편으로는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존재가 머무는 ‘집’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의 빛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가옥, 다시 말해 존재자가 비로소 인간 현존재에게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인간의 가옥인 것이다.
이상에
ꡔ언어로의 도상ꡕ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작품의 제목은 그의 존재사유의 핵심적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를 관계(Verhältnis)로서 규정한다. 인간 현존재의 존재이해의 근원은 인간 현존재를 향한 존재의 끊임없는 도래이다. 그러니까 ꡔ존재와 시간』에서의 피투성(被投性)이 ‘나의 존재에로의 피투성’이라면, 후기 하이데거에게서의 피투성은 ‘존재에로의 피투성’이 된다. 즉 존재가 인간 현존재에게 끊임없이 도래하면서 인간 현존재를 붙들어 놓고 자신에게로 결집하고 있는 한 존재 자신은 관계(Verhältnis)인 것이고, 인간 현존재는 이러한 존재의 개방성 안에 피투된 자로서 감추어진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면서 심려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재를 향한 존재의 도래를 특히 언어라고 명명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는 언제나 밝힘과 은닉의 이중적 구조 안에서 인간에게 도래하므로 언어는 ‘존재 자체가 자신을 밝히면서-은닉하는 도래의 사건’으로서 규정된다.
존재는 자신을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언어로서 다가온다. 존재는 항상 ‘언어로의 도상’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일 수 없다. 언어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인간에게 침묵으로 다가오는 존재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언어에 응답함으로써 존재의 무언(無言)의 낱말을 자신의 언어로 가져와야 한다. 존재의 언어에 대한 응답이 곧 인간의 본질적 언어가 된다. 따라서 ‘언어로의 도상’은 이중적 사태를 의미한다. ‘언어로의 도상’은 한편으로는 존재가 자?탔?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언어로서 다가오는 사태를 의미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도래하는 존재의 언어에 육박하여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가져오는 사태를 의미한다.
인간 현존재는 언어로의 도상에 있다.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말 걸어오는 존재의 무언(無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감추어진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존재사유는 자신을 밝히면서 은닉하는 가운데 도래하는 존재의 언어에 응답함으로써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하는 것이다. 존재‘의’(of) 사유란 존재에 ‘의한’(by) 존재를 ‘위한’(for) 사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발견한다. 존재가 언어로서 인간에게 현성하는 한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인간 현존재는 ‘?맛瑛? 집’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인간 현존재는 이미 존재의 개방성 안에 피투되어 있다면, 인간 현존재의 본질은 존재의 언어를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심려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도 ‘언어로의 도상’과 마찬가지로 이중적 사태를 의미한다. 즉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는 한편으로는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존재가 머무는 ‘집’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의 빛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가옥, 다시 말해 존재자가 비로소 인간 현존재에게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인간의 가옥인 것이다.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