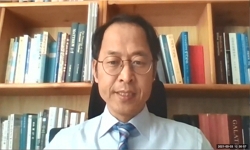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distinc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addition, they have had their own peculiar cultur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What regions have been physically designated as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contraste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ompared the Yeongnam region to Egypt and the Honam region to Greece. The Nakdong River that goes the way across the Yeongnam region is compared to the Nile River of Egypt; Mahan’s small “states” during the Samhan (three Han Federations) period to poleis of ancient Greece. Both Yeongnam and Honam regions are far from geographical, cultural homogeneity respectively. Within the regions exist geographical and cultural disparities. This study hopes that this historical comprehension of Yeongnam and Honam would ser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inhabitants and development of the two regions.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distinc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addition, they have had their own peculiar cultur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What regions have been physically designated as “Yeongnam” and “Honam”? What did the names originate in? The name of Yeongnam was first used in 995 (the 14th reign year of Goryeo King Seongjong), when the whole Goryeo territory was divided into 10 circuits (do) and the Yeongnam-do was created. Korean “Yeongnam” was named after the Chinese Tang dynasty’s Lingnan Province. In Korea, Yeongnam has been meant by the Gyeongsang region south of the Juk-ryeong and Jo-ryeong passes. The name of “Honam,” which has been meant by the Jeolla region, also originated in China’s Hunan Province. Korean documentary records demonstrate that the name of “Honam” was used later than that of “Yeongnam.” This study has examined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n the stele of Buddhist monk Jinpyo and supposed that around 1199 the name of Honam was used along with those of Yeongnam and Gwandong. Unlike the case of Yeongnam, regarding the definition of Honam, a divergence of views has emerged. This study understands it as an interpretational problem of how Goryeo introduced a Chinese name and used it to name a certain region. Indeed, Goryeo did not name specific regions on the basis of a fixed principle.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contraste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ompared the Yeongnam region to Egypt and the Honam region to Greece. The Nakdong River that goes the way across the Yeongnam region is compared to the Nile River of Egypt; Mahan’s small “states” during the Samhan (three Han Federations) period to poleis of ancient Greece. Both Yeongnam and Honam regions are far from geographical, cultural homogeneity respectively. Within the regions exist geographical and cultural disparities. This study hopes that this historical comprehension of Yeongnam and Honam would ser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inhabitants and development of the two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전라도를 뜻하는 湖南 또한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당나라 시대 또는 5대 10국 시대에 湖南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湖南 명칭의 사용 시기는 늦었다. 여기서는 『東國李相國集』에서 1195년 당시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그 모본이 된 眞表律師骨藏碑(1199년 건립)를 통해, 이 무렵에는 영남, 관동과 함께 호남의 명칭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영남과는 달리 호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湖의 의미를 김제의 碧骨堤나 제천 義林池, 錦江 등에 비정한 견해가 있었다. 처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 지명을 들여와 우리 국토에 적용시키려 한 데서 해석상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 이남으로 본 ‘금강이남 설’에 주목하였다.
영남과 호남의 지형은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국내적인 차원과 함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영남의 지형을 이집트와 비교하고, 호남의 그것을 그리스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하여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이집트의 나일강과 대비하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삼한시대 마한 소국과 비교해 보았다.
영남과 호남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영남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호남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이 같은 거시적 이해가 두 지역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영남과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한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
영남과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한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며 그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또 그 지역적 특징은 어떤 것일까? 嶺南이란 이름은 고려 성종 14년(995)에 처음 사용되었다. 전국을 10도로 편제하면서 불려진 嶺南道가 그것이다. 이는 당나라의 嶺南道에서 따온 것으로, 南嶺山脈 이남인 오늘날의 광동, 광서, 운남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영남은 대개 竹嶺과 鳥嶺 이남의 경상도 지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라도를 뜻하는 湖南 또한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당나라 시대 또는 5대 10국 시대에 湖南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湖南 명칭의 사용 시기는 늦었다. 여기서는 『東國李相國集』에서 1195년 당시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그 모본이 된 眞表律師骨藏碑(1199년 건립)를 통해, 이 무렵에는 영남, 관동과 함께 호남의 명칭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영남과는 달리 호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湖의 의미를 김제의 碧骨堤나 제천 義林池, 錦江 등에 비정한 견해가 있었다. 처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 지명을 들여와 우리 국토에 적용시키려 한 데서 해석상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 이남으로 본 ‘금강이남 설’에 주목하였다.
영남과 호남의 지형은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국내적인 차원과 함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영남의 지형을 이집트와 비교하고, 호남의 그것을 그리스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하여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이집트의 나일강과 대비하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삼한시대 마한 소국과 비교해 보았다.
영남과 호남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영남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호남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이 같은 거시적 이해가 두 지역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만규,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2 조성욱, "호남(湖南)의 기준점 호(湖)는 어디일까?" 5 : 2019
3 조성욱, "지명 ‘호남(湖南)’의 형성과 지리적 범위 변화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 14 (14): 199-211, 2008
4 범선규, "조선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 38 (38): 686-700, 2003
5 조상현,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한국사상문화학회 (91) : 129-153, 2018
6 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2016
7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8 윤홍기,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2011
9 이영호, "나일 강의 나라, 이집트를 가다" 29 : 2011
10 맥세계사편찬위원회, "그리스사" 느낌이 있는 책 2014
1 박만규,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2 조성욱, "호남(湖南)의 기준점 호(湖)는 어디일까?" 5 : 2019
3 조성욱, "지명 ‘호남(湖南)’의 형성과 지리적 범위 변화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 14 (14): 199-211, 2008
4 범선규, "조선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 38 (38): 686-700, 2003
5 조상현,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한국사상문화학회 (91) : 129-153, 2018
6 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2016
7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8 윤홍기,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2011
9 이영호, "나일 강의 나라, 이집트를 가다" 29 : 2011
10 맥세계사편찬위원회, "그리스사" 느낌이 있는 책 2014
11 윤경진, "고려전기 道의 다원적 편성과 5道의 성립" 국학연구원 (135) : 1-46, 2006
12 박종기,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13 윤경진, "고려 界首官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 ― 9州?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6) : 57-88, 2005
14 토머스 R. 마틴, "고대 그리스사" 책과 함께 2015
15 요시무라 사쿠지,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기행" 서해문집 2002
16 범선규, "高麗와 朝鮮의 道名稱과 地方의 別稱 –지형과 도회지 발달의 관점에서-" 14 (14): 2002
17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18 "高麗史節要"
19 尹京鎭,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20 "高麗史"
21 權赫在, "韓國地理 -우리 國土의 自然과 人文-" 법문사 2003
22 李基白, "韓國史像의 再構成" 일조각 1991
23 "磻溪隨錄"
24 金南允,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78 : 1997
25 "燃藜室記述"
26 노기춘, "湖南의 地域區分에 관한 연구" 호남학연구원 1 (1): 179-208, 2007
27 李乙浩, "湖南文化의 槪觀-하나의 序論으로서-" 2 : 1964
28 "桂苑筆耕集"
29 "東文選"
30 朴焌圭, "朝鮮 前期 湖南詩壇의 硏究" 25 : 1997
31 문경현, "新羅王京五岳硏究" 경주시·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32 "新唐書"
33 "增補文獻備考"
34 李丙燾, "地理 歷史上으로 본 湖南" 2 : 1964
35 김수태, "吉玄益敎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36 村上四男, "三國遺事考証(下之二)" 塙書房 1995
37 "三國遺事"
38 "三國志"
39 "三國史記"
40 仁求, "『譯註 三國遺事』 Ⅳ" 이회 2003
41 송일기, "‘호남학연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 설계" 국립중앙도서관 4 (4): 1999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박용국
- 2021
- KCI등재
-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우진웅
- 2021
- KCI등재
-
<天君紀>의 修養論 形象化, 그 志向價値에 대한 새로운 認識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신태수
- 2021
- KCI등재
-
‘최치원’의 전승과 광주 지산재 : 이지역성 탐색을 위한 시론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김경호
- 2021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23 | 통합 |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9 | 0.7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6 | 1.364 | 0.27 |




 KCI
KCI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