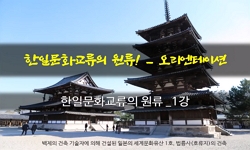백제는 마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도성의 동쪽 남한강을 따라 남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다. 이와 더불어 도성(풍납토성)의 서쪽으로는 탄천과 안양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결과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성천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 A Study on the Movements of the Mahan Forces in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 Hansung Baekje Period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7954369
-
저자
박경신 (숭실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안성천 ; 오산천 ; 원삼국시대 ; 마한 ; 백제 ; 사주식주거 ; 분묘 ; Anseong Stream(安城川) ; Osan Stream(烏山川) ; Proto-three Kingdoms Period(原三國時代) ; Mahan(馬韓) ; Baekje(百濟) ; four-pillar type dwelling(四柱式住居) ; tomb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9-62(34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 남부 안성천유역권의 마한 취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릉의 정상부→사면→말단부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한의 주거는 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비주식→사주식→호서형 사주식→비사주식 구조로 변화하고, 노시설은 편측 무시설식→부뚜막→외줄구들→기반토식 외줄구들로 발전한다. 사주식주거는 AD 2C 후엽 전후시점에 등장하여 AD 5C 전반까지 지속되며, AD 4C 중엽에는 호서형 사주식주거도 등장한다.
(원)삼국시대 안성천 본류 남쪽지역의 분묘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황구지천과 오산천은 등고선과 직교한 것이 다수이다. 이것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의 주축방향(직교)을 계승한 결과이다. 아울러 AD 2C대에는 안성천유역권에 주구 요소가 채용되는데 마한의 환황해노선 복원에 따른 서북한지역 묘제의 2차 파급 결과로 추정된다.
안성천유역권 이형토기, 유개대부호, 백색토기옹은 배타적 분포 정형을 보임에 따라 마한계문화권 내에서도 세력이 다른 지역 집단이 다수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취락 내 출토 철기류는 진위천과 오산천 상류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마한과 외부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안성천유역권은 4C 전반까지 주거, 토기 등 마한의 재지적 물질자료를 공유하였다. 그런데 4C 중엽부터 탄천-오산천 루트로 백제토기가 유입되고, 안양천-황구지천-진위천 루트로 여·철자형주거가 확산되면서 물질자료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4C 후반 내지 5C 전반부터는 안성천유역권에 백제의 성곽과 고분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면서 백제화가 가속화된다.
백제는 마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도성의 동쪽 남한강을 따라 남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다. 이와 더불어 도성(풍납토성)의 서쪽으로는 탄천과 안양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결과 (원)삼국시대 경기도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위치에 다수의 新村이 등장한다. 특히 경기 동부지역에서 신촌 건설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기 남부 안성천유역권의 마한 취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릉의 정상부→사면→말단부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한의 주거는 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비주식→사주식→호서형 사주식→비사주식 구조로 변화하고, 노시설은 편측 무시설식→부뚜막→외줄구들→기반토식 외줄구들로 발전한다. 사주식주거는 AD 2C 후엽 전후시점에 등장하여 AD 5C 전반까지 지속되며, AD 4C 중엽에는 호서형 사주식주거도 등장한다.
(원)삼국시대 안성천 본류 남쪽지역의 분묘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황구지천과 오산천은 등고선과 직교한 것이 다수이다. 이것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의 주축방향(직교)을 계승한 결과이다. 아울러 AD 2C대에는 안성천유역권에 주구 요소가 채용되는데 마한의 환황해노선 복원에 따른 서북한지역 묘제의 2차 파급 결과로 추정된다.
안성천유역권 이형토기, 유개대부호, 백색토기옹은 배타적 분포 정형을 보임에 따라 마한계문화권 내에서도 세력이 다른 지역 집단이 다수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취락 내 출토 철기류는 진위천과 오산천 상류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마한과 외부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안성천유역권은 4C 전반까지 주거, 토기 등 마한의 재지적 물질자료를 공유하였다. 그런데 4C 중엽부터 탄천-오산천 루트로 백제토기가 유입되고, 안양천-황구지천-진위천 루트로 여·철자형주거가 확산되면서 물질자료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4C 후반 내지 5C 전반부터는 안성천유역권에 백제의 성곽과 고분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면서 백제화가 가속화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ttlements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of the south of Gyeonggi moved from crest to hillslope to the distal end of hilly lands, as time passed by. The house structures changed in the following manner: non-pillar type dwellings → four-pillar type dwellings → four-pillar type dwellings of the Hoseo area → non-four-pillar type dwelling. In addition, the hearth facilities changed in the following manner: tilted brazier → kitchen range → tunnel-shaped heating system → raw soil type tunnel-shaped heating system. Four-pillar type dwellings came to the fore in the late second century CE, and continued until the early fifth century CE. In the mid 4th century CE, the four-pillar type dwellings of the Hoseo area emerged. Located at the main tributaries of the Anseong Stream in Proto-three Kingdoms Period, most tombs were laid out to be parallel to the contour lines of the hill. Howeber, in the areas of Hwangguji Stream and Osan Stream, the tombs were laid out at a right angle to the contour lines. This is belived to be a result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incipal axis of the pit burials of the early Iron Age. In the second century CE, the ditches surrounding tombs were introduced into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These developments are estimated as the rippling effect of the tombs of northwestern Korea, caused by the restoration of the trade route of Yellow Sea. Earthenwares of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each show a different distribution range. Irons unearthed in settl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upper reaches of the Jinwi and Osan Streams, which is the result of conflict between Mahan and external forces.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shared a common material culture, including house sites and earthenwares, until the early fourth century CE. From the mid-fourth century CE and onwards the Tan Stream - Osan Stream route was connected to introduce Baekje earthenwares. With the expansion of new house types,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culture changed. Baekje fortresses and ancient burial mounds began to advance into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from the late fourth century CE to early fifth century CE. From that time onwards, Baekje centralization was accelerated.
For the purpose of conquering the Mahan forces, Baekje adopted a tight southward expansion policy, centered around the Namhan River to the east of the capital city. To attain such a purpose, Baekje proactively accommodated the Tan and Anyang Streams t...
For the purpose of conquering the Mahan forces, Baekje adopted a tight southward expansion policy, centered around the Namhan River to the east of the capital city. To attain such a purpose, Baekje proactively accommodated the Tan and Anyang Streams to the west. In the Gyeonggi area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new settlements were built in places different from those where Bronze Age settlements had been located. These developments in which new settlements were being built were frequently found, especially in the eastern parts of Gyeonggi.
The settlements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of the south of Gyeonggi moved from crest to hillslope to the distal end of hilly lands, as time passed by. The house structures changed in the following manner: non-pillar type dwellings → four-pillar type dwellings → four-pillar type dwellings of the Hoseo area → non-four-pillar type dwelling. In addition, the hearth facilities changed in the following manner: tilted brazier → kitchen range → tunnel-shaped heating system → raw soil type tunnel-shaped heating system. Four-pillar type dwellings came to the fore in the late second century CE, and continued until the early fifth century CE. In the mid 4th century CE, the four-pillar type dwellings of the Hoseo area emerged. Located at the main tributaries of the Anseong Stream in Proto-three Kingdoms Period, most tombs were laid out to be parallel to the contour lines of the hill. Howeber, in the areas of Hwangguji Stream and Osan Stream, the tombs were laid out at a right angle to the contour lines. This is belived to be a result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incipal axis of the pit burials of the early Iron Age. In the second century CE, the ditches surrounding tombs were introduced into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These developments are estimated as the rippling effect of the tombs of northwestern Korea, caused by the restoration of the trade route of Yellow Sea. Earthenwares of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each show a different distribution range. Irons unearthed in settl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upper reaches of the Jinwi and Osan Streams, which is the result of conflict between Mahan and external forces.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shared a common material culture, including house sites and earthenwares, until the early fourth century CE. From the mid-fourth century CE and onwards the Tan Stream - Osan Stream route was connected to introduce Baekje earthenwares. With the expansion of new house types,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culture changed. Baekje fortresses and ancient burial mounds began to advance into the Anseong Stream Basin Zone from the late fourth century CE to early fifth century CE. From that time onwards, Baekje centralization was accelerated.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경신, "홍천 태학리 유적" 한성문화재연구원 2020
2 허진아,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 배경" 한국고고학회 (108) : 8-49, 2018
3 임동중, "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4 전동현, "한성백제기 취사용기의 형성과 변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5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전문용어집" 2018
6 송만영, "한강 하류 마한 취락의 편년과 전개 과정" 숭실사학회 (36) : 5-47, 2016
7 강지원, "청주 오송유적 분묘자료를 통해 본 마한에서 백제로,, In 호서지역 고대 정치영역의 변화" 호서고고학회 2021
8 辛知亨,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전기 토기 전개양상-유개대부토기·원저발형토기를 중심으로-" 忠北大學校 大學院 2021
9 박중국, "중부지역 원삼국∼백제한성기 주거 유형과 출토유물의 공간적 접점, In 접점Ⅲ,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의 고고학적 공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20
10 박장호,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과 변천"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1) : 5-34, 2018
1 박경신, "홍천 태학리 유적" 한성문화재연구원 2020
2 허진아,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 배경" 한국고고학회 (108) : 8-49, 2018
3 임동중, "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4 전동현, "한성백제기 취사용기의 형성과 변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5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전문용어집" 2018
6 송만영, "한강 하류 마한 취락의 편년과 전개 과정" 숭실사학회 (36) : 5-47, 2016
7 강지원, "청주 오송유적 분묘자료를 통해 본 마한에서 백제로,, In 호서지역 고대 정치영역의 변화" 호서고고학회 2021
8 辛知亨,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전기 토기 전개양상-유개대부토기·원저발형토기를 중심으로-" 忠北大學校 大學院 2021
9 박중국, "중부지역 원삼국∼백제한성기 주거 유형과 출토유물의 공간적 접점, In 접점Ⅲ,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의 고고학적 공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20
10 박장호,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과 변천"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1) : 5-34, 2018
11 박형열,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 호남고고학회 50 : 70-91, 2015
12 최병현,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문화재연구원 (27) : 29-104, 2018
13 권오영,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중부고고학회 8 (8): 31-49, 2009
14 강지원, "원삼국기 중서부지역 토광묘 연구 : 궐동유적·진터유적·마두리유적·용호리유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2
15 김길식,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백제문화연구소 (56) : 81-108, 2017
16 최지훈, "원삼국~한성백제기 오산천유역문화의 지역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9
17 정인성,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In 원사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 2016
18 황보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한국고대학회 (62) : 77-109, 2020
19 권오영,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역사박물관 2020
20 권오영, "오산천·황구지천 유역 발굴조사의 최신 성과와 마한·백제" 중앙문화재연구원·한신대학교박물관 2012
21 박신명, "오산천·황구지천 유역 발굴조사의 최신 성과와 마한·백제" 중앙문화재연구원·한신대학교박물관 2012
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성천 중·하류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2014
23 김나영, "삼한·삼국시대 영남지역 4주식 방형계 주거지 연구" 중앙문화재연구원 (35) : 1-43, 2021
24 박순발,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25 조재용, "백제 한성기 중서부내륙지역 마한 토기 연구" 부산고고학회 (18) : 89-122, 2016
26 한수영,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회 39 : 5-26, 2011
27 이진우, "마한·백제권 석곽묘의 변천" 한국상고사학회 88 (88): 31-68, 2015
28 서현주,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학회 (50) : 53-87, 2016
29 김장석, "남한지역 장란형토기의 등장과 확산" 중부고고학회 11 (11): 5-49, 2012
30 최욱진, "곡교천 유역의 정치체의 변화과정 검토, In 호서지역 고대 정치영역의 변화" 호서고고학회 2021
31 송만영, "경기 남부 마한계 주거지의 변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80) : 37-64, 2012
32 이혁희, "겅기지역 백제 한성기 물질문화의 지역성, In 최근 발굴성과로 본 경기도이 마한과 고대국가 백제"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 2021
33 박경신, "華城 石隅里 먹실遺蹟"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34 조진선, "細形銅劍文化의 硏究" 學硏文化史 2005
35 이현상, "百濟 漢城期 金工品 制作技術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8
36 한지선,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문화재연구원 (12) : 1-59, 2013
37 土田純子, "東アジアと百濟土器" 同成社 2017
38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8
39 三江文化財硏究院, "平澤 佳谷里 遺蹟" 2017
40 박경신, "原三國時代 中部地域과 嶺南地域의 內陸 交易" 부산고고학회 (23) : 1-31, 2018
41 박경신,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42 辛恩貞,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址 硏究" 한신大學校 大學院 2017
43 이훈, "公州 長善里 土室遺蹟에 대한 試論" 韓國上古史學會 34 : 2001
44 김은정, "全北地域 原三國時代 住居止 硏究" 호남고고학회 26 : 59-87, 2007
45 宋滿榮,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展開 過程과 韓濊 政治體의 動向"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0 : 2003
46 서현주, "中部地域 原三國~百濟 漢城期 土器의 地域別 接點" 호서고고학회 (48) : 82-119, 2021
47 이창엽, "中西部地域 百濟漢城期 木棺墓 變化- 烏山 水淸洞遺蹟을 中心으로 -" 한국고대학회 (27) : 81-110, 2007
48 이창엽, "『烏山 水淸洞 百濟 墳墓群』 Ⅳ"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49 김무중, "“남양주 금남리 유적”에 대한 토론문, In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부고고학회 2020
50 황보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동양학연구원 (83) : 89-114, 2021
51 이계만, "3~5세기 백제 지방 편제 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52 한국문화재재단, "137.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In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2019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중부고고학회
- 박성희
- 2021
- KCI등재
-
- 중부고고학회
- 포영초
- 2021
- KCI등재
-
- 중부고고학회
- 최정범
- 2021
- KCI등재
-
- 중부고고학회
- 김규운
- 2021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20-07-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rchaeology ->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0-04-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울경기고고학회 -> 중부고고학회영문명 : Seoul Kyonggi Archaeology Society ->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4 | 1.04 | 0.9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8 | 0.95 | 2.135 | 0.43 |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