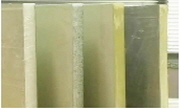본 논문은 천전리각석의 신라시대 銘文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는 계사년명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종래 계사년명의 연대는 513년과 453년설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후반부의 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명문은 신라 6부를 구성하는 沙啄部 소속 인물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계사년 6월 22일 천전리에 왔다 갔음을 전하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인명 표기 방식 등이 신라 中古期 금석문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여 그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문 속 대형이 고구려의 관등이라고 할 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양국이 전쟁국면으로 들어간 5세기 중반 이후는 비정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계사년 명문은 453년 6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4세기 후반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양국 관계 초반부터 왕족 출신 質子를 보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고구려 역시 이를 이용하여 신라에 대한 우위에 서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시기의 질자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일종의 외교사절 역할을 하였다. 인질을 보낸 쪽은 상대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인질을 받은 쪽은 상대국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사년 명문의 대형 소지자는 인명의 표기 방식 등으로 보아 신라 중앙의 6부인이 아니라 지방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서 접경지대의 재지 수장층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삼국사기 지리지에 본래 고구려 소속 郡縣으로 전해지는 지역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구려 관등을 신라인이 받게 된 계기로는 충주고구려비에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고구려왕이 신라의 지배층에게 의복을 사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복은 官服으로서 착용자의 신분과 서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복의 수여와 함께 관등의 수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于伐城은 양국의 접경지대에 속했으므로, 해당 지역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지 수장층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고구려의 대형이 내려졌을 것이라 보았다.
본 논문은 천전리각석의 신라시대 銘文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는 계사년명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종래 계사년명의 연대는 513년과 453년설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후반부의 인명이 大兄加를 칭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일찍이 이것이 고구려의 官等인 대형일 가능성을 지적한 연구가 있었고, 본고 역시 그에 동의하여 신라의 수도 인근인 천전리에 나타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명문은 신라 6부를 구성하는 沙啄部 소속 인물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계사년 6월 22일 천전리에 왔다 갔음을 전하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인명 표기 방식 등이 신라 中古期 금석문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여 그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문 속 대형이 고구려의 관등이라고 할 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양국이 전쟁국면으로 들어간 5세기 중반 이후는 비정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계사년 명문은 453년 6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4세기 후반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양국 관계 초반부터 왕족 출신 質子를 보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고구려 역시 이를 이용하여 신라에 대한 우위에 서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시기의 질자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일종의 외교사절 역할을 하였다. 인질을 보낸 쪽은 상대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인질을 받은 쪽은 상대국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사년 명문의 대형 소지자는 인명의 표기 방식 등으로 보아 신라 중앙의 6부인이 아니라 지방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서 접경지대의 재지 수장층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삼국사기 지리지에 본래 고구려 소속 郡縣으로 전해지는 지역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구려 관등을 신라인이 받게 된 계기로는 충주고구려비에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고구려왕이 신라의 지배층에게 의복을 사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복은 官服으로서 착용자의 신분과 서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복의 수여와 함께 관등의 수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于伐城은 양국의 접경지대에 속했으므로, 해당 지역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지 수장층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고구려의 대형이 내려졌을 것이라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성, "호우총의 구조 복원과 피장자 검토" 한국고대학회 (24) : 445-469, 2006
2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학회 (98) : 97-140, 2020
3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전리각석"
4 하일식, "천전리 서석 명문과 생활사의 실마리" 신라문화연구소 60 : 91-120, 2022
5 전호태,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학회 (91) : 209-242, 2018
6 김정배,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13 : 1979
7 박찬흥,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신라의 위상" 고려사학회 (51) : 145-165, 2013
8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10 : 2000
9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10 : 2000
10 손영종,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5 (85): 1985
1 김용성, "호우총의 구조 복원과 피장자 검토" 한국고대학회 (24) : 445-469, 2006
2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학회 (98) : 97-140, 2020
3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전리각석"
4 하일식, "천전리 서석 명문과 생활사의 실마리" 신라문화연구소 60 : 91-120, 2022
5 전호태,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학회 (91) : 209-242, 2018
6 김정배,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13 : 1979
7 박찬흥,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신라의 위상" 고려사학회 (51) : 145-165, 2013
8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10 : 2000
9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10 : 2000
10 손영종,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5 (85): 1985
11 임기환,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10 : 2000
12 김현구,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Ⅰ" 일지사 2002
13 강종훈, "울주 천전리 서석 명문에 대한 일고찰" 1 : 1999
14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 유적보존연구소, "울산 천전리 암각화" 삼창기획 2014
15 전호태, "울산 천전리 각석의 가치와 의미" 한국문화연구원 39 : 7-39, 2020
16 전호태, "울산 천전리 각석 암각화 톺아읽기" 민속원 2021
17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 금석문 1·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18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
19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혜안 2001
20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8
21 선석열, "신라 실성왕의 즉위과정-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부경역사연구소 (34) : 105-133, 2014
22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23 장미애, "백제의 對倭交涉에서 質의 역할" 수선사학회 (82) : 265-291, 2022
24 주보돈,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의 정치 동향" 21 : 1998
25 이정빈,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동북아역사재단 (57) : 76-114, 2017
26 강종훈, "명문의 새로운 판독을 통해 본 울주 천전리각석의 성격과 가치" 대구사학회 123 : 01-45, 2016
27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2002
28 기경량, "광개토왕비 辛卯年條 ‘來渡海破’ 판독의 문제와 그 함의" 고구려발해학회 73 : 87-114, 2022
29 이도학, "고구려의 낙동강유역 진출과 신라·가야 경영" 2 : 1988
30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28 : 1981
31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32 김현숙,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33 金貞培,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61·62 : 1988
34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35 임창순, "韓國金石集成Ⅰ(先史時代)" 일지사 1984
36 문경현, "蔚州 新羅書石銘記의 新檢討" 10 : 1987
37 김용선,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硏究" 81 : 1979
38 이문기, "蔚州 川前里書石 原 · 追銘의 再檢討" 4 : 1983
39 임세권, "蔚州 川前里刻石" 한국국학진흥원 8 : 2014
40 강영경, "蔚山 川前里書石 銘文을 통해 본 신라왕실의 초기불교정책" 18 : 2014
41 김철준,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42 고광의, "川前里書石 銘文의 書藝史的 考察 ― 6세기 前半 紀年銘을 중심으로" 한국서예학회 (16) : 5-32, 2010
43 시노하라 히로카타,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意義" 51 : 2000
44 임창순, "中原高句麗碑 小考" 13 : 1979
45 박남수, "『삼국유사』 기이편, 「내물왕 김제상」·「제18실성왕」조와 신라의 정치과정" 40 : 2019
46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19 : 1988
47 장병진, "5세기 고구려의 영남 북부 지역 지배에 관한 새로운 접근 - 영남 북부 ‘本 高句麗 郡縣’ 기록의 이해 -" 고구려발해학회 72 : 103-133, 2022
48 정운용,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南限" 35 : 1989
49 정운용, "5~6세기 신라·고구려 관계의 추이" 15 : 1994
50 이한상, "5~6 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 33 : 1995
51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36 : 2000
52 김현숙,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 향방" 한국고대사학회 26 : 75-114, 2002
53 이승호,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한국고대사학회 (67) : 299-339, 2012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상대 신라의 군사거점 鎭의 설치와 고대 부산지역의 영역화 과정
- 부경역사연구소
- 이미란
- 2023
- KCI등재
-
- 부경역사연구소
- 이동윤
- 2023
- KCI등재
-
- 부경역사연구소
- 이도학
- 2023
- KCI등재
-
조선 초기 법성창의 해양사적 의미- 법성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부경역사연구소
- 한정훈
- 2023
- KCI등재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