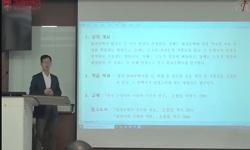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of the agony and division of the subject, the self-effacement of the subject as represented as self-denial and self-sacrifice, and the creation of a new subject in a comparative study on Nirvana and kenosis in the Tag...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타골, 한용운, 겐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투영된 '니르바나'와 '케노시스' 비교 연구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45637
- 저자
-
발행기관
-
-
발행연도
2016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타골 ; Tagor ; Han Yongun ; Miyazawa Kenji ; Dostoevskii ; Nirvana ; Kenosis ; 한용운 ; 미야자와 겐지 ; 도스토예프스키 ; 니르바나 ; 케노시스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 Miyazawa Kenji, Dostoevskii's literature.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I prov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comparative study of themes among D. Durichin's and Aldridge's methodologies of comparative literature. For the main part of the thesis, I introduce the concepts of the subject of Jacques Lacan and Félix Guattari an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Lacanian theory with the Buddhist concepts of 'selflessness'- 'nirvana'and kenosis. I use Lacan's concept of the subject as one incapable of accomplishing the oneness of the other in the Symbolic in order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the subject; and I adopt Guattari's concept of 'the subject of inconsistency', that is, the escaping subject so a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self-denial and self-sacrifice.
My study also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Kenji and Han Young-Un were influenced by an indian poet Tago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his prose work The Realization of Life. Tagore's thought is based on brahman - a traditional indian 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of the agony and division of the subject, the self-effacement of the subject as represented as self-denial and self-sacrifice, and the creation of a new subject in a comparative study on Nirvana and kenosis in the Tagore, Han Yong
un, Miyazawa Kenji, Dostoevskii's literature.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I prov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comparative study of themes among D. Durichin's and Aldridge's methodologies of comparative literature. For the main part of the thesis, I introduce the concepts of the subject of Jacques Lacan and Félix Guattari an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Lacanian theory with the Buddhist concepts of 'selflessness'- 'nirvana'and kenosis. I use Lacan's concept of the subject as one incapable of accomplishing the oneness of the other in the Symbolic in order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the subject; and I adopt Guattari's concept of 'the subject of inconsistency', that is, the escaping subject so a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self-denial and self-sacrifice.
My study also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Kenji and Han Young-Un were influenced by an indian poet Tago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his prose work The Realization of Life. Tagore's thought is based on brahman - a traditional indian t
국문 초록 (Abstract)
그리스도교에서는 인류의 선조가 지은 원죄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된다고 간주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인간이 어리석어 세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을 반복하고(윤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원죄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나라(신의 차원에 동참)에 가는 것이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탐욕과 성내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속성을 지닌 무명(avidyā)을 깨고 지혜로워져서 대자유의 차원으로 해탈된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구원의 전제조건은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해탈의 전제조건은 인간이 무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 영성의 문학적 투영은 다음과 같이 각가의 문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타골: 타골의 자아는 서구의 근대적 자아와는 다르다. 그는 자기를 아는 일이 일생에서 중요한 영적 목표라고 역설하면서 자기를 모르는 무지, 아비드야(Avidya)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한다. 등불은 자아의 표상으로서 광명, 즉 빛의 세계이며, 자아와 신과의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기름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 의미는 등불인 자아, 자기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 자아포기의 당위성은 이기심을 초월하여 전체와 친화성을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 『기탄잘리』의 ‘나’와 『원정』의 정원사의 ‘당신’에 대한 끝없는 구도로 표현되었다.
한용운: 한용운의 시들에서 비움은 ‘나’의 자기희생에 있다. 그의 시에서 시적 화자 ‘나’는 ‘땅’이 없는 자, 인격이 없는 ‘거지’, ‘집과 인권’이 없으므로 ‘정조’도 없는 자, ‘나룻배’ 등으로 표현. 가아를 버리고 진아를 획득하여 계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 가아를 버림으로써 님과의 재회에 이르는 시적 화자 ‘나’의 자기포기에 이르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미야자와 겐지: 주체가 자기부정과 자기희생에 의해 不一不二, 즉 차별상이 없는 평등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와 불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차원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 있고 ...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와 불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차원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 있고 불교의 목표는 ‘해탈’에 있다는 종착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불교에서는 지혜를 통해 해탈하는 것이기에, 구원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리스도교에는 신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된다면 불교에서는 지혜를 얻는 수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인류의 선조가 지은 원죄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된다고 간주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인간이 어리석어 세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을 반복하고(윤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원죄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나라(신의 차원에 동참)에 가는 것이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탐욕과 성내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속성을 지닌 무명(avidyā)을 깨고 지혜로워져서 대자유의 차원으로 해탈된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구원의 전제조건은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해탈의 전제조건은 인간이 무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 영성의 문학적 투영은 다음과 같이 각가의 문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타골: 타골의 자아는 서구의 근대적 자아와는 다르다. 그는 자기를 아는 일이 일생에서 중요한 영적 목표라고 역설하면서 자기를 모르는 무지, 아비드야(Avidya)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한다. 등불은 자아의 표상으로서 광명, 즉 빛의 세계이며, 자아와 신과의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기름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 의미는 등불인 자아, 자기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 자아포기의 당위성은 이기심을 초월하여 전체와 친화성을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 『기탄잘리』의 ‘나’와 『원정』의 정원사의 ‘당신’에 대한 끝없는 구도로 표현되었다.
한용운: 한용운의 시들에서 비움은 ‘나’의 자기희생에 있다. 그의 시에서 시적 화자 ‘나’는 ‘땅’이 없는 자, 인격이 없는 ‘거지’, ‘집과 인권’이 없으므로 ‘정조’도 없는 자, ‘나룻배’ 등으로 표현. 가아를 버리고 진아를 획득하여 계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 가아를 버림으로써 님과의 재회에 이르는 시적 화자 ‘나’의 자기포기에 이르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미야자와 겐지: 주체가 자기부정과 자기희생에 의해 不一不二, 즉 차별상이 없는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