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hist chants is a rare historical material that exhibits the uniqueness of courtly culture in Early Joseon, complexly mixed with the continued tradition of Buddhist culture from the Goryeo Dynasty and Confucian culture. Buddhist chants is a meaning...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 향악 불찬의 성격과 연원 =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Hyangak Buddhist chants in the early Joseon era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4142169
-
저자
나정순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Buddhist chants ; early Chosun era ; Goryeo Dynasty tradition of Buddhist culture ; performance ; <Yeongsanhoesang> ; King Sejong ; King Sejo ; the repetition of the sacred name of Buddha ; 『地藏菩薩本願經』 ; <Cheo-yong ga> ; performance of Cheo-yong ; guna ; 『荊楚歲時記』(a glossary of seasonal words as HYUNGCHO) ; characteristics ; origins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71-324(54쪽)
-
KCI 피인용횟수
3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ddhist chants is unique in that it complexly shows both the contemporary characteristic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tradition of Buddhist culture from the Goryeo society.
Despite its uniqueness, Buddhist chants has been studied only for its present aspects and properties of Akjang based on stylistic classification. The exhibition of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in its lyrics or its origin in relation to performance culture have not been considered yet.
The time of creation of <Yeongsanhoesang> and other Buddhist chants have been ambiguously mentioned by researchers due to the lack of precise examination of reference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xistence and time of creation of Buddhist chants is comparatively clear according to references. Buddhist chants was mainly crea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under King Sejong and King Sejo. The content of Buddhist chants has two distinct features.
Firstly, they all call for Buddha, that is they are in the form of ‘the repetition of the sacred name of Buddha’. This shows that Buddhist chants was dedicated to Buddha as voice services and passed down according to the Sutras.
Secondly, Buddhist chants prays for permanent dynasty and long life of kings in accordance with Buddhist saints’ practice of good deeds. This is unusual in that it displays both Buddhism and the Confucian concept of sovereign and subject.
The fact that Buddhist chants was actively used as music of solace for the king shows that even in the palace Buddhism functioned as religious consolation alternative to Confucianism.
Furthermore, the second half of the performance of Cheo-yong reappears in the lyrics of Buddhist chants, showing that performance of Cheo-yong and Song of Cheo-yong were handed down in a deep relation to continued Buddhist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Particularly, guna(驅儺), originating from the early Buddhism forms the basis of Buddhist culture, suggests that guna performed as exorcism before performance of Cheo-yong actually derived from the practice of culture in Buddhism.『荊楚歲時記』(a glossary of seasonal words as HYUNGCHO) is an evidence.
Besides Song of Cheo-yong which is considered as shamanistic, contains several Buddhistic constituents. Thus the point of view that approaches Cheo-yong folklore as only shamanistic needs to be reconsidered.
Buddhist chants is a rare historical material that exhibits the uniqueness of courtly culture in Early Joseon, complexly mixed with the continued tradition of Buddhist culture from the Goryeo Dynasty and Confucian culture. Buddhist chants is a meaningful subject of research, because Buddhist chants was performed as performance of Early Joseon and sung about song of blessing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Buddhist chants is unique in that it complexly shows both the contemporary characteristic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tradition of Buddhist culture from the Goryeo society.
Despite its uniqueness, Buddhist chants has been studied only for its present aspects and properties of Akjang based on stylistic classification. The exhibition of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in its lyrics or its origin in relation to performance culture have not been considered yet.
The time of creation of <Yeongsanhoesang> and other Buddhist chants have been ambiguously mentioned by researchers due to the lack of precise examination of reference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xistence and time of creation of Buddhist chants is comparatively clear according to references. Buddhist chants was mainly crea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under King Sejong and King Sejo. The content of Buddhist chants has two distinct features.
Firstly, they all call for Buddha, that is they are in the form of ‘the repetition of the sacred name of Buddha’. This shows that Buddhist chants was dedicated to Buddha as voice services and passed down according to the Sutras.
Secondly, Buddhist chants prays for permanent dynasty and long life of kings in accordance with Buddhist saints’ practice of good deeds. This is unusual in that it displays both Buddhism and the Confucian concept of sovereign and subject.
The fact that Buddhist chants was actively used as music of solace for the king shows that even in the palace Buddhism functioned as religious consolation alternative to Confucianism.
Furthermore, the second half of the performance of Cheo-yong reappears in the lyrics of Buddhist chants, showing that performance of Cheo-yong and Song of Cheo-yong were handed down in a deep relation to continued Buddhist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Particularly, guna(驅儺), originating from the early Buddhism forms the basis of Buddhist culture, suggests that guna performed as exorcism before performance of Cheo-yong actually derived from the practice of culture in Buddhism.『荊楚歲時記』(a glossary of seasonal words as HYUNGCHO) is an evidence.
Besides Song of Cheo-yong which is considered as shamanistic, contains several Buddhistic constituents. Thus the point of view that approaches Cheo-yong folklore as only shamanistic needs to be reconsidered.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영산회상> 이하 여러 불찬에 대하여 그 제작 시기가 학자들에 따라 불분명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문헌 자료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련 문헌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불찬의 존재방식이나 제작 년대는 비교적 명확하다. 불찬은 조선 전기 세종 대에서 세조 대에 집중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불찬의 내용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불찬의 내용이 모두 부처를 부르는 호불 즉 칭명염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찬이 조선 전기에 음성공양으로 바쳐졌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경에 근거하여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찬은 왕조의 영속이나 임금의 수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재앙의 소멸과 불보살의 공덕 행위를 추구하는 불교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군신주의와 불교적 주술성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조선 전기에 임금께 올리는 위안의 음악에 노랫말로서의 불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당대 궁중의 문화에서도 유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종교적 위안의 역할은 여전히 불교 쪽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나아가 처용 정재의 후도가 불찬의 노랫말로 연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나 후 이어졌던 처용의 연행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던 불교문화와 깊은 연관성 속에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나 의식이 초기 불교문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처용 정재를 공연하기 전에 행해지던 악귀를 쫓는 축사(逐邪)로서의 구나 의식은 바로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초세시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무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려 <처용가>의 내용에서도 불교적 성격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처용의 연행에 대하여 무속적 제의의 기능만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의 불찬은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선초 유교문화에 복합적으로 융합된 조선 전기 궁중 문화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본고에서 ...
조선 전기의 불찬은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선초 유교문화에 복합적으로 융합된 조선 전기 궁중 문화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찬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이유는 조선 전기의 정재(呈才)로 공연되면서 ‘송도지사(頌禱之詞)’를 노래하는 가운데에도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전통을 여실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의 시대성과 고려 사회의 불교 문화 전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면서 모순된 존재 방식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불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존재 양상과 문체적 분류에 근거한 악장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되었을 뿐 불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노랫말의 내용적 성격이나 연행 문화와 관련된 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지금까지 <영산회상> 이하 여러 불찬에 대하여 그 제작 시기가 학자들에 따라 불분명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문헌 자료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련 문헌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불찬의 존재방식이나 제작 년대는 비교적 명확하다. 불찬은 조선 전기 세종 대에서 세조 대에 집중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불찬의 내용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불찬의 내용이 모두 부처를 부르는 호불 즉 칭명염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찬이 조선 전기에 음성공양으로 바쳐졌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경에 근거하여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찬은 왕조의 영속이나 임금의 수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재앙의 소멸과 불보살의 공덕 행위를 추구하는 불교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군신주의와 불교적 주술성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조선 전기에 임금께 올리는 위안의 음악에 노랫말로서의 불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당대 궁중의 문화에서도 유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종교적 위안의 역할은 여전히 불교 쪽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나아가 처용 정재의 후도가 불찬의 노랫말로 연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나 후 이어졌던 처용의 연행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던 불교문화와 깊은 연관성 속에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나 의식이 초기 불교문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처용 정재를 공연하기 전에 행해지던 악귀를 쫓는 축사(逐邪)로서의 구나 의식은 바로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초세시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무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려 <처용가>의 내용에서도 불교적 성격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처용의 연행에 대하여 무속적 제의의 기능만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상기숙, "형초세시기" 집문당 9-164, 1996
2 이종찬,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231-245, 1985
3 이혜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출판부 1-519, 1985
4 윤영해, "한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만남과 그 관계 변화" 한국불교학회 19 : 285-316, 1994
5 "한국사DB"
6 박범훈,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장경각 1-650, 2000
7 김성배, "한국불교가요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164, 1980
8 "한국고전종합DB"
9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국 1-381, 1980
10 박범훈, "한국 불교 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1 상기숙, "형초세시기" 집문당 9-164, 1996
2 이종찬,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231-245, 1985
3 이혜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출판부 1-519, 1985
4 윤영해, "한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만남과 그 관계 변화" 한국불교학회 19 : 285-316, 1994
5 "한국사DB"
6 박범훈,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장경각 1-650, 2000
7 김성배, "한국불교가요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164, 1980
8 "한국고전종합DB"
9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국 1-381, 1980
10 박범훈, "한국 불교 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11 대림, "청정도론 2"
12 최정여, "처용 전후 구나의(驅儺儀)의 양상"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4 : 139-161, 1983
13 "증보문헌비고"
14 陶立璠, "중국의 가면(假面)문화" 비교민속학회 11 : 407-425, 1994
15 김정희, "조선조 명종대의 불화연구; 淸平寺 地藏十王圖를 中心으로" 역사학회 110 : 145-174, 1981
16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 ―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 한국종교학회 통권 (통권): 37-81, 2007
17 안자산, "조선음악과 불교" 불교사 69 : 19-26, 1930
18 "조선왕조실록(태백산사고본)"
19 박은경, "조선시대 15·6세기 불교회화의 특색 - 地藏十王圖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 : 251-279, 1994
20 조평환, "조선 초기의 악장과 불교 사상" 한국시가학회 8 : 111-134, 2000
21 조규익, "조선 초기 아송문학 연구" 태학사 1-293, 1986
22 이봉춘, "조선 전기 불전 언해와 그 사상" 한국불교학회 5 : 41-70, 1980
23 조규익, "조선 악장문학 연구" 숭실대 출판부 1-453, 1990
24 "임하필기"
25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학원사 1-622, 1962
26 고영근, "월인천강지곡의 텍스트 분석" 집문당 1-295, 2003
27 김기종,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보고사 1-303, 2010
28 조흥욱, "월인천강지곡의 문학적 연구" 국민대 출판부 1-263, 2008
29 "월인석보"
30 "용재총화"
31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下)" 한국학중앙연구원 6-897, 1998
32 성기옥, "악학궤범의 시문학 사료적 가치" 진단학회 77 : 207-240, 1994
33 "악학궤범"
34 김명준, "악장가사연구" 다운샘 5-335, 2004
35 "악장가사"
36 "신증금보"
37 "시용향악보"
38 "승정원일기"
39 권오성, "세종학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32, 1887
40 장사훈, "세종조 음악 연구" 서울대출판부 1-423, 1982
41 최철, "세종 시대의 문학" 1-249, 1985
42 양태순, "선초 향악의 흐름과 그 시가사적 의미" 한국시가학회 7 : 149-208, 2000
43 "석보상절"
44 "삼국유사"
45 "삼국사기"
46 임기중, "불교시가연구(1443~1876년)-한글시대의 불교시가" 한국문학연구소 (22) : 5-35, 2000
47 "불교사전"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12
48 구사회, "불교계 악장문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 : 111-127, 1994
49 오인, "불교 세시풍속" 운주사 1-444, 2014
50 "문화콘텐츠닷컴"
51 "대악후보"
52 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출판부 1-640, 1966
53 최철, "고려시가의 불교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96 : 121-141, 1997
54 "고려사"
55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이우출판사 1-411, 1978
56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사 13-467, 2004
57 양주동, "고가연구" 을유문화사 1-898, 1947
58 문명대, "魯英의 阿彌陀·地藏佛畵에 대한 考察" 국립중앙박물관 25 (25): 1-16, 1979
59 "雜阿含經 22"
60 "金光明最勝王經 18"
61 安錫淵, "釋門儀範" 법륜사 4-633, 1956
62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三昧儀 1"
63 이승희, "無爲寺極樂寶殿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동악미술사학회 (10) : 59-84, 2009
64 "法華曼荼羅威儀形色法經 1"
65 "後漢書(志, 第五)"
66 "妙法蓮華經 24"
67 "大燈國師語録, 卷上"
68 "大方等大集經 13, 54"
69 "大方廣佛華嚴經 24, 58"
70 "大方廣佛華嚴經 1"
71 "大悲經 2"
7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 (K - 426)"
73 "地藏菩薩本願經 卷上"
74 "地藏菩薩本願經 下"
75 "佛說開覺自性般若波羅蜜多經 4"
76 印光, "九華山志"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2006
77 "中國佛敎网 原版艺术网入口 原版图片网入口"
78 나정순, "『시용향악보』 소재 <성황반><나례가>의무불 습합적 성격과 연원" 대동문화연구원 (87) : 207-240, 2014
79 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 한국국악학회 45 : 59-87, 2009
80 김기종,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親制新聲’ 연구" 반교어문학회 (37) : 173-200, 2014
81 "http://www.fjtp.net/FJYS/TANGKA/2010-11-03/554.html"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박상란
- 2015
- KCI등재
-
<만해학술문화제 논문> 만해 용운선사의 ≪불교대전≫과 현공 묵암선사의 ≪불교대성전≫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양은용
- 2015
- KCI등재
-
김동리 역사소설 ‘신라연작’의 ‘신불(神佛)’ 신앙 연구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김병길
- 2015
- KCI등재
-
만해 한용운의 일본인식 - 불교계 愛國啓蒙運動의 사상적 단초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고영섭
- 2015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5-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1 | 1.365 | 0 |
연관 공개강의(KOCW)
-

Performance Management of a Headteacher
Teachers TV Teachers TV -

Performance Management
Teachers TV Teachers TV -

Performance Management
Teachers TV Teachers T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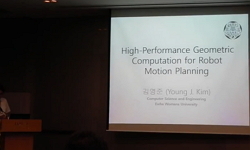
High Performance Geometric Computation for Robot Motion Planning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준 -

In Search for the Origins of Korean Philosophy
K-MOOC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 박소정




 KCI
KCI KISS
KI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