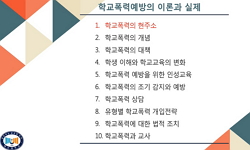This article examines the one-step change in the reporting and supporting system for flood victims in late 18th-century Joseon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histor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analyzed flood damage in Joseon through the l...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수해 이재민 보고 방식의 체계화와 恤典 시행 = Systematization of Investigation and Compensation for Flood Victims in Late 18th-Century Joseon
한글로보기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1780s, King Jeongjo shaped the procedures for the investigation, reporting, and inspection, as well as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flood victim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This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ensate victims properly, and it continued into the 19th century. The government began to pay compensation to flood victims by expanding the beneficiaries of the support system (called “Hyuljeon (恤典)), which existed as a concept to relieve special victims that could not be helped by general agriculture policy. While at first only provincial victims were compensated, from 1782, compensation was also paid to capital victims. The scale of the house damage was categorized to compensate the victims differently, and additional compensation was paid for the dead.
The systemized measures to support flood victims in the late 18th century are noteworthy in that they created a framework for disaster administration that could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rather than just temporary chan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one-step change in the reporting and supporting system for flood victims in late 18th-century Joseon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histor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analyzed flood damage in Joseon through the lens of agricultural damage, this study focuses on non-agricultural damage such as house collapse and loss of life.
From the 1780s, King Jeongjo shaped the procedures for the investigation, reporting, and inspection, as well as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flood victim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This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ensate victims properly, and it continued into the 19th century. The government began to pay compensation to flood victims by expanding the beneficiaries of the support system (called “Hyuljeon (恤典)), which existed as a concept to relieve special victims that could not be helped by general agriculture policy. While at first only provincial victims were compensated, from 1782, compensation was also paid to capital victims. The scale of the house damage was categorized to compensate the victims differently, and additional compensation was paid for the dead.
The systemized measures to support flood victims in the late 18th century are noteworthy in that they created a framework for disaster administration that could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rather than just temporary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18세기 후반 정조대부터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수해 이재민에 대한 조사-보고-摘奸 방식과 恤典의 시행 기준이 구체화되어 정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체계는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1783년(정조 7) 무렵부터는 ‘漢城府民家頹壓單子’라는 보고형식이 자리 잡혔으며, 부실 조사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지방에서도 1778년(정조 2) 수해 이재민의 명단을 보고하는 체계가 정립되었고, 1782년에는 보고가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선 휼전, 후 보고’의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재민 보고는 이들에 대한 恤典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18세기에 휼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해 이재민에게도 휼전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에만 휼전이 시행되었지만 1782년 무렵부터는 한성부 이재민에 대해서도 휼전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1787년 무렵부터는 수해로 인한 가옥 피해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휼전도 차등적으로 시행하였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휼전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수해 이재민 지원책을 구체화·제도화·명문화한 것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재해행정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사회의 재난 대처능력을 역사 속에서 고찰하겠다는 문제의식 아래 조선후기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측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한 단계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18세기 후반 ...
이 논문에서는 인간사회의 재난 대처능력을 역사 속에서 고찰하겠다는 문제의식 아래 조선후기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측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한 단계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18세기 후반 정조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홍수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는 일반적인 ‘農政’이나 ‘荒政’의 개념으로 구제되었던 반면, 가옥 피해와 인명 피해와 같은 비농업적인 피해는 ‘恤典’의 개념으로 구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수해는 주로 ‘荒政’ 차원에서 분석되었으나, 본고는 ‘恤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조대부터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수해 이재민에 대한 조사-보고-摘奸 방식과 恤典의 시행 기준이 구체화되어 정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체계는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 1783년(정조 7) 무렵부터는 ‘漢城府民家頹壓單子’라는 보고형식이 자리 잡혔으며, 부실 조사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지방에서도 1778년(정조 2) 수해 이재민의 명단을 보고하는 체계가 정립되었고, 1782년에는 보고가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선 휼전, 후 보고’의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재민 보고는 이들에 대한 恤典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18세기에 휼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해 이재민에게도 휼전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에만 휼전이 시행되었지만 1782년 무렵부터는 한성부 이재민에 대해서도 휼전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1787년 무렵부터는 수해로 인한 가옥 피해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휼전도 차등적으로 시행하였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휼전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수해 이재민 지원책을 구체화·제도화·명문화한 것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재해행정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1985
2 심태현, "측우기 관측에 의한 서울 강우량의 변동성" 2006
3 원재영, "조선후기 진휼정책과 賑資의 운영 - 1809~10년 전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회 (64) : 201-247, 2013
4 경석현, "조선후기 재이론의 정치적 기능의 변질과 관습화" 한국사연구회 (188) : 293-330, 2020
5 경석현, "조선후기 재이론(災異論)의 변화 : 이론체계와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경희대 2018
6 김미성, "조선후기 국용 목재 유통업자들의 관계망" 한국역사연구회 (124) : 317-356, 2022
7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ㆍ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 給糧策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 : 366-401, 1998
8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중국․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문사철 2018
9 원재영, "조선시대 재해행정과 17세기 후반 진휼청의 상설화" 국학연구원 (172) : 133-167, 2015
10 김미성, "조선시대 생태환경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후사ㆍ재해사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사학회 (8) : 49-90, 2022
1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1985
2 심태현, "측우기 관측에 의한 서울 강우량의 변동성" 2006
3 원재영, "조선후기 진휼정책과 賑資의 운영 - 1809~10년 전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회 (64) : 201-247, 2013
4 경석현, "조선후기 재이론의 정치적 기능의 변질과 관습화" 한국사연구회 (188) : 293-330, 2020
5 경석현, "조선후기 재이론(災異論)의 변화 : 이론체계와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경희대 2018
6 김미성, "조선후기 국용 목재 유통업자들의 관계망" 한국역사연구회 (124) : 317-356, 2022
7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ㆍ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 給糧策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 : 366-401, 1998
8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중국․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문사철 2018
9 원재영, "조선시대 재해행정과 17세기 후반 진휼청의 상설화" 국학연구원 (172) : 133-167, 2015
10 김미성, "조선시대 생태환경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후사ㆍ재해사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사학회 (8) : 49-90, 2022
11 오호성, "조선시대 農本主義思想과 經濟改革論" 경인문화사 2009
12 김두섭, "조선시대 漢城府 人口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26 : 1993
13 김성희, "조선 숙종 연간의 재난 극복 노력과 보민(保民) 의식의 정치적 함의" 백산학회 (122) : 201-223, 2022
14 정형지, "제2부 한국중세사의 탐색 :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소 (30) : 231-258, 2003
15 김성우,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회 (188) : 217-256, 2020
16 이정림, "이익(李瀷)의 새로운 재이(災異) 분류와 재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확대" 한국과학사학회 42 (42): 97-123, 2020
17 김경숙, "을병대기근기 향촌사회의 경험적 실상과 대응" 역사실학회 (61) : 5-39, 2016
18 정현숙, "서울지역 월강수량과 강수일수 ; 1770-1907" 30 : 1994
19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2008
20 "萬機要覽"
21 "續大典"
22 "經國大典"
23 "牧民心書"
24 "正祖實錄"
25 "李載文家屋文記"
26 文勇植,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 運營의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9
29 趙允旋, "朝鮮後期 天觀과 災異論의 自然法思想的 접근" 10 : 2003
30 李英雨, "朝鮮 正祖朝의 福祉政策에 관한 연구-罹災民·兒童·老人 福祉政策을 중심으로-" 안동대 2015
31 원재영, "朝鮮 後期 賑恤政策의 구조와 운영 —1814~1815년 전라도 任實縣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143) : 325-375, 2008
32 "新補受敎輯錄"
33 "承政院日記"
34 "弘齋全書"
35 "國朝寶鑑"
36 "各司謄錄"
37 "典律通補"
38 "六典條例"
39 "備邊司謄錄"
40 하서정, "仁祖대 災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대구사학회 127 : 157-187, 2017
41 김일권, "『승정원일기』영정조대 30년간(1770~1779) 측우기록과 우량주척 고찰" 조선시대사학회 (84) : 111-185, 2018
42 이태진,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的 원인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72 : 1996
43 Vinita Damodaran, "The Palgrave Handbook of Climate History" Palgrave Macmillan 2018
44 조희구, "18世紀 韓國의 氣候變動 – 降雨量을 中心으로 -" 22 : 1979
45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25 : 1997
46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소 (43) : 71-129, 2011
47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부산경남사학회 (85) : 323-367, 2012
48 나종일,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94․95 : 1987
49 김문기,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氣候變動" 부산경남사학회 (77) : 133-194, 2010
50 원재영, "17~18세기 재해행정과 御史의 역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5) : 233-268, 2016
51 이준호, "1623~1800년 서울지역의 기상기후 환경-‘승정원일기’를 토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22 (22): 856-874, 2016
52 김태웅, "(교점 역해) 정원고사" 서울대학교출판원 2017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김성숙의 민족운동 전략과 정치이념의 특징 -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 初探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신주백
- 2022
- KCI등재
-
‘항미원조’(抗美援朝)와 중국조선족 문학의 형성 : 연변대학교 학생문예지 『개간』(開墾)을 예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석길매
- 2022
- KCI등재
-
극예술연구회 공연작 <인형의 가>의 무대 형상화와 무대디자인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남석
- 2022
- KCI등재
-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2)-하곡 정제두의 초기 필사본 『存言』『大學說』『中庸解』의 소개와 분석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임미정
- 2022
- KCI등재




 KCI
KCI 스콜라
스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