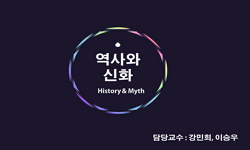In ancient Korean myths and rituals, birds were regarded as very sacred, symbolizing the sun, mediating heaven and earth, connecting with ancestral gods. So it was used in funerals to mediate the world and the next world, or used in farming rites as a...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신성한 새에서 현실의 새로- = Changes in the Idea of Korean Ancient Birds -From the Holy Bird to the Reality Bird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6173736
-
저자
이장웅 (고려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The Idea of Birds ; Duck-shaped Earthenware ; Ceremonial Tool ; Bird-shaped Earthenware ; Myth ; Ritual Ceremonies ; Goguryeo ; Baekje ; Silla ; Wooden Tablet ; 새(鳥類) 관념 ; 鴨形土器 ; 鳥形土器 ; 儀器 ; 神話 ; 祭祀 儀禮 ; 高句麗 ; 百濟 ; 新羅 ; 木簡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327-380(54쪽)
-
KCI 피인용횟수
1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pecially, noting that duck-shaped earthenware made in Yeongnam region and bird-shaped earthenware made in Honam region, had declined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ies, the Idea of birds that was considered sacred in mythology and ritual ceremonies would have changed. In actual literature, white pheasants and sparrows began to take shape rather than abstract mythological ideas after this period, as they were regarded as a marvelous one supporting the monarchy or as a sign of good or bad. And gradually the bird is recognized as a strange animal rather than a divine one, so it is managed in gardens and its meaning as a hunting object or food seems to be gradually becoming stronger.
In ancient Korean myths and rituals, birds were regarded as very sacred, symbolizing the sun, mediating heaven and earth, connecting with ancestral gods. So it was used in funerals to mediate the world and the next world, or used in farming rites as a medium for calling out gods of grai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earches on birds that show such sanctity, the birds that appear in the records as a sign of good or bad, and the birds that appear as food materials as targets for hunting and management, respectively, have been studied partially. In this article want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and examine the flow in a comprehensive way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in new ideas over time.
Especially, noting that duck-shaped earthenware made in Yeongnam region and bird-shaped earthenware made in Honam region, had declined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ies, the Idea of birds that was considered sacred in mythology and ritual ceremonies would have changed. In actual literature, white pheasants and sparrows began to take shape rather than abstract mythological ideas after this period, as they were regarded as a marvelous one supporting the monarchy or as a sign of good or bad. And gradually the bird is recognized as a strange animal rather than a divine one, so it is managed in gardens and its meaning as a hunting object or food seems to be gradually becoming stronger.
국문 초록 (Abstract)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鴨形土器와 호남 지역의 鳥形土器가 5・6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때까지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새 관념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문헌 기록상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흰 꿩이나 참새 등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신기한 서상물로 여겨지거나 길흉의 징조로 파악되면서 추상적인 신화 속 관념보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새가 신성한 의미보다는 신기한 동물로 인식되어 정원 등에서 관리되고, 사냥 대상이나 음식물로서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대의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새(조류)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거나 조상신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장송 의례에 사용되거나, 穀靈神을 불러다 ...
한국 고대의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새(조류)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거나 조상신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장송 의례에 사용되거나, 穀靈神을 불러다 주는 매개체로 농경의례에 사용되면서 매우 신성시되었다. 그동안에는 이처럼 신성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새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길흉의 징조로 瑞祥 기록 속에 나타나는 새, 사냥과 관리 대상이면서 음식 재료로 나타나는 새 등에 대하여 각각 단편적으로 연구되었다. 본고는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집성하고, 그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시기에 따른 새 관념의 차이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鴨形土器와 호남 지역의 鳥形土器가 5・6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때까지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새 관념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문헌 기록상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흰 꿩이나 참새 등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신기한 서상물로 여겨지거나 길흉의 징조로 파악되면서 추상적인 신화 속 관념보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새가 신성한 의미보다는 신기한 동물로 인식되어 정원 등에서 관리되고, 사냥 대상이나 음식물로서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홍종, "論山 麻田里 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2 김영희, "호남지방 鳥形土器의 성격" 호남고고학회 44 : 79-107, 2013
3 김태곤,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4 전덕재,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5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6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32 : 1999
7 권주현,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왕궁의 식문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학회 (68) : 263-300, 2012
8 조태섭, "청주 봉산리 삼국시대 토광묘 출토 꿩뼈의 연구" 중부고고학회 16 (16): 5-25, 2017
9 고은별, "임당 고총 동물부장 연구 : 조류 부장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106) : 138-171, 2018
10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한국목간학회 (20) : 79-104, 2018
1 이홍종, "論山 麻田里 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2 김영희, "호남지방 鳥形土器의 성격" 호남고고학회 44 : 79-107, 2013
3 김태곤,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4 전덕재,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5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6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32 : 1999
7 권주현,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왕궁의 식문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학회 (68) : 263-300, 2012
8 조태섭, "청주 봉산리 삼국시대 토광묘 출토 꿩뼈의 연구" 중부고고학회 16 (16): 5-25, 2017
9 고은별, "임당 고총 동물부장 연구 : 조류 부장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106) : 138-171, 2018
10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한국목간학회 (20) : 79-104, 2018
11 이양수, "영혼의 전달자-새, 풍요, 숭배" 국립김해박물관 2004
12 고은별,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분석자료집Ⅰ-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13 이기길,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14 이용현, "안압지와 東宮 庖典" 國立慶州博物館 1 : 2007
15 이용현,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 한국역사연구회 (65) : 253-287, 2007
16 홍보식, "신라·가야지역 象形土器의 변화와 의미" 한국상고사학회 90 (90): 35-64, 2015
17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회 (38) : 215-261, 2016
18 김길식,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硏究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19 金東淑,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硏究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20 김영관, "삼국시대 동물원에 대한 고찰" 신라사학회 (13) : 1-51, 2008
21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考古자료의 성격" 백제문화연구소 1 (1): 177-204, 2012
22 박중환, "문헌자료를 통해 본 百濟 祭祀의 動物犧生" 9 : 2010
23 李俊貞,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2013
24 이준정, "꿩 대신 닭?-고분 부장 동물유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韓國考古學會 2017
25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26 김용성,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문화재연구원 (15) : 61-104, 2014
27 장인성,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백제 원지" 백제문화연구소 (56) : 367-388, 2017
28 최영주, "鳥足文土器의 變遷樣相" 한국상고사학회 55 (55): 79-114, 2007
29 趙現鐘, "鳥形木製品과 農耕儀禮" 호남사학회 19 : 571-583, 2002
30 "魏書"
31 이희덕, "高麗時代 天文思想과 五行說 硏究" 一潮閣 2000
32 李志映, "韓國神話의 神格 由來에 관한 硏究" 태학사 1995
33 李恩奉, "韓國古代宗敎思想-天神・地神・人神의 構造" 集文堂 1984
34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3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36 이용현, "釜山 금석문-역사를 새겨 남기다" 부산시립박물관 2018
37 이성주, "貯藏祭祀와 盛饌祭祀 : 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영남고고학회 (70) : 106-141, 2014
38 김훈희, "蕨手型 有刺利器의 變遷과 意味" 한국고고학회 (81) : 39-76, 2011
39 신대곤, "羽毛附冠飾의 始末" 8 : 1997
40 金東秀, "神話를 통해본 古代人의 鳥類觀" 44 : 2000
41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墓-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10 : 1981
42 金永炫, "百濟社會의 災異觀에 관한 고찰" 45 : 1989
43 한정호, "百濟 절터 출토 壁畵片과 法隆寺 玉蟲廚子" 석당학술원 (60) : 241-270, 2014
44 "白虎通"
45 "漢書"
46 모기철, "池山洞 44號古墳 出土 動物遺骸에 對한 考察,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1979
47 "東國李相國集"
48 "日本書紀"
49 尹瑞石, "新羅時代 飮食의 硏究-三國遺事를 中心으로 하여-" (創刊) : 1980
50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硏究" 民族社 1992
51 金東淑, "新羅ㆍ伽耶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硏究" 영남고고학회 30 : 59-98, 2002
52 "山海經"
53 "宋書"
54 서울대학교 박물관,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1985
55 국립진주박물관, "固城貝塚" 2003
56 "周書"
57 "史記"
58 權珠賢, "加耶人의 生活文化-食文化를 中心으로" 16 : 1999
59 "三國遺事"
60 "三國志"
61 "三國史記"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선
- 2019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창겸
- 2019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유키오 리핏
- 2019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구난희
- 2019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6 | 0.97 | 2.484 | 0.48 |




 스콜라
스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