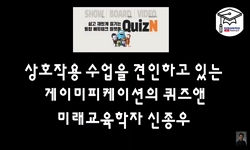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Yeong‐sam government and find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 How to Secure the Stability of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Major Variables : Since the Kim Yeong‐sam Administration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4008349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 exogenous variables ; stability ; conflicts within the South ;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Structural factors ; 대북정책 ; 변수 ; 안정성 ; 남북관계 ; 남남갈등관계 ; 한미관계 ; 북미관계 ; 전략적 선택론 ; 상호작용 ; 구조적 요인 ; 대외정책 환경 ; 지정학 ;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 exogenous variables ; stability ; conflicts within the South ;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Structural factors
-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69-100(32쪽)
-
KCI 피인용횟수
6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Yeong‐sam government and find out some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such policie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ly, what has been the most critical influence on the advancement or chang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an exogenous variable that has resulted from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 Powers. It may also be viewed that self‐help efforts and changes i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ritical internal variable in such transi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order to respond to such a change in their respective ways. Secondly, in terms of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such conflicts have rather fomented disunity and discord in an era in which national consolidation should be sought, such conflicts have served as an internal factor in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South Korea’s policies on the North. Thirdly, one of the most critical exogenous variables regarding this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 particula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cannot be resolv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its own, which pu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stuck in the middle. Moreover, such difficulty has served as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urthly,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the chang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North Korea as South Korea’s main enemy whereas the U.S. is the South Korea’s closest ally―has turned out to serve an important exogenous variable tha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South Korea’s implementation and political decisions regarding its policies on North Korea,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annot be controlled by South Korea. In conclusion, such structural factors resulting from the geopolitical and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South Korea’s historical development have influenced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other than it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s future policies on North Korea must consider such various factors like international, geopolitical and ideological ones,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such policies, regardless of which administration is incumbent. Based on this analysis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entire foreign policies,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should be decided in advance b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hange in internal circumstance of Korean society. Despite the possible creation of tailor‐mad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such entire contexts and structure, it should be accurately and elaborately pushed forward so as to eliminate possible difficulty in controlling intervention variables through prior works such as the arrangement of a pre‐road map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cooperation in an effort to maximize the effect of i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prior to their full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변화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강대국간 관계변화에서 오는 외생적 요인이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려는 남북 양측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권의 변화도 남북관계변화에 중요한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남갈등관계에서는 남남갈등이 국민적 통합을 지향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 가운데,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양상으로 남아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내생적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생변수는 한미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북공조문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북한핵문제 해결문제인데, 특히 북한핵문제 자체가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관계의 발전에도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넷째, 북미관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정책의 특성상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변화이므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 역사적 전개과정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 변수가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대북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지정학적, 이념적 개입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대외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및 한국사회의 내부 상황 변화가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에 연계시켜 나온 맞춤형 대북정책이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대북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구도정리 및 정책공조 시스템 확립, 즉 사전정지작업을 통하여 개입변수의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하여야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태회, "향후 대북정책의 과제와 보완방안,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평화" 2002
2 김성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2001
3 윤황, "한반도분단의 해경을 위한 남․북한 외교의 접근방안 모색 in: 분단 극복을 위한 초석-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도서출판 매봉 2003
4 하영선,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28 (28): 1998
5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97-116, 2002
6 이인호, "통일지상주의는 현실 외면한 복고주의: 남남갈등 해결의 길- 상호이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
7 통일부, "통일백서, 1997-2008" 2008
8 김홍수, "참여정부의 전반기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8 (8): 119-136, 2005
9 성경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9 (9): 5-34, 2008
10 남궁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인식, 방향, 과제" 21세기정치학회 18 (18): 233-254, 2008
1 허태회, "향후 대북정책의 과제와 보완방안,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평화" 2002
2 김성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2001
3 윤황, "한반도분단의 해경을 위한 남․북한 외교의 접근방안 모색 in: 분단 극복을 위한 초석-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도서출판 매봉 2003
4 하영선,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28 (28): 1998
5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97-116, 2002
6 이인호, "통일지상주의는 현실 외면한 복고주의: 남남갈등 해결의 길- 상호이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
7 통일부, "통일백서, 1997-2008" 2008
8 김홍수, "참여정부의 전반기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8 (8): 119-136, 2005
9 성경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9 (9): 5-34, 2008
10 남궁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인식, 방향, 과제" 21세기정치학회 18 (18): 233-254, 2008
11 김달중,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도서출판 오름 1998
12 정경환, "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3 (3): 2003
13 윤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6자회담 개최 이후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8 (8): 5-25, 2007
14 최진욱, "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2 (52): 127-160, 2009
15 윤황, "북한의 6자회담 협상전략·전술: 평가와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105-128, 2008
16 안문석,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 관료정치 모델의 적용" 한국정치학회 42 (42): 207-226, 2008
17 허태회, "부시공화당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 (1) : 2001
18 손병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 북미 양자대화로의 전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2 (52): 29-49, 2009
19 김기정, "민주화와 한국외교정책: 이론적 분석의 틀 모색" 32 (32): 1992
20 김학성,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2000
21 김용호, "대북정책과 국제관계이론: 4자회담과 햇볕정책을 중심으로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36 (36): 135-154, 2002
22 김창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8 (8): 51-72, 2003
23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11 (11): 73-97, 2008
24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6
25 성경륭,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85-312, 2008
26 김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의도와 능력" 2 (2): 2002
27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in: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도서출판 오름 1998
28 Klare. Michel,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St. Martin's Press 1994
29 Rumsfeld.Donald,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2002
30 Azaar.Edaward, "The Use of Semantic Dimensions in the Scaling of International Events" 17 : 1981
31 Campbell.Kurt, "The Cusp of Strategic Change in Asia" 2001
32 Lee. Rensselaer, "Terrorism, the Future, and U.S. Foreign Policy" 2002
33 Lake. David,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34 Preston. Thomas,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and the Foreign Policy Advisory Process. in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sights and Evidence" Rowman & Lilltefield Publishers 2004
35 Niksch.Larr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2007
36 Cha.Victor, "Korea'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2002
37 Allison.Graham T, "Essence of Decison: Expla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38 Hanlon.Michael O, "Cruise Control: A Case for Missile Defense" (67) : 2002
39 Bolton.John, "Beyond the Axis of Evil: Additional Threats from WMD" (743) : 2002
40 Przystup.James, "Anticipating Strategic Surprise on the Korean Peninsula" (190) : 2002
41 Daalder.Ivo, "A New Agenda for Nuclear Weapons" Brookings Institution 2002
42 허태회, "9.11이후 대테러전쟁과 한반도정세:미국의 전략과 영향" 13 (13): 2002
43 로동신문, "2008년 4월 1일자"
44 연합뉴스, "2008년 4월 1일자"
45 민주조선, "2008년 3월 27일자"
46 조선중앙통신, "1999년 6월 19일자"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의 중도(via media)?:영국학파 다시보기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황영주
- 2009
- KCI등재후보
-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독점(political monopoly)’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한병진
- 2009
- KCI등재후보
-
조기경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정보분석 능력 개선방안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허태회
- 2009
- KCI등재후보
-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영호
- 2009
- KCI등재후보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933 | 0.12 |




 KCI
KCI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