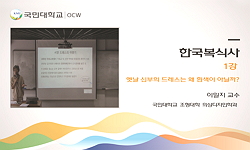『청대일기』는 청대 권상일(1679~1759)이 20세가 되던 1702년 1월 1일부터 1759년 7월 1일까지 57년간 총 425개월에 걸쳐, 권상일이 자신과 가족의 일상은 물론 친지, 동료, 관직생활 등의 다양한 생...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041102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85-228(44쪽)
-
KCI 피인용횟수
14
- 제공처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 건국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식 의례와 의식을 유교식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보급, 확산해나갔다. 전통 의례ㆍ의식과의 충돌이 적지 않았으나, 사림세력이 등장하고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심화되면서 유교식 의례는 점차로 생활에 정착되어 토착화 되어 갔다. 본 논문에서는 『청대일기』의 기록에 나타난 18세기 영남 사족들의 생활의례, 특히 혼례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권상일의 집안과 인근 가문들은 지역과 가문을 고려한 통혼권을 폐쇄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동성이본간의 혼인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6세기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고려하여 특정 가문들간에 연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점차로 집성촌의 형성과 함께 지역과 학연을 고려한 통혼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권상일의 가계는 지역적으로 영천, 선산, 안동의 범위 내에서 오랜 친분이 있는 집안들과 중첩적인 혼례를 행하였다. 또한 권상일의 4촌 범위 내에서도 진성이씨, 의성김씨, 풍산유씨, 평산신씨, 경주이씨 등과의 중첩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자가례』에 입각한 의례의 진행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18세기 영남지역에서는 관례)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혼례의 준비과정으로 축소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관례의 절차와 소용되는 의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큰 경제적으로 부담이었기 때문이며, 권상일의 경우는 戒賓을 招致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대일기』에 기록된 15명의 관례는 모두 定婚ㆍ擇日을 마친 후 혼례의 준비 과정으로 행해졌으며, 나이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에 따라 거행하였다. 또한 여자의 계례는 행하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종법질서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조선 건국 직후부터 男歸女家婚의 거주 방식은 당면과제였다. 16세기 양가의 결정이 우선되면서도 혼례 후 신부는 친정에 거주하고 신랑이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였던 거주 관행은 『청대일기』에서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8세기 권상일 집안에서는 혼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행하여 시댁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지켜졌다. 한편, 초례를 마친 신랑은 신행할 때까지 처가에 여러 차례 再行을 하였는데, 그 횟수와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행 기간과 자녀의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첫 자녀를 출산한 후에 조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또한 출산은 친정의 혼례ㆍ제례 등과 함께 친정에 勤行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근행은 일종의 신행으로 인한 상실감을 보상하는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 16세기 남귀여가혼에서는 신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행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행이 보편화 되면서 여성들의 근행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권상일의 집안에서는 子婦ㆍ孫婦ㆍ女孫들의 친정 勤行이 엄격하게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는 18세기 영남지역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혼인 후 거주 방식과 함께 남편 사후의 생활이 친정과 보다 밀접하였던 환경도 18세기에는 변화하였다. 즉,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여성들은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시댁에서 거주하였다. 권상일의 자부는 남편 사후 시댁 인근에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시댁의 범위 내에서 남편의 제사와 자녀들의 혼인을 함께 지켜보며 시댁의 일원으로서 자리하였다.
『청대일기』는 청대 권상일(1679~1759)이 20세가 되던 1702년 1월 1일부터 1759년 7월 1일까지 57년간 총 425개월에 걸쳐, 권상일이 자신과 가족의 일상은 물론 친지, 동료, 관직생활 등의 다양한 생활상을 매일 매일 기록한 것이다.
조선 건국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식 의례와 의식을 유교식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보급, 확산해나갔다. 전통 의례ㆍ의식과의 충돌이 적지 않았으나, 사림세력이 등장하고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심화되면서 유교식 의례는 점차로 생활에 정착되어 토착화 되어 갔다. 본 논문에서는 『청대일기』의 기록에 나타난 18세기 영남 사족들의 생활의례, 특히 혼례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권상일의 집안과 인근 가문들은 지역과 가문을 고려한 통혼권을 폐쇄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동성이본간의 혼인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6세기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고려하여 특정 가문들간에 연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점차로 집성촌의 형성과 함께 지역과 학연을 고려한 통혼권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권상일의 가계는 지역적으로 영천, 선산, 안동의 범위 내에서 오랜 친분이 있는 집안들과 중첩적인 혼례를 행하였다. 또한 권상일의 4촌 범위 내에서도 진성이씨, 의성김씨, 풍산유씨, 평산신씨, 경주이씨 등과의 중첩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자가례』에 입각한 의례의 진행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18세기 영남지역에서는 관례)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혼례의 준비과정으로 축소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관례의 절차와 소용되는 의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큰 경제적으로 부담이었기 때문이며, 권상일의 경우는 戒賓을 招致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대일기』에 기록된 15명의 관례는 모두 定婚ㆍ擇日을 마친 후 혼례의 준비 과정으로 행해졌으며, 나이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에 따라 거행하였다. 또한 여자의 계례는 행하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종법질서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조선 건국 직후부터 男歸女家婚의 거주 방식은 당면과제였다. 16세기 양가의 결정이 우선되면서도 혼례 후 신부는 친정에 거주하고 신랑이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였던 거주 관행은 『청대일기』에서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8세기 권상일 집안에서는 혼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행하여 시댁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지켜졌다. 한편, 초례를 마친 신랑은 신행할 때까지 처가에 여러 차례 再行을 하였는데, 그 횟수와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행 기간과 자녀의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첫 자녀를 출산한 후에 조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또한 출산은 친정의 혼례ㆍ제례 등과 함께 친정에 勤行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근행은 일종의 신행으로 인한 상실감을 보상하는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 16세기 남귀여가혼에서는 신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행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행이 보편화 되면서 여성들의 근행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권상일의 집안에서는 子婦ㆍ孫婦ㆍ女孫들의 친정 勤行이 엄격하게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는 18세기 영남지역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혼인 후 거주 방식과 함께 남편 사후의 생활이 친정과 보다 밀접하였던 환경도 18세기에는 변화하였다. 즉,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여성들은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시댁에서 거주하였다. 권상일의 자부는 남편 사후 시댁 인근에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시댁의 범위 내에서 남편의 제사와 자녀들의 혼인을 함께 지켜보며 시댁의 일원으로서 자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 on the life rite of Young Nam Sajok(literati family), especially a wedding ceremony with 『Diary of the Cheongdae』
First of all, Gwon Sang-il's family tried to keep Goryeo wedding culture. It was still normal to get married with the same surname and the different family origin. Marriage with closed family considered their financial conditions and social positions. In result it built up family compilation village and the marriage considering of financial power or study members settled down in the 16th. Gwon's family got married the people who had been closed with for ages in Young Cheon, Sun San and An Dong. The Marriages overlapped under his cousinhood with Lee family of Jin Seong, Kim Family of Ui Seong, Yu family of Pung San, Shin Family of Pyong San and Lee family of Kyung Ju.
In Young Nam province, preparing marriage ceremony based on 『주자가례(朱子家禮, Family Rituals Chuja-garye)』was reduced for complication ceremony and heavy financial problems. In the case of Gwon's family, the marriage ceremonies of 15 people reported in 『Diary of the Cheongdae』cut down its formality for the sake of convenience without being trouble with their ages or wedding seasons.
It was a problem that the brides staying with her family and the grooms going and coming both parents houses in the patriarchal system but that was a little changed. According to 『Diary of the Cheongdae』, after marriage ceremony, the brides or grooms stayed their family's house for a while and after that the women had to come back to their husband's family. There is no accurate evidence how many times and how long they did this, but it was clear that they went back to their husband's family after they had a first child. Having a baby was a important reason that married daughters came to their family regularly including family sacrifices and wedding ceremonies.
I believe that married daughters coming to their parents house was sort of reward that they couldn't come to see their family often for the rite. This was normal for Young Nam province in the 18th and Gwon's family dind't prohibit for the his family's women such as daughter in law, grand son's daughter in law, grand daughters, to go and come to their parents' houses.
In the 18th, a widow didn't go back to their parents and lived with their children in the near husband's family's house. So Gwon's daughter in law did and joined her husband sacrifice and her children's wedding ceremonies.
『Diary of the Cheongdae』written by Gwon Sang-il(1679~1759) who worked in Cheongdae, PoliticsㆍAdministrationㆍLegislation of Chosen, is about his family's life and his career and a story of his co-workers from March 1st, 1702 to July 1st, 1759 f...
『Diary of the Cheongdae』written by Gwon Sang-il(1679~1759) who worked in Cheongdae, PoliticsㆍAdministrationㆍLegislation of Chosen, is about his family's life and his career and a story of his co-workers from March 1st, 1702 to July 1st, 1759 for fifty seven years. Chosen spreaded 『주자가례(朱子家禮, Family Rituals Chuja-garye)』to reorganize Buddhist etiquette to Confucian that caused a big confusion. But the people got used to be with Confucian rite gradually by Sarim coming on as a group of rural neo-Confucian scholars and growing interests of Seongnihak.
This paper focus on the life rite of Young Nam Sajok(literati family), especially a wedding ceremony with 『Diary of the Cheongdae』
First of all, Gwon Sang-il's family tried to keep Goryeo wedding culture. It was still normal to get married with the same surname and the different family origin. Marriage with closed family considered their financial conditions and social positions. In result it built up family compilation village and the marriage considering of financial power or study members settled down in the 16th. Gwon's family got married the people who had been closed with for ages in Young Cheon, Sun San and An Dong. The Marriages overlapped under his cousinhood with Lee family of Jin Seong, Kim Family of Ui Seong, Yu family of Pung San, Shin Family of Pyong San and Lee family of Kyung Ju.
In Young Nam province, preparing marriage ceremony based on 『주자가례(朱子家禮, Family Rituals Chuja-garye)』was reduced for complication ceremony and heavy financial problems. In the case of Gwon's family, the marriage ceremonies of 15 people reported in 『Diary of the Cheongdae』cut down its formality for the sake of convenience without being trouble with their ages or wedding seasons.
It was a problem that the brides staying with her family and the grooms going and coming both parents houses in the patriarchal system but that was a little changed. According to 『Diary of the Cheongdae』, after marriage ceremony, the brides or grooms stayed their family's house for a while and after that the women had to come back to their husband's family. There is no accurate evidence how many times and how long they did this, but it was clear that they went back to their husband's family after they had a first child. Having a baby was a important reason that married daughters came to their family regularly including family sacrifices and wedding ceremonies.
I believe that married daughters coming to their parents house was sort of reward that they couldn't come to see their family often for the rite. This was normal for Young Nam province in the 18th and Gwon's family dind't prohibit for the his family's women such as daughter in law, grand son's daughter in law, grand daughters, to go and come to their parents' houses.
In the 18th, a widow didn't go back to their parents and lived with their children in the near husband's family's house. So Gwon's daughter in law did and joined her husband sacrifice and her children's wedding ceremo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머리말
- Ⅰ. 권상일의 생애와 혼례
- Ⅱ. 권상일 자손의 혼례
- Ⅲ. 혼례 절차와 일상
- 요약
- 머리말
- Ⅰ. 권상일의 생애와 혼례
- Ⅱ. 권상일 자손의 혼례
- Ⅲ. 혼례 절차와 일상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축사와 字說을 통해본 관례-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103 : 2006
2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外의 남녀관계-盧尙樞의 <日記(1763-1829)>를 중심으로" 28 : 2006
3 "조선후기 疾病史 연구-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96 : 18-24,
4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계승의 관념" 12 : 2001
5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80 : 1995
6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28 : 2006
7 "16세기말 四書禮의 성립과 예학의 발달" 1991
8 "16세기 兩班家의 婚姻과 家族關係-李文楗의 齋日記를 중심으로-" 97 :
9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 설행과 그 성격" 26 (26): 2000
10 "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1989
1 "축사와 字說을 통해본 관례-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103 : 2006
2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外의 남녀관계-盧尙樞의 <日記(1763-1829)>를 중심으로" 28 : 2006
3 "조선후기 疾病史 연구-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96 : 18-24,
4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계승의 관념" 12 : 2001
5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80 : 1995
6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28 : 2006
7 "16세기말 四書禮의 성립과 예학의 발달" 1991
8 "16세기 兩班家의 婚姻과 家族關係-李文楗의 齋日記를 중심으로-" 97 :
9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 설행과 그 성격" 26 (26): 2000
10 "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1989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사학회
- 李基東(Lee Ki-Dong)
- 2007
- KCI등재
-
- 한국사학회
- 이개석(Yi Kae-Seok)
- 2007
- KCI등재
-
- 한국사학회
- 曺秉漢(Cho Byong-Han)
- 2007
- KCI등재
-
- 한국사학회
- 장석흥(Chang Seok-Heung)
- 2007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1 | 1.11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3 | 1.05 | 2.153 | 0.42 |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