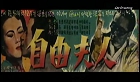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집합기억의 역학을 분석하고 이 장에서 구식민지였던 조선-남한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문제적인 것은, 전후 일본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행위가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66447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전후 일본 ; 기억-기록의 정치학 ; 전쟁 기억 ; 식민지 기억 ; 이웃 ; 월경적 연애 ; 인양서사 ; 후지와라 데이 ; 이범선 ; 히노 게이조 ; 『灰色の丘』 ; 『검은해협』 ; 『親和』 ; postwar Japan ; the politics of memories and writings ; memory of the war ; memory of the colony ; neighbor ; transnational love ; hikiage narrative ; Hujiwara Tei ; Lee Beomseon ; Hino Keizo ; Geomeun Haehyeop(Black Strait)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45-87(43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집합기억의 역학을 분석하고 이 장에서 구식민지였던 조선-남한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문제적인 것은, 전후 일본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행위가 결코 식민지를 기억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기억-기록의 장에서 드러나는 불균형과 구식민지를 향한 현실적, 상징적 처리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이래 일본에서는 전쟁(패전)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기록물과 재현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 재/구성되어 왔다. 반면 구식민지 조선에 대한 기억은 소거되었다. 그러나 당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조선-남한이 서로에 대해 맺고 있던 관계를 보여주는 몇몇 자료들이 존재한다. 해방된 조선-남한에 대해서 일본은 연장된 식민주의나 공포와 같은,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1945년 이후, 기존의 제국/식민지라는 계서제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난 조선은 일본에 대해, 동등한 위상을 갖는 불투명한 ‘이웃’이 되었다. 이제는 ‘이웃’이 되어버린 타자로서의 조선은 일본의 자기의식을 계속 자극하는 존재가 된다. ‘인양서사’는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의 복잡한 자기 구축의 맥락과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조선-남한과 일본의 경계를 넘나드는 ‘월경적 연애’의 상상이 갖는 의미론적 위상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에서 나온 월경적 연애의 서사들 즉 후지와라 데이의 『灰色の丘』, 이범선의 『검은해협』, 히노 게이조의 중단편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와 더불어 『親和』의 담론을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s of the collective memories of postwar Japan and the position of the old colony Korea at terms of postcolonial Japanese memories-field. It is problematic that the memories of the war don’t mean the memories of the col...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s of the collective memories of postwar Japan and the position of the old colony Korea at terms of postcolonial Japanese memories-field. It is problematic that the memories of the war don’t mean the memories of the colonies which Empire Japan had occupied. Therefore, it’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unevenness of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the way of treatment of past colonies like Korea in postwar Japan. Since 1945, various kinds of memories or representations concerning (defeated) war had been continuously (re)produced and (re)constructed, while those of old colony Korea have been erased in postwar Japan. But there are some materials which describe realistic and symbol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Toward liberated Korea, postwar Japan has contradictory attitudes such as extended colonialism and fear for the others. Liberated Korea which got out of empire/colony hierarchy became equal but obscure ‘neighbor’, that is to say the other who stimulates self-consciousness of defeated Japan. The narratives of Japanese refugees(hikiagesha) show the context and process of complicated self-construction in postwar Japan. Especially, this paper probes the location and meaning of imagination regarding ‘transnational love’ between postwar Japan and Korea, focusing on the novels and essays written in 1950s~1970s. For this work, I analyze Hujiwara Tei(藤原てい)’s 『灰色の丘』, Lee Beomseon’s Geomeun Haehyeop(Black Strait), Hino Keizo’s novels and articles of monthly magazine 『親和』.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전쟁 혹은 식민지, 그 기억-기록의 창고를 찾아
- Ⅱ. 해방과 패전 그리고 ‘이웃’이 된다는 것
- Ⅲ. 월경적 연애의 상상과 그 변용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Ⅰ. 전쟁 혹은 식민지, 그 기억-기록의 창고를 찾아
- Ⅱ. 해방과 패전 그리고 ‘이웃’이 된다는 것
- Ⅲ. 월경적 연애의 상상과 그 변용
- 참고문헌
- 〈Abstract〉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최광제(Choi GwangJe)
- 2011
- KCI등재
-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영진(Jeong Young-Jin)
- 2011
- KCI등재
-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명임(Kim Myung-im)
- 2011
- KCI등재
-
〈자린고비 설화〉의 독해 방식과 ‘과장담(誇張譚)’의 문화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류정월(Ryu Jeongwol)
- 2011
- KCI등재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