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pel misunderstandings by analyzing the modern Korean calligraphy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hich had been perceived as retrogressive and pessimistic. The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who took the initia...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 근대 서예 연구(1) — 19세기말⋅20세기초의 서예 — = A Study on Korean Modern Calligraphy(1) - Calligraphy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한글로보기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pel misunderstandings by analyzing the modern Korean calligraphy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hich had been perceived as retrogressive and pessimistic.
The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who took the initiative through the Gabo Reform of 1894 promoted cultural enlightenment. Whether they insisted on independence through strenuous efforts(自强獨立) or taking the old as the basis ad referencing the new(舊本新參)', the culmination of the cultural enlightenment they pursued has in common: establishing a civilized modern state. The ideological tendencies that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held in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directly affect the aesthetic and critical activities of those around them. The most notable people during this period are Oh Sechang and Ahn Jungsik. The editorial cartoon, composed of Oh Sechang's writings and Lee Doyeong's drawings, reflected the worldview of those who wanted independence through strenuous efforts.
Ahn Jungsik, Oh Sechang, and Kim Gyujin, who dominated the central calligraphy group, were representatives of the field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t that time. In terms of the reform of calligraphy, they sometimes cooperated, but they mostly took different stances and tended to be passive. By the way, there were great calligraphers in each region. Some of them went down to the province after being recognized on the central stage, and others devoted themselves to calligraphy and painting by keeping their distance from the central calligraphy group.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Korea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school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laws on the subject of writing practice, there were no textbooks and no historical material for textbooks. However, writing practice was a major subject because it was includ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d-term exam subjects. Since the colonialist educ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was based on civilization education and realistic education, the writ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is literally about learning and writing characters, not calligraphy education. Until the late period of Joseon, there were no national or public primary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only Seodang by the private sector. It is significant that Calligraphy Education Center, a private art education institution operated from July 1907 to January 1908, attempted comprehensive art education, although it was a short period.
In this paper, I have looked into articles and discourses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as well as works about Korean modern calligraphy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lear up any misunderstandings in the past. Furthermore, I believe it will help find the way forward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which is gradually falling into the sha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퇴행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해 왔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한국 근대서예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오해를 불식하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갑오개혁을 통해 개혁...
본 연구는 그동안 퇴행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해 왔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한국 근대서예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오해를 불식하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갑오개혁을 통해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한 관료⋅지식인들은 ‘文明開化’를 추진했다. ‘自强獨立’을 주장했든, ‘舊本新參’을 주장했든 그들이 추진한 ‘문명개화’의 정점에는 ‘문명적 근대 국가 수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관료⋅지식인들이 견지했던 사상적 경향과 노선은 주변 사람들의 미적 활동이나 비평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오세창과 안중식이다. 오세창의 글과 이도영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시사만평은 자강독립론자들의 세계관을 비추는 것이었다.
이 시기 중앙서단에 군림했던 안중식과 오세창⋅김규진 등은 당시 서화계를 대표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혁의 노선을 두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길을 달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비평으로, 때로는 교육을 통해서 나약한 서화가의 길을 걸었다. 이 무렵 각 지역에서도 거목들이 버티고 있었다. 개중에는 이미 중앙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향리에 내려간 경우도 있었으며, 아예 중앙서단과는 거리를 둔 채 초연히 서화에 매진하고 있는 거목들도 많았다.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 근대 학교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습자교과에 대한 법규는 있었으나 전하는 교과서는 없을 뿐 아니라 교과서에 관한 어떠한 사료도 없다. 그러나 소학교 학기말 시험 과목에 습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요교과임에는 분명하다. 통감부가 실시한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은 소위 ‘文明’的 교육과 實學主義적 교육에 바탕을 둔 모범교육이었기 때문에 국어과에서의 습자교육은 그야말로 국어과 안에서의 문자를 익히는 측면의 書法 즉 ‘書方’이 이루어졌을 뿐 ‘書藝’적인 측면에서의 書法敎育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한말에 이르기까지 국공립 초등교육기관이 없었으며 단지 민간의 힘에 의한 서당이 있었을 뿐이었다. 1907년 7월 개설한 사립 미술교육기관인 교육서화관은 1907년 7월에서 1908년 1월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몽적 차원에서 종합예술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19세기말⋅20세기초까지 한국 근대서예를 작품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있는 기사나 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그간의 오해가 풀렸으면 한다. 나아가 점차 빛을 잃어 가고 있는 한국 현대서예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論語"
2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3 예술의 전당, "한국서예100년전" 1988
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역사비평사
5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6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7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8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연구" 교학연구사 1992
9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3
10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2011
1 "論語"
2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3 예술의 전당, "한국서예100년전" 1988
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역사비평사
5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6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7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8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연구" 교학연구사 1992
9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3
10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2011
11 정재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1994
12 이성혜 ; 강명관,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과 성격" 동양한문학회 33 (33): 301-324, 2011
13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4 정재철, "일제의 대한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5 朴南洙, "일제의 대한 식민지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慶尙大學校 敎育大學院 1995
16 김예진, "일제강점기 詩社활동과 書畵合璧圖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68 (268): 195-227, 2010
17 최혜영,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 연구" 홍익대학교 2017
18 俞吉濬, "유길준전서 1" 일조각 1971
19 鄭容和, "유길준(兪吉濬)의 정치사상 연구 :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20 이승연, "위창 오세창의 실학적 예술관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21 고희동, "위창 오세창 선생" 1954
22 정미숙, "운미 민영익의 서화세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4
23 이구열, "신문에 항일⋅구국 시사만화를 그린 이도영" 2004 : 2004
24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25 고미영, "몽인 정학교 서화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2
26 김응현, "동방서예강좌" 동방연서회 1995
27 이인숙, "근대기 김정희 서풍(書風) 확장의 한 예, 석재 서병오" 한국서예학회 (31) : 161-190, 2017
28 최경현, "근대 서화계의 거장 안중식 - 전통의 계승과 도전, 그리고 한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38) : 7-32, 2019
29 수원박물관, "근대 서예와 사군자" 2016
30 이완우, "근대 서예와 사군자" 수원박물관 2016
31 허경, "개화기 초등학교 설립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6
32 李光麟, "韓國開化期의 諸問題" 일조각 1986
33 이구열, "韓國書畫史硏究의 先驅者: 葦滄吳世昌" (27) : 1983
34 松南, "開化守舊兩派의 胥失" 19 : 1908
35 金永基, "金海岡遺墨" 友一出版社 1980
36 조민환, "裕齋 宋基冕의 書藝思想" 간재학회 12 : 107-138, 2011
37 南宮億, "自由論" 9 : 1907
38 張志淵, "自强主義" (3) : 1907
39 김도영, "石亭 李定稷 書畵의 文化財的 價値 硏究" 전남대학교
40 "皇城新聞, 1899.2.8"
41 "皇城新聞 1906.12.8"
42 劉正惠, "海岡 金圭鎭의 생애와 藝術" 弘益大學校 大學院 1978
43 "每日申報 1906.12.7. 1915.4.7. 1919.11.4"
44 李喜秀, "李少南書帖" 涯東書館 1916
45 朴殷植, "朴殷植全書 下"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46 趙庸殷, "新韓國人은 新韓國熱을 要할진뎌" 1 : 1909
47 李鐘麟, "新舊學의 關係" 4 : 1908
48 "承政院日記"
49 姜筌, "我韓에 對하야 强國의 基礎를 논함" 2 : 1909
50 李得秊, "我韓社會觀" 6 : 1909
51 玄采, "幼年必讀釋義"
52 玄采, "幼年必讀"
53 柳永烈, "崔永禧華甲紀念韓國私學論叢" 탐구당 1987
54 이원복, "少南李喜秀의 繪畵" 54 : 1914
55 吳世昌, "對照的의 觀念" (5) : 1-,
56 李起憲, "學問은 不可不參互新舊" 6 : 1909
57 "孟子"
58 金碩桓, "大韓自强會祝辭" (창간) : 1906
59 "大韓自强會月報 2호"
60 주요한, "增補版安島山全書" 흥사단출판사 1999
61 "增補文獻備考"
62 尹孝定, "國家的精神을 不可不發揮" 8 : 1929
63 柳鐸一, "<개화기>미술교과서" 2 : 1980
64 이성혜, "20세기 초, 한국 서화가의 존재 방식과 양상 -守巖 金有鐸을 중심으로-" 우리한문학회 21 : 535-561, 2009
65 전상모, "20세기 초 전통적 서화관의 근대적 변용" 한국서예학회 (36) : 231-248, 2020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한국사상 원형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비교 — ‘풍류(風流)’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회
- 이난수
- 2022
- KCI등재
-
- 동양철학연구회
- 이철승
- 2022
- KCI등재
-
天論의 변천 양상을 통해 본 諸子百家의 사상적 연속성 — 학파의 경계 문제와 직하학궁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회
- 배다빈
- 2022
- KCI등재
-
주역 의 종교성이 갖는 현대적 의미 — 다산역학의 종교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회
- 황병기
- 2022
- KCI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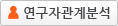
 KCI
KCI KISS
KI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