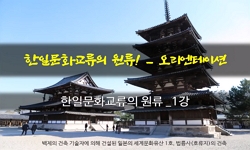전통적인 시각에서 전북 권역은 백제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백제 전 시기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의 일부로 써 중요한 지역이 되기 이전 전북 권...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시각에서 전북 권역은 백제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백제 전 시기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의 일부로 써 중요한 지역이 되기 이전 전북 권역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1~3세기 사이의 전북 지역은 백제가 아니라 마한의 일원으로 지역별 소정치체들이 산재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와는 별개로 전북 동부권에는 가야와 연계된 세력이 존속하였다는 고고학적 인 증거가 나타난다. 따라서 고대 시기 전북 권역의 실재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 적과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분산적인 형태의 다양한 정치체들이 어 떠한 과정을 거쳐 백제라는 하나의 국가적 틀 속으로 흡수·통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북지역사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결국 중앙 중심 의 백제사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고대 시기의 전북 권 역의 역사·문화적 원천 모습에 좀 더 접근하여 지역의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고대 국가 백제와 전북 권역의 마한 그리고 가야 세력이 어떻게 존재하였고, 또 그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2장 에서는 백제에게 복속하기 이전 시기 전북 지역의 존재 양상을 간략하게 알 아보았고, 3장은 전라도 지역이 언제 백제와 조우하여 그 영향권 아래 들어 가게 되는 지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백제의 웅진 천도 이 후 백제가 전라도 지역을 어떻게 재복속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e Jeonbuk region has been understood as part of Baekje. However, this aspect does not apply throughout the pre-Baekje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ality of Jeonbuk area before becoming an import...
Fro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e Jeonbuk region has been understood as part of Baekje. However, this aspect does not apply throughout the pre-Baekje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ality of Jeonbuk area before becoming an important area as part of Baekje. However, the remaining records show that the Jeonbuk area between the 1st and 3rd centuries was not a Baekje but a part of Mahan, where certain localities were scattered. Apart from this, there is archeological evidence that the forces associated with Gaya survived in the eastern part of Jeonbuk. Therefore, in order to know the actual state of the Jeonbuk area in ancient times, new tracking and understanding is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Jeonbuk regional history on how various politics in the form of regional dispersion were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a national framework called Baekje. This will eventually lead to a departure from the central center's perception of Baekje history, In particular, it can help to strengthen the diversity of the region by getting closer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ources of the Jeonbuk region in ancient time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the ancient national Baekje, Mahan and Gaya forces of the Jeonbuk region, and how they merged. First, in Chapter 2, we briefly reviewed the existence of Jeonbuk area before the subjugation to Baekje. Chapter 3 estimated when the Jeolla Province area would encounter Baekje and fall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And in the last chapter, we looked at how Baekje was re-submitted to Jeolla Province after Baekje moved to Woongji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의 상황
- Ⅲ. 백제의 남방 진출과 전북지역의 양상
- Ⅳ. 백제의 재진출과 전북지역의 추이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의 상황
- Ⅲ. 백제의 남방 진출과 전북지역의 양상
- Ⅳ. 백제의 재진출과 전북지역의 추이
-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참고 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50·51) : 1985
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 이현혜,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1998
4 전종국,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5 김기섭, "특집논문1 : 백제문화 활성화 방안 ; 백제 한성기(漢城期) 연구 동향과 과제" 백제문화연구소 (33) : 1-19, 2004
6 "통전"
7 전영래,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8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1976
9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
10 최완규, "전북지역 마한·백제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회 (18) : 125-166, 2016
1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50·51) : 1985
2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3 이현혜,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1998
4 전종국,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5 김기섭, "특집논문1 : 백제문화 활성화 방안 ; 백제 한성기(漢城期) 연구 동향과 과제" 백제문화연구소 (33) : 1-19, 2004
6 "통전"
7 전영래,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8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1976
9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
10 최완규, "전북지역 마한·백제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회 (18) : 125-166, 2016
11 "일본서기"
12 주성지, "웅진시대 백제의 섬진강 수계 진출" 22 : 2003
13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27 : 1997
14 전용신,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15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6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17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일지사 3 : 1976
18 "삼국지"
19 "삼국유사"
20 "삼국사기"
21 김주성,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1) : 267-292, 2015
22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23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24 김근영,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3 : 39-69, 2019
25 이동희,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회 (64) : 74-121, 2007
26 김기섭,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회 (11) : 91-110, 2014
27 문안식,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16 : 2001
28 노중국, "백제의 수리(水利)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회 (4) : 27-41, 2010
29 강봉룡,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신고찰" 26 : 1997
30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7 : 1995
31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5 : 1997
32 이기동,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의 병합" 2 : 1990
33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34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1) : 33-60, 2006
35 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 - 비류집단 복속과 ‘마한’ 국읍 병합을 중심으로* -" 고려사학회 (50) : 7-42, 2013
36 최범호, "백제 온조왕대 강역획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회 (87) : 99-134, 2010
37 정동준,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학회 (91) : 87-123, 2018
38 김영심,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3 : 5-38, 2019
39 박찬규, "문헌자료로 본 전남지역 馬韓小國의 위치" 백제학회 (9) : 22-42, 2013
40 정재윤, "문헌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백제학회 (9) : 110-129, 2013
41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忱彌多禮의 위치" 백제학회 (9) : 67-90, 2013
42 박찬규, "문헌을 통해 본 마한의 시말" 3 : 2010
43 노중국,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회 (6) : 5-32, 2011
44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3 : 2010
45 임영진, "마한토기의 기원 연구 -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회 55 : 60-79, 2017
46 임영진,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10 : 1995
47 서현주,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학회 (50) : 53-87, 2016
48 "남제서"
49 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회 44 : 165-196, 2013
50 임기환,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51 서현주,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52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53 "광개토왕릉비문"
54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55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56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57 김낙중, "고고학 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 백제학회 (9) : 130-167, 2013
58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59 朴重均, "錦江流域原三國期文化의 地域性과 ‘國’의 存在樣態" 호서고고학회 (28) : 58-89, 2013
60 이도학, "谷那鐵山과 百濟" 동아시아고대학회 (25) : 65-102, 2011
61 문안식, "百濟의 領域擴張과 地方統治" 신서원 2002
62 이도학,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백제문화연구소 1 (1): 109-128, 2013
63 今西龍, "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70
64 홍성화, "廣開土王碑文을 통한 『日本書紀』 神功, 應神紀의 분석" 글로벌일본연구원 (13) : 489-514, 2010
65 유우창, "『일본서기』 신공기의 가야 인식과 ‘임나일본부’" 부경역사연구소 (35) : 5-38, 2014
66 최범호, "『삼국사기』 완산주(完山州) 관련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회 (48) : 5-30, 2016
67 김애경,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과 그 성격" 27 : 2000
68 김규운, "5世紀 漢城期 百濟와 加耶 關係" 중앙문화재연구원 (9) : 115-141, 2011
69 백승옥, "4~6세기 백제(百濟)와 가야제국(加耶諸國) -『일본서기(日本書紀)』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회 (7) : 57-78, 2012
70 이인철, "1~3세기경 백제의 군사전략과 영토확장" 44 : 2001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한국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曾田嘉伊智)의 삶과 그 역사적 평가 분석
- 전북사학회
- 김보림
- 2020
- KCI등재
-
- 전북사학회
- 이선아
- 2020
- KCI등재
-
- 전북사학회
- 백승옥
- 2020
- KCI등재
-
宋代 都市民 娛樂文化의 形成과 發展 -南宋 臨安 都市民 娛樂文化의 商業化 傾向을 中心으로-
- 전북사학회
- 정일교
- 2020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 | 0.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3 | 1.181 | 0.14 |




 eArticle
e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