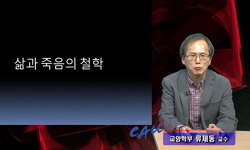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삶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장수를 했든, 단명을 했든, 2000년 전에 살았든 2013년의 오늘을 살아가든, 결국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이라는 현상...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사회학: 한국 죽음기사의 의미구성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48076
- 저자
-
발행기관
-
-
발행연도
2016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여러 대중매체 가운데 특별히 신문은 ‘부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알리는 공간을 갖는다. 소위 ‘저널리즘의 황무지’로 불리는 신문의 ‘부음기사’는 독자들을 장례와 추모에 초대하고, 슬픔을 나눌 기회를 부여하며,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망자(亡者)의 지위와 업적을 칭송하는 기회를 제공한다(Moremen, 2004). 죽음추모는 이제 웹사이트 등 사이버로 확장되면서 사회 공동체 누구나 망자를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음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인생의 연대기이자, 기념비적인 기록이다. 나아가 부음기사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 보여줄 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관련된 잊혀져있던 가치관을 드러낸다. 부음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기억행위(Davies, 1994)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망각했던 사실을 재구성하고, 기억으로 되살려 내는 의식행위이기도 하다(Arnason, Hafsteinsson, & Gretarsdottir, 2003). 때문에 부음기사는 대상이 되는 망자의 삶을 요약하는 전기형식을 띠지만,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보고(report)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망자가 살았던 특정 공동체(사회,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부음기사가 보여주기 때문이다(Hume, 2000).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죽음은 상징적 맥락에 기대어 그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부음기사에 게재된 ‘재현된 죽음’과 ‘실제 죽음’은 같을 수 없다. 부음을 통해 기억되어지는 개인의 죽음은 수많은 죽음 가운데 선별된 이야기(selective narrative)이자, 개인의 죽음과 무관할 수도 있는 사회적 의미가 포함되는 허구적 이야기(fictive narrative)를 포함한다(Gerbner, 1980). 부음기사에 나타나는 기억은 반드시 과거의 이미지나 사실을 그대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표상과 주관적인 현실구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표출된다. 부음은 사회 현실이나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때로는 비유, 상징, 연상, 수사를 통해 형성함으로써 망자의 삶에 대한 하나의 해석적 틀을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삶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장수를 했든, 단명을 했든, 2000년 전에 살았든 2013년의 오늘을 살아가든, 결국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이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대중매체의 출현을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 죽음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고, ‘개인’의 죽음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여러 대중매체 가운데 특별히 신문은 ‘부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알리는 공간을 갖는다. 소위 ‘저널리즘의 황무지’로 불리는 신문의 ‘부음기사’는 독자들을 장례와 추모에 초대하고, 슬픔을 나눌 기회를 부여하며,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망자(亡者)의 지위와 업적을 칭송하는 기회를 제공한다(Moremen, 2004). 죽음추모는 이제 웹사이트 등 사이버로 확장되면서 사회 공동체 누구나 망자를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음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인생의 연대기이자, 기념비적인 기록이다. 나아가 부음기사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 보여줄 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관련된 잊혀져있던 가치관을 드러낸다. 부음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기억행위(Davies, 1994)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망각했던 사실을 재구성하고, 기억으로 되살려 내는 의식행위이기도 하다(Arnason, Hafsteinsson, & Gretarsdottir, 2003). 때문에 부음기사는 대상이 되는 망자의 삶을 요약하는 전기형식을 띠지만,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보고(report)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망자가 살았던 특정 공동체(사회,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부음기사가 보여주기 때문이다(Hume, 2000).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죽음은 상징적 맥락에 기대어 그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부음기사에 게재된 ‘재현된 죽음’과 ‘실제 죽음’은 같을 수 없다. 부음을 통해 기억되어지는 개인의 죽음은 수많은 죽음 가운데 선별된 이야기(selective narrative)이자, 개인의 죽음과 무관할 수도 있는 사회적 의미가 포함되는 허구적 이야기(fictive narrative)를 포함한다(Gerbner, 1980). 부음기사에 나타나는 기억은 반드시 과거의 이미지나 사실을 그대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표상과 주관적인 현실구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표출된다. 부음은 사회 현실이나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때로는 비유, 상징, 연상, 수사를 통해 형성함으로써 망자의 삶에 대한 하나의 해석적 틀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book described what the contents and social value of the deaths appeared to Korea media. Also the book dealt with the central concepts such as obituaries, death and social values, memory and oblivion, collective memory.
This book described what the contents and social value of the deaths appeared to Korea media. Also the book dealt with the central concepts such as obituaries, death and social values, memory and oblivion, collective mem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