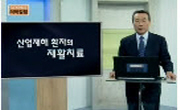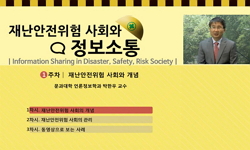본 연구는 재해의 정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으로 재해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논의한다. 언론보도·문학·영화 등의 매체에서 재해가 다뤄지는 방식이 사람들의 재해 인식�...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재해와 안전의 세계사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50507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8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재해 ; 안전 ; disaster ; safety ; natural disaster ; industrial disaster ; systemic disaster ; epidemic ; climate disaster ; geological disaster ; demographic change ; social structure ; safety legislation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globalization ; risk society ; reflexive m ; 자연재해 ; 산업재해 ; 시스템재해 ; 감염병 ; 기후재해 ; 지질학적 재해 ; 인구변화 ; 사회구조 ; 안전입법 ; 산재보험 ; 세계화 ; 위험사회 ; 성찰적 근대화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문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된다. 재해의 기본적 속성에 따라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스템재해가 각 부의 주제가 된다. 각 부에서 해당 재해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 재해가 인류의 역사에 끼친 대표적 영향을 추적하고, 해당 재해에 대처하는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이 어떤 역사적 진화과정을 경험했나를 다룬다.
제 I부는 자연재해를 주제로 한다. 제 2장에서는 자연재해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다. 자연재해를 지질학적 재해, 수재, 기후재해, 감염병,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지구온난화, 생물종다양성 축소 등)로 구분하고 주요 역사적 재해를 검토한다.
제 3장은 자연재해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자연재해가 야기한 인구변화와 관련해서는 흑사병이나 ‘콜럼버스의 교환’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한다. 사회구조에 끼친 영향도 논의의 대상이다. 종교와 사상 측면에서는 재해를 둘러싼 토착신앙, 근대적 과학이론의 영향, 맬서스 인구론이 바라보는 재해관 등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발전시켜온 재해 대응책들로서 상호부조 조직, 보험제도, 국가재난통제체제, 국제적십자운동 등 지역적 단체에서 세계적 조직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제 II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산업재해의 등장과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18-19세기의 1차 및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재해의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련 제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비되었는가를 추적한다. 20세기의 3차 산업혁명 특유의 산업재해 양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 5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체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좇는다. 초기의 자선단체와 종교기관을 통한 구호체제, 책임소재(노동자 대 고용주와 국가)를 둘러싼 논쟁, 산업재해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한 입법과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근대사회의 핵심적 산업재해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
제 III부에서는 현대적 재해인 시스템재해를 다룬다. 제 6장은 상호연계성이 강화된 오늘날의 기술적·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 문제를 고찰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해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적 공조 노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되돌아본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이 초래하는 문제를 Y2K 바이러스, 디도스(DDos) 공격, 금융전산망 해킹과 같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산업 단위를 넘어선 연결성 강화가 내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지능화와 융복합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의 재해에 대해서 예측한다.
제 7장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연구를 통해 형성된 ‘위험사회’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을 되짚어본다. 산업사회 후기로 진행할수록 위험요소가 더욱 커진다는 벡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들을 통해 위험사회 주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속도와 성과에 치중하는 근대사회가 성찰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구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제 8장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시대적 특징을 종합하고 이론적 검토를 결합하여 재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어떤 사회가 재해로부터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를 검토한다. 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 탓인가, 아니면 사람 탓인가? 재해로 인한 개인적 비용의 합은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 첨단기술이 최선의 재해 해결책인가, 아니면 저비용의 국지적 기술인 ‘착한’ 기술이 더 현실적 방안인가?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분석능력의 향상과 방재기술 진보, 재정투입 증가로 오늘날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한다. 재해문제가 단순히 특정 요인을 제어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인식변화·기술변화·제도변화·재정투입변화·교육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해의 정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으로 재해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논의한다. 언론보도·문학·영화 등의 매체에서 재해가 다뤄지는 방식이 사람들의 재해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재해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를 역사적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 확보 방안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밝힌다. 안전도를 높이는 기술, 안전에 관한 규제, 안전 교육, 재해 대비책으로서의 보험 등의 논의의 대상이다.
본문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된다. 재해의 기본적 속성에 따라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스템재해가 각 부의 주제가 된다. 각 부에서 해당 재해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 재해가 인류의 역사에 끼친 대표적 영향을 추적하고, 해당 재해에 대처하는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이 어떤 역사적 진화과정을 경험했나를 다룬다.
제 I부는 자연재해를 주제로 한다. 제 2장에서는 자연재해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다. 자연재해를 지질학적 재해, 수재, 기후재해, 감염병,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지구온난화, 생물종다양성 축소 등)로 구분하고 주요 역사적 재해를 검토한다.
제 3장은 자연재해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자연재해가 야기한 인구변화와 관련해서는 흑사병이나 ‘콜럼버스의 교환’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한다. 사회구조에 끼친 영향도 논의의 대상이다. 종교와 사상 측면에서는 재해를 둘러싼 토착신앙, 근대적 과학이론의 영향, 맬서스 인구론이 바라보는 재해관 등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발전시켜온 재해 대응책들로서 상호부조 조직, 보험제도, 국가재난통제체제, 국제적십자운동 등 지역적 단체에서 세계적 조직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제 II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산업재해의 등장과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18-19세기의 1차 및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재해의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련 제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비되었는가를 추적한다. 20세기의 3차 산업혁명 특유의 산업재해 양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 5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체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좇는다. 초기의 자선단체와 종교기관을 통한 구호체제, 책임소재(노동자 대 고용주와 국가)를 둘러싼 논쟁, 산업재해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한 입법과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근대사회의 핵심적 산업재해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
제 III부에서는 현대적 재해인 시스템재해를 다룬다. 제 6장은 상호연계성이 강화된 오늘날의 기술적·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 문제를 고찰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해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적 공조 노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되돌아본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이 초래하는 문제를 Y2K 바이러스, 디도스(DDos) 공격, 금융전산망 해킹과 같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산업 단위를 넘어선 연결성 강화가 내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지능화와 융복합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의 재해에 대해서 예측한다.
제 7장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연구를 통해 형성된 ‘위험사회’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을 되짚어본다. 산업사회 후기로 진행할수록 위험요소가 더욱 커진다는 벡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들을 통해 위험사회 주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속도와 성과에 치중하는 근대사회가 성찰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구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제 8장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시대적 특징을 종합하고 이론적 검토를 결합하여 재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어떤 사회가 재해로부터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를 검토한다. 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 탓인가, 아니면 사람 탓인가? 재해로 인한 개인적 비용의 합은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 첨단기술이 최선의 재해 해결책인가, 아니면 저비용의 국지적 기술인 ‘착한’ 기술이 더 현실적 방안인가?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분석능력의 향상과 방재기술 진보, 재정투입 증가로 오늘날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한다. 재해문제가 단순히 특정 요인을 제어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인식변화·기술변화·제도변화·재정투입변화·교육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