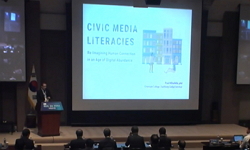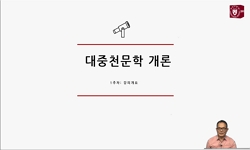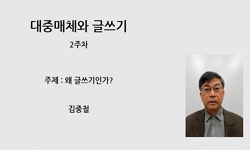The increase of interest and demand toward records and archiv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our society. This phenomenon started to emerge as democracy developed in our society. Producing, archiving and preserving records are the work of the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공론 주체에 관한 연구 -연구자, 당사자, 시민-대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Subjects of Public History: Focusing on Researchers and Parties, People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6491755
-
저자
김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퍼블릭 히스토리 ; 공공역사 ; 공론장 ; 주체 ; 기록학 ; 연구자 ; 관찰자 ; 당사자 ; 목격자 ; 시민 ; 대중 ; 구경꾼 ; 산책자 ; public history ; public sphere ; subject ; archival science ; researchers ; observers ; parties ; witnesses ; citizens ; people ; spectators ; flaneurs
-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63-206(44쪽)
-
KCI 피인용횟수
0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ople began to be the subject of historical descriptions in the public arena as postmodern discourse emerged and the concept of public history emerged. The public history emphasizes 'history of memory' rather than 'history of recording', where the former represents the history of power that was able to produce records, the latter reproduces the history of people who were excluded from power and could not leave records. This is why we need to look into the performance of public history when we study the history of public records.
The history, memories, and records to remain in our day are determined by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in the public sphere to discuss and agree. In this article, the public subjects who participate in the public sphere of memory and history are divided into researchers, parties, and people. The position, perspective and practice of each subject formed around historical events were examined through the analogy of observers, witnesses, and spectators. While the researchers collect the records in the manner of the observer and approaches them through the historical reality, the parties engrave the records in order to preserve the memory of experience gained from the historical events and to resist oblivion. Here, the people decide the meaning of the history, memory, and records in the final level, while observing the publicizing process led by the group of researchers and first parties.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demand toward records and archiv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our society. This phenomenon started to emerge as democracy developed in our society. Producing, archiving and preserving records are the work of the social subject-power. Therefore, the records and archives these days should be understood as historical symbols and contents which indicate us who the social subject i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archivist should find and submit to the public sphere of memory and history which alternatives the archives should be reconstructed by which civic and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demand.
People began to be the subject of historical descriptions in the public arena as postmodern discourse emerged and the concept of public history emerged. The public history emphasizes 'history of memory' rather than 'history of recording', where the former represents the history of power that was able to produce records, the latter reproduces the history of people who were excluded from power and could not leave records. This is why we need to look into the performance of public history when we study the history of public records.
The history, memories, and records to remain in our day are determined by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in the public sphere to discuss and agree. In this article, the public subjects who participate in the public sphere of memory and history are divided into researchers, parties, and people. The position, perspective and practice of each subject formed around historical events were examined through the analogy of observers, witnesses, and spectators. While the researchers collect the records in the manner of the observer and approaches them through the historical reality, the parties engrave the records in order to preserve the memory of experience gained from the historical events and to resist oblivion. Here, the people decide the meaning of the history, memory, and records in the final level, while observing the publicizing process led by the group of researchers and first parties.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대중이 공론장에서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탈근대 담론이 등장하고 퍼블릭 히스토리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퍼블릭 히스토리는 ‘기록의 역사’ 보다는 ‘기억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이는 전자가 기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권력의 역사를 표상하고 있다면, 후자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돼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대중을 중심으로 기록학을 연구할 때 퍼블릭 히스토리의 성과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시대에 남겨야 할 역사와 기억, 기록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공론장에서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기억과 역사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공론 주체를 연구자와 당사자, 시민-대중으로 구분하고, 역사적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각 주체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실천의 모습을 관찰자와 목격자, 구경꾼-산보객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다. 당사자가 역사적 사건에서 얻은 경험 기억을 유지하고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세상에 기록을 새기는 동안, 연구자는 관찰자의 태도로 기록을 모으고 이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다가선다. 여기에서 시민-대중은 연구자와 당사자들이 이끌어 가는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대의 역사와 기억, 기록의 의미를 최종심급에서 결정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아카이브로 정리해 보존하는 것은 사회적 주체-권력이 작동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 시대의 기록과 아카이브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상징이자 콘텐츠로 파악해...
기록을 생산하고 아카이브로 정리해 보존하는 것은 사회적 주체-권력이 작동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 시대의 기록과 아카이브는 사회적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상징이자 콘텐츠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시민-대중의 관심과 요구는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 기록학 연구자는 시민-대중이 요구하는 문화적 기억기관으로서 아카이브가 어떤 원칙과 과정을 통해 (재)구축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찾아 기억과 역사의 공론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대중이 공론장에서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탈근대 담론이 등장하고 퍼블릭 히스토리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퍼블릭 히스토리는 ‘기록의 역사’ 보다는 ‘기억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이는 전자가 기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권력의 역사를 표상하고 있다면, 후자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돼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대중을 중심으로 기록학을 연구할 때 퍼블릭 히스토리의 성과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시대에 남겨야 할 역사와 기억, 기록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공론장에서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기억과 역사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공론 주체를 연구자와 당사자, 시민-대중으로 구분하고, 역사적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된 각 주체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실천의 모습을 관찰자와 목격자, 구경꾼-산보객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다. 당사자가 역사적 사건에서 얻은 경험 기억을 유지하고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세상에 기록을 새기는 동안, 연구자는 관찰자의 태도로 기록을 모으고 이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다가선다. 여기에서 시민-대중은 연구자와 당사자들이 이끌어 가는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대의 역사와 기억, 기록의 의미를 최종심급에서 결정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96) : 243-279, 2011
2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한울 1994
3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4 김기봉, "탈근대 지식인으로서 역사가" 호서사학회 (51) : 219-240, 2008
5 사토 유키에, "집합적 기억과 공간 그리고 도래하는 당사자" 문학들·심미안 (54) : 2018
6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7 유경남, "지금, 광주에서 5·18을 말한다는 것 - 세대 간 역사와 기억의 차이에 대한 단상" 문학들·심미안 (55) : 2019
8 강수택, "지그문트 바우먼의 탈근대적 지식인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5 (25): 2001
9 권귀숙, "제주 4ㆍ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회 35 (35): 2001
10 김태현, "장소성에 기반한 기록집(記錄集) 구성에 관한 연구 : 『노무현 대통령의 지붕 낮은 집』(2019)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60) : 123-159, 2019
1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96) : 243-279, 2011
2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한울 1994
3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4 김기봉, "탈근대 지식인으로서 역사가" 호서사학회 (51) : 219-240, 2008
5 사토 유키에, "집합적 기억과 공간 그리고 도래하는 당사자" 문학들·심미안 (54) : 2018
6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7 유경남, "지금, 광주에서 5·18을 말한다는 것 - 세대 간 역사와 기억의 차이에 대한 단상" 문학들·심미안 (55) : 2019
8 강수택, "지그문트 바우먼의 탈근대적 지식인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5 (25): 2001
9 권귀숙, "제주 4ㆍ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회 35 (35): 2001
10 김태현, "장소성에 기반한 기록집(記錄集) 구성에 관한 연구 : 『노무현 대통령의 지붕 낮은 집』(2019)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60) : 123-159, 2019
11 테사 모리스-스즈키 Tessa Morris-Suzuki, "우리 안의 과거 – media, memory, history 과거는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기억되고 역사화 되는가?" 휴머니스트 2006
12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6): 1999
13 남미숙,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기억"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7
14 나인호,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 독일의 공공역사(Public history)" 역사교육학회 (69) : 73-100, 2018
15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16 마틴 제이 Martin Jay,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출판부 2012
17 조나단 크래리 Jonathan Crary,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출판부 2012
18 설혜심, "소비의 역사-지금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비하는인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7
19 권귀숙, "세대간 기억 전수- 4‧3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38 (38): 53-80, 2004
20 박윤옥, "서구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 19세기 만국박람회 및 박물관을 중심으로 -"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39) : 95-113, 2019
21 이재희, "삼풍백화점 붕괴 20년… 잊혀진 ‘희생자 추모비’"
22 박구용, "부정의 역사철학 – 역사상실에 맞선 철학적 도전" 도서출판 길 2012
23 이다혜, "발터 벤야민의 산보객 Flaneur 개념 분석 -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사학회 (1) : 2009
24 남덕현, "발터 벤야민의 대도시 고고학- 베를린 에세이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원 112 : 63-94, 2018
25 도미니크 풀로 Dominique Poulot, "박물관의 탄생 MUSEE ET MUSEOLOGIE" 돌베개 2014
26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27 박홍원, "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9) : 2005
28 박진빈, "미국 퍼블릭 히스토리와 원주민(Native American)의 역사" 한국서양사학회 (139) : 76-99, 2018
29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30 박종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록관리체계 검토"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8) : 69-102, 2019
31 김태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공간 재배치를 위한 전시체계 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32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회 (200) : 637-663, 2008
33 윤은하,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6 (16): 57-79, 2016
34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회 38 (38): 107-130, 2004
35 알라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36 박경섭,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5・18의 물신화와 성화(聖化)에 대하여" 5.18연구소 18 (18): 45-96, 2018
37 심광현, "근대화/탈근대화의 이중과제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 문화과학사 (22) : 2000
38 강내희, "근대적 제도로서의 박물관 성찰과 한국박물관 운영의민주화" 문화과학사 (40) : 2004
39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13-45, 2008
40 강수택,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회 34 : 2000
41 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연구회 (82) : 2002
42 바네사 R. 슈와르츠 Vanessa R. Schwartz, "구경꾼의 탄생: 세기말파리, 시각문화의 폭발" 마티 2006
43 김윤태,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 - 산업혁명부터 이라크 전쟁까지24개 테마로 세계를 읽는다!" 책과함께 2007
44 조나단 크래리 Jonathan Crary, "관찰자의 기술 – 19세기의 시각과근대성" 문화과학사 1998
45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 (20): 179-229, 2012
46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 (110) : 97-121, 2011
47 이동기,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한국독일사학회 (31) : 119-142, 2016
48 강용수, "공공성의 철학과 문화 창조" 서양근대철학회 12 : 2018
49 김대건, "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 공적성, 공동체성,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 충북연구원 30 (30): 63-85, 2019
50 박상욱, "‘퍼블릭 히스토리(Public History)’에서 ‘역사문화(Geschichtskultur)’로 -독일 ‘퍼블릭 히스토리’의 작용 메카니즘으로서 ‘역사문화’-" 한국서양사학회 (139) : 11-40, 2018
51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2000
52 진태원, "‘서발턴’은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53 이동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책 대안" 역사문제연구소 (99) : 284-313, 2012
54 유경남, "5.18 기억투쟁의 ‘복원’ - 연속과 단절 사이에서" 기념재단 2018
55 독립기념관, "2014년 전시 컨퍼런스: 독립기념관 제3차 상설전시관 교체보완을 위한 새로운 접근"
56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한국기록학회 (14) : 359-388, 2006
57 메모리[人] 서울프로젝트 기억수집가, "1995년 서울, 삼풍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삼풍백화점 참사 기록" 동아시아출판사 2016
58 김택현, "'서발턴의 역사(Subaltern History)'와 제3세계의 역사주체로서의 서발턴" 역사교육연구회 (72) : 1999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대통령기록혁신의 과정과 의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혁신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 이영남
- 2019
- KCI등재후보
-
2017년 카셀 도큐멘타 14 “아테네에서 배우기”의 기록화 스토리텔링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 배은경
- 2019
- KCI등재후보
-
기록물 맥락정보 향상 및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RiC-CM 및 RiC-O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 박선희
- 2019
- KCI등재후보
-
공연예술 영상기록의 현황과 과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 김도연
- 2019
- KCI등재후보




 KCI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