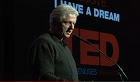본고는 대중잡지 『희망』에 나타난 여성 성공담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 발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생존과 재건·부흥을 둘러싼 개인의 욕망�...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후 재건기의 여성 성공담과 젠더담론 -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 Women’s Success Story and Gender Discourse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 Focusing on Hope, a Popular Magazine of the 1950‘s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7297091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
-
주제어
『희망』 ; 여성 성공담 ; 재건 ; 애국국민 ; 신현모양처 ; 「조경희대담」 ; Hope ; Women’s Success Story ; Reconstruction ; Patriotic People ; Good housewife ; “Cho Kyung-hee Talk”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59-91(33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희망』에 등장하는 전후 재건기 여성성공담은 첫째, 전쟁에 징발된 남성을 대신하는, 대리주체로서의 여성 서사가 있었다. 이는 생존이라는 절대적 요구를 여성이 담당해야만 했던 전후 현실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후, 이것은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가정주부, 소위 ‘신현모양처’ 서사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보수적 여성담론이 확장되어 나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남성의 대리주체가 아닌, 여성자신의 성공담은 주로 전문직종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사에서 나타났다. 우선 개인의 성공은 애국 국민의 서사 즉 국가와 나를 일치시키는 공공 주체의 위치에서 발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성공은 전후 재건과 부흥의 범주 내에서만 긍정되었고, 특히 「조경희대담」에서는 ‘여성의 성공=전후 재건과 부흥/반공=이승만정부의 성공’이라는 현실 구도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여성은, 국가와 개인을 일치시키거나, 권력에 호명당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권력에 순응하는 가운데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전쟁 이후 공적 공간에 진출한 여성의 생존 및 성공담이 대중 서사에 등장했지만, 여성의 위치는 대리주체로서 혹은 남녀 위계구도에 여전히 종속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대중잡지 『희망』에 나타난 여성 성공담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 발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생존과 재건·부흥을 둘러싼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교차되는지, 여성을 호명하는 전후 젠더담론이 어떠한지를 가늠하고자 했다.
『희망』에 등장하는 전후 재건기 여성성공담은 첫째, 전쟁에 징발된 남성을 대신하는, 대리주체로서의 여성 서사가 있었다. 이는 생존이라는 절대적 요구를 여성이 담당해야만 했던 전후 현실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후, 이것은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가정주부, 소위 ‘신현모양처’ 서사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보수적 여성담론이 확장되어 나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남성의 대리주체가 아닌, 여성자신의 성공담은 주로 전문직종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사에서 나타났다. 우선 개인의 성공은 애국 국민의 서사 즉 국가와 나를 일치시키는 공공 주체의 위치에서 발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성공은 전후 재건과 부흥의 범주 내에서만 긍정되었고, 특히 「조경희대담」에서는 ‘여성의 성공=전후 재건과 부흥/반공=이승만정부의 성공’이라는 현실 구도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여성은, 국가와 개인을 일치시키거나, 권력에 호명당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권력에 순응하는 가운데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전쟁 이후 공적 공간에 진출한 여성의 생존 및 성공담이 대중 서사에 등장했지만, 여성의 위치는 대리주체로서 혹은 남녀 위계구도에 여전히 종속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men’s success story during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which appeared in HOPE,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narratives of female figures as agents appeared on behalf of men who went to war. This was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postwar reality that women had to take charge of the absolute demand for survival. This later led to a “good housewife” narrative that underlined her husband’s success. This reveals the expansion of conservative women’s discourse. Second, women’s own success stories, not male agents, were found in articles mainly aimed at professional women. First of all, the success of the individual was expressed as a narrative of the patriotic people who matched the nation with the individual. Therefore, women’s success was only positive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and revival categories. In particular, in the “Cho Kyung-hee Talk,” the structure was “Women’s Success=Post-war R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Anticommunism=Success of the Lee Syng-man government.” In the meantime, women could be recognized for their existence by matching the state with the individual, being called to power, or voluntarily adapting to power. Eventually, the survival and success stories of women who entered public spaces after the war appeared in public narratives, but the position of women as agents or still subordinate to the hierarchy of men and women.
This article was aimed at examining the success story of women in popular magazines(HOPE) and the appearance of women as social subjects after the Korean War. Through this, the government tried to gauge how individual desires and social demands surrou...
This article was aimed at examining the success story of women in popular magazines(HOPE) and the appearance of women as social subjects after the Korean War. Through this, the government tried to gauge how individual desires and social demands surrounding survival, reconstruction, and revival intersect, and what the discourse of post-war gender politics calling women is like.
The women’s success story during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which appeared in HOPE,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narratives of female figures as agents appeared on behalf of men who went to war. This was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postwar reality that women had to take charge of the absolute demand for survival. This later led to a “good housewife” narrative that underlined her husband’s success. This reveals the expansion of conservative women’s discourse. Second, women’s own success stories, not male agents, were found in articles mainly aimed at professional women. First of all, the success of the individual was expressed as a narrative of the patriotic people who matched the nation with the individual. Therefore, women’s success was only positive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and revival categories. In particular, in the “Cho Kyung-hee Talk,” the structure was “Women’s Success=Post-war R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Anticommunism=Success of the Lee Syng-man government.” In the meantime, women could be recognized for their existence by matching the state with the individual, being called to power, or voluntarily adapting to power. Eventually, the survival and success stories of women who entered public spaces after the war appeared in public narratives, but the position of women as agents or still subordinate to the hierarchy of men and women.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소형, "한국신문의 인터뷰기사 도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6 : 2000
2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한국여성문학학회 (46) : 7-37, 2019
3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修身)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 ― 『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2) : 109-126, 2008
4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5 최배은, "전쟁기에 발간된 잡지 <희망>의 ‘희망’ 표상 연구-아동․청소년 담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23 (23): 131-159, 2017
6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66) : 295-321, 2015
7 허윤, "전쟁기 『희망』과 남성성의 젠더 전략" 이화어문학회 (43) : 143-170, 2017
8 한영현, "잡지 <희망>이 상상한 전후 재건 도시" 대중서사학회 23 (23): 203-242, 2017
9 홍순애, "잡지 <희망>의 반공, 냉전이데올로기의 구축과 분열 -수기, 회고를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23 (23): 322-365, 2017
10 조윤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 - 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 47 : 115-136, 2015
1 김소형, "한국신문의 인터뷰기사 도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6 : 2000
2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한국여성문학학회 (46) : 7-37, 2019
3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修身)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 ― 『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2) : 109-126, 2008
4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5 최배은, "전쟁기에 발간된 잡지 <희망>의 ‘희망’ 표상 연구-아동․청소년 담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23 (23): 131-159, 2017
6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66) : 295-321, 2015
7 허윤, "전쟁기 『희망』과 남성성의 젠더 전략" 이화어문학회 (43) : 143-170, 2017
8 한영현, "잡지 <희망>이 상상한 전후 재건 도시" 대중서사학회 23 (23): 203-242, 2017
9 홍순애, "잡지 <희망>의 반공, 냉전이데올로기의 구축과 분열 -수기, 회고를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23 (23): 322-365, 2017
10 조윤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 - 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 47 : 115-136, 2015
11 "월간 『희망』 1-88호"
12 권보드래,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1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14 전숙희, "문학, 그 영원한 기쁨" 혜화당 1995
15 조풍연, "단행본·잡지 등 범출판계" 출판문화 1975
16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 (20): 103-130, 2016
17 "『주간희망』 1-135호"
18 임은희,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1950년대 <월간희망> 문예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23 (23): 95-130, 2017
19 서울역사편찬원,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2018
20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한국근대서지학회 13 : 2016
21 김혜수,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2 : 2000
22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68) : 369-400, 2016
23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학회 23 (23): 9-55, 2017
24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회 30 : 397-454, 2010
25 김연숙, "1950년대 잡지 『주간희망』의 대중담론 기획과 여성표상" 국어국문학회 (184) : 443-474, 2018
26 김연숙, "1950년대 잡지 <희망>에 나타난 ‘개인’ 표상" 대중서사학회 23 (23): 57-93, 2017
27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학회 (18) : 387-416, 2007
28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한국근대서지학회 7 : 2013
29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2003
30 최미진, "1950년대 『주간희망』의 콘텐츠 변모와 젠더정치" 한국문학회 (82) : 293-329, 2019
31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한국여성문학학회 (10) : 69-87, 2003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아이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시론 - 도아시(悼兒詩)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전연우 ( Jun¸ Yeon-woo )
- 2021
- KCI등재
-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강정구 ( Kang¸ Jeong-gu )
- 2021
- KCI등재
-
부산 방언의 어휘고저액센트 약화와 파열음의 발성 유형 변화의 상관성 연구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권성미 ( Kwon¸ Sung-mi )
- 2021
- KCI등재
-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방경희 ( Bang¸ Kyoung-hee )
- 2021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11-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HUMANITIES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5 | 0.871 | 0.06 |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