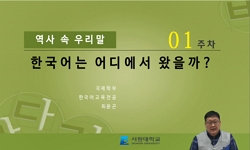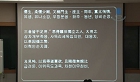이 논문은 훈민정음 반포 후 간행되기 시작한 정음문헌 중 언해의 과정을 거친 『석보상절』(1447년 간행)부터 개간 『법화경언해』(1500년 간행)에 이르기까지의 문헌들, 곧 국문자 반포 초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07309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훈민정음 ; 언해 ; 언해의 개념 ; 언해 사업 ; 언해 문헌 ; 언해 현황 ; 사회문화적 의의 ; Hunminjeongeum ; Eonhae ; Concept of Eonhae ; Eonhae project ; Status of Eonhae ; sociocultural meanings.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5-50(46쪽)
-
KCI 피인용횟수
14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논의를 통해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그러한 언해 사업이 이루어낸 성과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본다.
첫째, ‘언해’는 ‘언자역해(諺字譯解)’, ‘언문역해(諺文譯解)’, ‘언서역해(諺書譯解)’ 등의 줄임말이다. ‘중국어, 또는 한문 원전의 국어 번역’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다. 15세기에는 이 말이 쓰이지 않았다. 16세기 초인 1510년대에 기록, 실록 등의 문건이나 책의 내제(內題)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판심제(版心題)를 포함해서 서명(書名)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의 『소학언해(小學諺解)』(1588년 간행)부터이다. 이후 서명 등에 널리 쓰이면서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학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에까지 소급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본다. 대체로 훈민정음 반포 이후 갑오경장 때까지 간행된 정음문헌 중 중국어, 또는 한문 원전을 국어로 옮긴 문헌 전체를 일러 ‘언해’라 부르고 있다.
언해의 절차는 구결(口訣) 현토(懸吐)에서 시작하여 교정으로 마무리된다. 언해의 전(全) 과정을 활자본 『능엄경언해』(1461년 간행) 권 10의 어제발(御製跋) 중 언해 절차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살폈다.
둘째, 당시에 간행된 언해 문헌 31종을 몇몇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 문헌들의 성격을 밝혔다. 분류 기준은 문헌의 내용, 한자음 주음 방식 등의 문체(文體), 간행 특성, 언해 체제 등이다. 이를 통해 15세기 언해 문헌들의 언해 형식 및 형태 서지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셋째, 언해 문헌들은 우리 문자와 한자를 혼용해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출판양식 창안의 결과였다. 중앙어의 정착 및 보급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아울러 간행된 책의 성격이나 간행 과정의 엄격성으로 당시의 사회상 및 문화적 특성을 또렷하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논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넷째, 언해 사업은 새로 제정된 국문자의 정착 및 보급을 위한 왕실의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당시에 간행된 언해 문헌의 대다수는 불전이었다. 불전의 간행은 조선의 치국이념이나 시대 상황과 배치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들을 언해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 왕실이나 간경도감 등의 국가기관에서 발행했다. 이는 관료 조직인 사대부들과는 달리 왕실에서는 뿌리 깊은 불심에 기대어 국문자의 정착?보급 수단으로 언해를 이용했던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문자에 의한 출판물 간행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언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국문자의 보급과 관련해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고, 인출 양식이었다.
이 논문은 훈민정음 반포 후 간행되기 시작한 정음문헌 중 언해의 과정을 거친 『석보상절』(1447년 간행)부터 개간 『법화경언해』(1500년 간행)에 이르기까지의 문헌들, 곧 국문자 반포 초기에 간행된 언해 문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논의는 다음에 제시하는 몇몇 과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첫째, 학계에서 널리 쓰고 있는 ‘언해’란 용어가 언제부터 어떤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언해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둘째, 당시에 간행된 언해본들은 주로 어떤 성격의 책이며, 언해 체제를 비롯한 형태서지적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간행되었던 당시의 언해본들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이다.
논의를 통해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그러한 언해 사업이 이루어낸 성과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본다.
첫째, ‘언해’는 ‘언자역해(諺字譯解)’, ‘언문역해(諺文譯解)’, ‘언서역해(諺書譯解)’ 등의 줄임말이다. ‘중국어, 또는 한문 원전의 국어 번역’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다. 15세기에는 이 말이 쓰이지 않았다. 16세기 초인 1510년대에 기록, 실록 등의 문건이나 책의 내제(內題)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판심제(版心題)를 포함해서 서명(書名)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의 『소학언해(小學諺解)』(1588년 간행)부터이다. 이후 서명 등에 널리 쓰이면서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학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에까지 소급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본다. 대체로 훈민정음 반포 이후 갑오경장 때까지 간행된 정음문헌 중 중국어, 또는 한문 원전을 국어로 옮긴 문헌 전체를 일러 ‘언해’라 부르고 있다.
언해의 절차는 구결(口訣) 현토(懸吐)에서 시작하여 교정으로 마무리된다. 언해의 전(全) 과정을 활자본 『능엄경언해』(1461년 간행) 권 10의 어제발(御製跋) 중 언해 절차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살폈다.
둘째, 당시에 간행된 언해 문헌 31종을 몇몇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 문헌들의 성격을 밝혔다. 분류 기준은 문헌의 내용, 한자음 주음 방식 등의 문체(文體), 간행 특성, 언해 체제 등이다. 이를 통해 15세기 언해 문헌들의 언해 형식 및 형태 서지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셋째, 언해 문헌들은 우리 문자와 한자를 혼용해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출판양식 창안의 결과였다. 중앙어의 정착 및 보급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아울러 간행된 책의 성격이나 간행 과정의 엄격성으로 당시의 사회상 및 문화적 특성을 또렷하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논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넷째, 언해 사업은 새로 제정된 국문자의 정착 및 보급을 위한 왕실의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당시에 간행된 언해 문헌의 대다수는 불전이었다. 불전의 간행은 조선의 치국이념이나 시대 상황과 배치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들을 언해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 왕실이나 간경도감 등의 국가기관에서 발행했다. 이는 관료 조직인 사대부들과는 달리 왕실에서는 뿌리 깊은 불심에 기대어 국문자의 정착?보급 수단으로 언해를 이용했던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문자에 의한 출판물 간행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언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국문자의 보급과 관련해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고, 인출 양식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artially demonstrates status of Eonhae project in early age of Choseon and performance of the project in terms of sociocultural meanings.
First of all, Eonhae stands for Eonjayeokhae(諺字譯解), Eonmunyeokhae(諺文譯解), and Eonseoyeokhae(諺書譯解). Eonhae means translation in Hangeul from Chinese character. In 15th century, a term of Eonhae did not exist. In 1510s A.D., Eonhae firstly appeared in documents and Naeje(內題). Since Sohakeonhae(小學諺解, 1588 A.D.) had published, Eonhae was widely used in title of documents including Pansimje(版心題). After the adopting Eonhae for title of documents, using Eonhae was generalized. Based on this phenomenon, academics presume that Eonhae was used retroactively from 15th century. Generally, we call all Jeongeummunheon, which were translated in Hangeul from Chinese character, as Eonhae from middle of 15th century to Kapogyeongjang(甲午更張, 1894 A.D.).
A process of Eonhae starts from Gugyeol(口訣) Hyeonto(懸吐) and finishes after corrections. I examined the process of Eonhae through records of Eojebal(御製跋), which is a part of Hwaljabon Neungeomgyeongeonhae(活字本 楞嚴經諺解, 1461 A.D.).
Secondly, I classified 31 classes of Eonhae books and elucidated the features of those Eonhae books. Criterions of the classifying are contents of Eonhae books, styles of writings, publication characteristics, and Eonhae systems. Through those criterions, I arranged Eonhae type and bibliographic style of Eonhae documents of 15th century.
Thirdly, Eonhae documents were creative publication form because Eonhae mixed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 Eonhae contributed spread and settlement of standard Korean language, too. Also, Eonhae vividly proves social aspects and cultural status through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documents and strictness of a process in publications.
Fourth, I identified that Eonahe project related to willingness of royal family for spread and settlement of Hangeul. Although publication of Buljeon(佛典) which was the most parts of Eonhae was opposite to governing ideology and era circumstances of Choseon, Bulkyeongs were main objects of Eonhae. The most of Eonhae were published by national organizations like Gangyeongdogam(刊經都監) or royal organizations. This fact proves that royal family of Choseon, unlikely high officials and nobles, used Buddhism as an instrument of spread and settlement of Hangeul.
Above series-processes resulted in documents publication of Hangeul and creation of new cultural model. In conclusion, Eonhae was a creative translation form for propagation of Hangeul after creation of Hunminjeongeum.
This paper studies literatur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beginning of promulga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those literatures were kinds of Jeongeummunheon(正音文獻) from Seokbosangjeol(釋譜詳節, 1447 A.D.) to Gaegan Beopwhagyeo...
This paper studies literatur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beginning of promulga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those literatures were kinds of Jeongeummunheon(正音文獻) from Seokbosangjeol(釋譜詳節, 1447 A.D.) to Gaegan Beopwhagyeongeonhae(改刊 法華經諺解, 1500 A.D.). Main argument of this paper starts from necessity of elucidation of following questions. First of all, from when did we start using a term of Eonhae(諺解), and what was the meaning of Eonhae? What was a process of Eonhae? Secondly, what were the features an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Eonhaebon(諺解本)? Thirdly, what are sociocultural value and meaning of those Eonhaebon which were massively published in relatively short period?
This paper partially demonstrates status of Eonhae project in early age of Choseon and performance of the project in terms of sociocultural meanings.
First of all, Eonhae stands for Eonjayeokhae(諺字譯解), Eonmunyeokhae(諺文譯解), and Eonseoyeokhae(諺書譯解). Eonhae means translation in Hangeul from Chinese character. In 15th century, a term of Eonhae did not exist. In 1510s A.D., Eonhae firstly appeared in documents and Naeje(內題). Since Sohakeonhae(小學諺解, 1588 A.D.) had published, Eonhae was widely used in title of documents including Pansimje(版心題). After the adopting Eonhae for title of documents, using Eonhae was generalized. Based on this phenomenon, academics presume that Eonhae was used retroactively from 15th century. Generally, we call all Jeongeummunheon, which were translated in Hangeul from Chinese character, as Eonhae from middle of 15th century to Kapogyeongjang(甲午更張, 1894 A.D.).
A process of Eonhae starts from Gugyeol(口訣) Hyeonto(懸吐) and finishes after corrections. I examined the process of Eonhae through records of Eojebal(御製跋), which is a part of Hwaljabon Neungeomgyeongeonhae(活字本 楞嚴經諺解, 1461 A.D.).
Secondly, I classified 31 classes of Eonhae books and elucidated the features of those Eonhae books. Criterions of the classifying are contents of Eonhae books, styles of writings, publication characteristics, and Eonhae systems. Through those criterions, I arranged Eonhae type and bibliographic style of Eonhae documents of 15th century.
Thirdly, Eonhae documents were creative publication form because Eonhae mixed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 Eonhae contributed spread and settlement of standard Korean language, too. Also, Eonhae vividly proves social aspects and cultural status through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documents and strictness of a process in publications.
Fourth, I identified that Eonahe project related to willingness of royal family for spread and settlement of Hangeul. Although publication of Buljeon(佛典) which was the most parts of Eonhae was opposite to governing ideology and era circumstances of Choseon, Bulkyeongs were main objects of Eonhae. The most of Eonhae were published by national organizations like Gangyeongdogam(刊經都監) or royal organizations. This fact proves that royal family of Choseon, unlikely high officials and nobles, used Buddhism as an instrument of spread and settlement of Hangeul.
Above series-processes resulted in documents publication of Hangeul and creation of new cultural model. In conclusion, Eonhae was a creative translation form for propagation of Hangeul after creation of Hunminjeongeu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언해의 개념 및 언해 절차
- 3. 언해본 현황
- 4. 언해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언해의 개념 및 언해 절차
- 3. 언해본 현황
- 4. 언해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
- 5. 맺음말
- Abstract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In 朝鮮佛敎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36
2 이동림,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아한학회 4 (4): 73-82, 1972
3 안병희, "훈민정음 언해의 두어 문제, In 벽사 이우성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21-33, 1990
4 안병희,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195 : 419-421, 1987
5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402-, 1990
6 김완진, "한국어 문체의 발달" 일지사 1983
7 김상현, "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 문답" 일지사 84 : 28-45, 1996
8 안병희,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58-, 1977
9 이승재, "주본 화엄경 권 제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학회 7 : 1-32, 2001
10 김영배, "조선초기의 역경" 대각사상연구원 5 : 9-40, 2002
1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In 朝鮮佛敎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36
2 이동림,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아한학회 4 (4): 73-82, 1972
3 안병희, "훈민정음 언해의 두어 문제, In 벽사 이우성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21-33, 1990
4 안병희,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195 : 419-421, 1987
5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402-, 1990
6 김완진, "한국어 문체의 발달" 일지사 1983
7 김상현, "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 문답" 일지사 84 : 28-45, 1996
8 안병희,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58-, 1977
9 이승재, "주본 화엄경 권 제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학회 7 : 1-32, 2001
10 김영배, "조선초기의 역경" 대각사상연구원 5 : 9-40, 2002
11 이근수, "조선조의 어문정책" 홍익대학교 출판부 353-, 1979
12 김무봉, "조선시대의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 (23) : 373-418, 2004
13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경희출판사 영인 1918
14 안병희, "임진란 직전 국어사자료에 관한 이삼문제" 진단학회 33 : 88-115, 1972
15 강신항, "이조 초 불경언해 경위에 대하여" 국어연구회 (1) : 1957
16 남풍현, "이두․구결, In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1990
17 한재영, "원각경언해, In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자성사 145-158, 1993
18 천혜봉,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동활자본 석보상절(제20권)" 가나아트 갤러리 (12) : 97-99, 1990
19 김무봉,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658-, 2010
20 김무봉, "역주 불설아미타경언해․불정심다라니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00-, 2008
21 이유기, "역주 남명집언해(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40-, 2002
22 이승재,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In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56-76, 1993
23 안병희, "언해의 사적 고찰" 민족문화추진회 11 : 7-26, 1985
24 이동림,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 27자 책정 근거, In 무애 양주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탐구당 113-144, 1973
25 이동림, "언문과 훈민정음의 관계" 간행위원회 485-498, 1980
26 김영배,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 1 : 305-416, 1998
27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63-, 1984
28 안병희, "세조의 경서구결에 대하여" 서울대 도서관 1-14, 1983
29 정재영,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진본 화엄경 권 20에 대하여" 구결학회 7 : 33-56, 2001
30 김영배,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에 대하여" 간행위원회 705-728, 1990
31 김영배, "선가귀감 언해본 해제" 27 : 1-19, 1992
32 안병희,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회 2 : 17-29, 1974
33 김영배, "석보상절 23․24 주해" 일조각 33-, 1972
34 남풍현, "석독구결의 기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회 100 : 233-242, 1988
35 홍윤표, "불교언어연구 논평"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36 김영배, "불경언해와 중세국어, In 불교문학연구입문 2" 동화출판사 275-295, 1991
37 이호권, "법화경언해, In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133-144, 1993
38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학회 28 : 105-138, 1993
39 김일근, "명황계감과 그 언해본의 정체, In 도남 조윤제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
40 홍윤표,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673-, 1994
41 안병희,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지성사 556-, 1992
42 홍윤표,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 1)" 태학사 571-, 1993
43 이기문, "국어사 개설(개정판)" 탑출판사 264-, 1972
44 이동림, "국문자모의 두 가지 서열에 대한 해명" 논총간행위원회 1 : 1-33, 1993
45 남풍현, "구결과 토" 국어학회 9 : 151-161, 1980
46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710-, 1961
47 이승재,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281-, 1992
48 이승재, "각필 부점구결의 의의와 연구 방법, In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Ⅰ" 태학사 13-33, 2005
49 江田俊雄, "朝鮮語譯佛典に就いて" 再收錄,國書刊行會 (197) : 1997
50 李逢春, "朝鮮前期 佛典 언해와 그 思想에 대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8
51 江田俊雄, "朝鮮佛敎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77
52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刀江書院 1940
53 김무봉,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연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57) : 5-47, 2011
54 김무봉, "15세기 국어사 자료 연구" 동악어문학회 34 : 91-119, 1999
55 鄭宇永, "15세기 국어 문헌자료의 표기법 연구"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5
56 강신항, "(수정 증보판)訓民正音 硏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76-, 2003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동악어문학회
- 배연형(Bae, Yeon Hyung)
- 2012
- KCI등재
-
- 동악어문학회
- 윤인숙(Yun, In Sook)
- 2012
- KCI등재
-
- 동악어문학회
- 홍선미(Hong, Sun Mi)
- 2012
- KCI등재
-
조선전기 두시(杜詩) 이해의 지평과 『두시언해(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 동악어문학회
- 김남이(Kim, Nam Yi)
- 2012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5-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어문학연구 -> 동악어문학외국어명 : Th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  |
| 2015-02-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동악어문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Th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8-04-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Dong-ak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Th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7 | 0.67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1 | 0.8 | 1.224 | 0.23 |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