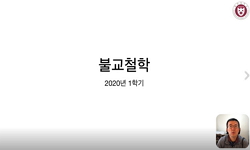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o change the perception of death of modern Koreans through the historical view of ancient Koreans in ancient Korean history books. Ancient history books for review are Samguk-Sagi(三國史記) and Samgug-...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6378751
-
저자
정효운 (동의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Samguk-Sagi ; Samgug-Yusa ; View of death ; Soul view ; View of the world after death ; Confucianism ; Buddhism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사생관 ; 영혼관 ; 사후세계관 ; 유교 ; 불교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343-376(34쪽)
-
KCI 피인용횟수
0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the term ‘sasaeng’ is used more frequently than ‘saengsa’ in ancient Korean times and preceded the era. The idea of the soul after death is divided into ‘yeong(靈)’ and ‘hon(魂)’, ‘gui(鬼)’, ‘sin(神)’ etc. In the case of the afterlife, the Confucian and Buddhist post-mortem worldview prevailed more than ideas such as shamanic otherworld and Taoist fairyland. In other words, Samguk-Sagi emphasized the temporal view of Confucian scholars, and Samgug-Yusa reflected Confucian view with the rebirth and paradise of Buddhism.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complex aspects of ancient Korean thinking that are stratified and stratified by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Confucianism and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o change the perception of death of modern Koreans through the historical view of ancient Koreans in ancient Korean history books. Ancient history books for review are Samguk-Sagi(三國史記) and Samgug-Yusa(三國遺事). As a methodology, I examined ‘sasaeng(死生)’, the use of ‘saengsa(生死)’, the ideology of the soul and the afterlife to recognize the state after death and where the soul lives.
As a result, the term ‘sasaeng’ is used more frequently than ‘saengsa’ in ancient Korean times and preceded the era. The idea of the soul after death is divided into ‘yeong(靈)’ and ‘hon(魂)’, ‘gui(鬼)’, ‘sin(神)’ etc. In the case of the afterlife, the Confucian and Buddhist post-mortem worldview prevailed more than ideas such as shamanic otherworld and Taoist fairyland. In other words, Samguk-Sagi emphasized the temporal view of Confucian scholars, and Samgug-Yusa reflected Confucian view with the rebirth and paradise of Buddhism.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complex aspects of ancient Korean thinking that are stratified and stratified by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Confucianism and Buddhism.
국문 초록 (Abstract)
그 결과, 한국 고대에서는 ‘사생’ 의 용어가 ‘생사’ 보다 많이 사용되고, 시대적으로도 선행하였다. 사후 영혼의 관념도, ‘靈’, ‘魂’, ‘鬼’, ‘神’으로 구분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세관의 경우, 무교의 저승이나 도교의 선계와 같은 관념보다 유교적, 불교적 사후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삼국사기』는 유학자의 합리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기에 충효를 강요하는 현세적 사생관이 강조되었고, 『삼국유사』에는 불교사관의 영향으로 윤회와 극락이란 연기설 중심의 사생관과 더불어 유교적 사생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고대한국인의 사생관과 타계관 혹은 내세관 역시 한국의 고대가 불교국가였다는 막연한 관념에 의해 접근하는 방식은 재고를 요한다고 본다. 유교를 숭상하는 지식계층이나 불교를 신앙하는 집단 등과 같이 영혼관과 사후세계관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계층화, 중층화 되는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대 한국인의 사서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死生觀 분석을 통해 현대인 한국인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고대 한국의 ...
본 연구는 고대 한국인의 사서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死生觀 분석을 통해 현대인 한국인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고대 한국의 역사서인 이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사생관을 비교 분석하고, 방법론으로는 삶과 죽음의 용어인 ‘생사’와 ‘사생’의 용례 비교, 죽은 후의 상태를 인식하는 영혼의 관념과 영혼이 거처하는 사후세계의 공간을 의미하는 他界觀이나 來世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 고대에서는 ‘사생’ 의 용어가 ‘생사’ 보다 많이 사용되고, 시대적으로도 선행하였다. 사후 영혼의 관념도, ‘靈’, ‘魂’, ‘鬼’, ‘神’으로 구분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세관의 경우, 무교의 저승이나 도교의 선계와 같은 관념보다 유교적, 불교적 사후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삼국사기』는 유학자의 합리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기에 충효를 강요하는 현세적 사생관이 강조되었고, 『삼국유사』에는 불교사관의 영향으로 윤회와 극락이란 연기설 중심의 사생관과 더불어 유교적 사생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고대한국인의 사생관과 타계관 혹은 내세관 역시 한국의 고대가 불교국가였다는 막연한 관념에 의해 접근하는 방식은 재고를 요한다고 본다. 유교를 숭상하는 지식계층이나 불교를 신앙하는 집단 등과 같이 영혼관과 사후세계관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계층화, 중층화 되는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論語"
2 문영석, "해외 죽음학(Thantology)의 동향과 전망" 한국종교학회 (39) : 289-310, 2005
3 이상목, "한국인의 죽음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9 : 2000
4 윤사순, "한국 유학의 흐름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4 (24): 2001
5 "통계청"
6 이상환, "타종교의 내세관에 비추어 본 기독교 내세관의 도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47) : 629-661, 2015
7 박지현, "중국의 영혼과 혼백설" 한국중국어문학회 38 : 31-44, 2002
8 김수청, "유교의 靈魂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성리학을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5) : 263-285, 2005
9 김승혜, "원시유교" 민음사 1990
10 최준식, "신선설에 나타난 장생불사관" 도서출판 창 1992
1 "論語"
2 문영석, "해외 죽음학(Thantology)의 동향과 전망" 한국종교학회 (39) : 289-310, 2005
3 이상목, "한국인의 죽음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9 : 2000
4 윤사순, "한국 유학의 흐름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4 (24): 2001
5 "통계청"
6 이상환, "타종교의 내세관에 비추어 본 기독교 내세관의 도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47) : 629-661, 2015
7 박지현, "중국의 영혼과 혼백설" 한국중국어문학회 38 : 31-44, 2002
8 김수청, "유교의 靈魂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성리학을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5) : 263-285, 2005
9 김승혜, "원시유교" 민음사 1990
10 최준식, "신선설에 나타난 장생불사관" 도서출판 창 1992
11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 13 : 1974
12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회 36 : 1973
13 최진석, "도교의 생사관" 철학연구회 (75) : 53-67, 2006
14 정구복, "김부식의 생애와 업적" 한국학중앙연구원 24 (24): 2001
15 "국회도서관"
16 "국사편찬위원회"
17 "국가통계포탈"
18 나희라, "고대한국인의 사생관" 지식산업사 2008
19 정효운, "韓國 死生學의 現況과 課題 -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167-181, 2009
20 "禮記"
21 "左傳"
22 박광연,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진단학회 (130) : 27-48, 2018
23 김승호, "三國遺事에 보이는 시간관과 과거구성" 동아시아고대학회 (29) : 37-62, 2012
24 "三國遺事"
25 "三國史記"
26 김복순, "『삼국유사』 속의 『삼국사기』" 동국역사문화연구소 (62) : 363-409, 2017
27 남동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회 (61) : 199-240, 2019
28 이강래, "『삼국사기』의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24 (24): 2001
29 정효운, "『삼국사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159-180, 2014
30 정효운, "『고사기』에 나타난 일본인의 사생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291-307, 2018
31 정효운, "『日本書紀』에 나타난 일본인의 사생관" 동아시아일본학회 (60) : 249-272, 2016
32 정효운, "<삼국유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아시아고대학회 (39) : 33-64, 2015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동아시아고대학회
- 서영교
- 2019
- KCI등재
-
- 동아시아고대학회
- 홍성화
- 2019
- KCI등재
-
히토마로(人麻呂) ‘돌 뿌리(岩根)’표현에 깃든 음양사상의 고찰
- 동아시아고대학회
- 고용환
- 2019
- KCI등재
-
- 동아시아고대학회
- 김은정
- 2019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東아시아古代學 -> 동아시아고대학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3 | 0.33 | 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 | 0.29 | 0.686 | 0.09 |




 KCI
KCI eArticle
e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