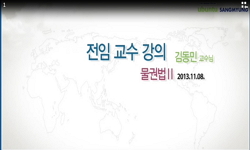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 Korea,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Commons Related Regulations In Each Civil Code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6180292
-
저자
김영희 (연세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Special Servitude ; Collective Ownership ; Joint Ownership ; Iphoegwon ; Commons ; Korean Civil Code ; German Civil Code ; Japanese Civil Code ; 총유 ; 특수지역권 ; 입회권 ; 역권 ; 지역권 ; 인역권 ; 사적소유권 ; 분할소유권 ; 로마법 ; 게르만법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71-327(57쪽)
-
KCI 피인용횟수
1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However, those articles themselves are quite characteristic to the Korean civil code. Neither the German civil code nor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kind of articles. But many of Korean scholars have been taking and arguing the German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S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are in complicated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triggered mainly by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existed the concept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special servitude in the German legal history, although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at kind of articles.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유 규정...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이 총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입회권이라는 명칭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민법학도 한국 민법학과 마찬가지로 총유와 입회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법학은 입회권을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로 파악하는 까닭에 독일 민법학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한편 독일 민법은 정작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민법학이 게르만법 기원의 역사적 공동소유 개념으로 총유를 인정하기는 한다. 독일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도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들 사이의 규정 차이 및 민법학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민법학은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의존이 한국 민법이 근대 민법 중에서 드물게 총유 및 특수지역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 규정 그리고 관련 법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행하여 보려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가또 마사노부, "「소유권」의 탄생" 법우사 2005
2 戒能通孝, "立會の硏究" 日本評論社 1943
3 이가라시 다카요시,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4 김인섭, "현대민법의 전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5 양창수, "한국민법이론의발전" 박영사 1999
6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999
7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27, 2008
8 남효순, "프랑스 민법상의 공동소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998
9 이덕승, "특수지역권의 재고" 한국재산법학회 27 (27): 503-528, 2010
10 강승묵, "특수지역권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16 : 2004
1 가또 마사노부, "「소유권」의 탄생" 법우사 2005
2 戒能通孝, "立會の硏究" 日本評論社 1943
3 이가라시 다카요시,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4 김인섭, "현대민법의 전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5 양창수, "한국민법이론의발전" 박영사 1999
6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999
7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27, 2008
8 남효순, "프랑스 민법상의 공동소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998
9 이덕승, "특수지역권의 재고" 한국재산법학회 27 (27): 503-528, 2010
10 강승묵, "특수지역권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16 : 2004
11 정권섭, "토지소유형태에 관한 일유형-총유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한학문화 3 : 1995
12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13 김영희,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57) : 153-204, 2018
14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한학문화 1 : 1992
15 최식, "총유에 관한 문제" 법조협회 14 (14): 1965
16 정종휴, "청헌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 -특히 총유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9 : 251-288, 2014
17 권철, "일본의 프랑스민법 연구 管見 ― 소유권에 관한 연구를 소재로 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40) : 157-190, 2008
18 나카오 히데도시, "일본의 비실명등기의 유형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법학회 (11) : 1995
19 나카오 히데도시, "일본에서의 입회권의 연구 현황" 한국법사학회 (10) : 1989
20 박인환, "일본메이지민법(물권편:소유권취득·공동소유)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2 : 443-495, 2013
21 정기웅, "일본 메이지민법(물권법: 지역권⋅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한국민사법학회 60 : 497-535, 2012
22 이호정,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특히 합유와 총유를 중심으로-" 24 (24): 1983
23 전경운, "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45-174, 2010
24 김상용, "옷토 폰 길케의 법사상" 한국법사학회 (7) : 1983
25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중앙북스 2007
26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27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1/2/3" 법문사 2010
2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29 김용희, "소유권의 3유형으로서의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분석" 법조협회 23 (23): 1974
30 이태재, "소유권론의 역사적 변천" 한국법사학회 (5) : 1979
31 최병조, "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단체법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19 : 1997
32 김상용, "분할토지소유권의 생성 발전 및 해체에 관한 소고" 한국법사학회 (14) : 1993
33 임상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189-209, 2013
34 송호영,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35 이철우, "법에 있어서 [근대]개념-얼마나 유용한가" 법과사회이론학회 (16․17합본) : 1999
36 임상혁, "민사법체계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122-138, 2009
37 박재윤, "민법주해[VI] 물권(3)" 박영사 1992
38 민일영, "민법주해 [V] 물권(2)" 박영사 1992
39 민일영, "민법주해 [VI] 물권(3)" 박영사 1992
40 김상용, "민법전제정의 과정과 특징-독일, 불란서, 서서 및 일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6 : 1989
41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42 정규상,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3-64, 2012
43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44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45 카를 크뢰셸, "독일민법학논문선" 박영사 2005
46 정종휴, "독일과 일본의 총유이론사" 한국법사학회 (14) : 1993
47 제철웅, "단체와 법인: 사회적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의의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 (36) : 91-126, 2007
48 이희봉, "내가 본 민법안 : 훌륭한 신민법전의 제정을 염원하면서" 사상계사 5 (5): 1957
49 유민상, "국회를 통과한 민법안" 사상계사 6 (6): 1958
50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51 정영신,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한국환경사회학회 18 (18): 2014
52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의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53 이노우에 마코토,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54 김증한, "공동소유형태의 유형론" 2 (2): 1950
55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 안암법학회 (34) : 329-364, 2011
56 김증한, "공동소유에 관한 신민법의 규정" 사상계사 6 (6): 1958
57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1989
58 김영희,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 한국법사학회 (55) : 97-177, 2017
59 헨리 조지, "간추린 진보와 빈곤" 경북대학교출판부 2012
60 筧克彦, "飜譯: 最近に於ける 「ギルケー」氏の団体本質論" 23 (23): 1905
61 이종길, "韓國社會의 所有權 形成過程에 대한 一硏究" 한국법사학회 (19) : 53-102, 1998
62 李鎬奎, "韓國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團體的 所有: 특히, 宗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63 山口敬介, "非営利団体財産に対する離脱者の権利 (1)-(7)" 131 (131): 2014
64 김대정, "總有에 관한 民法規定의 改正方案" 중앙법학회 14 (14): 69-121, 2012
65 三瀦信三, "物權法提要, 上卷" 有斐閣 1927
66 ボアソナード氏起稿, "民法草案財産編講義. 壹.物権之部"
67 平野義太郞, "民法におけるロ―マ思想とゲルマン思想" 有斐閣 1970
68 中田薫, "明治初年の入会権 (1)-(4)" 42 (42): 1928
69 中田薫 述, "日本法制史講義" 創文社 1983
70 江渕 武彦, "日本民法学の共同所有論における学説上の課題" 한국토지법학회 32 (32): 331-354, 2016
71 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論" 岩波書店 1949
72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論" 岩波書店 1927
73 윤철홍, "合有制度에 관한 法史的 考察" 한국법사학회 (18) : 113-133, 1997
74 岩井萬龜, "入會權 : その債權性と近代化" 法律文化社 1976
75 中尾英俊, "入會權 (1)/(2)" 一粒社 1982
76 北條 浩, "入会・入会権とロ-カル・コモンズ" 御茶の水書房 2014
77 渡辺洋三, "入会と法" 東京大学出版会 1972
78 星野英一, "いわゆる 「権利能力なき社団」について" 84 (84): 1967
79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80 末弘嚴太郞, "『物權法』 上卷 下卷" 有斐閣 1926
81 森作太郎, "[トウ]斎法律論文集" 法律新聞社 1917
82 Lynda Butler, "The Commons Concept: An Historical Concept With Modern Relevance" 23 : 835-, 1982
83 John M. Anderies, "Sustaining the Commons, Ver.2.0"
84 木村龜二, "Otto Fr. von Gierkeに就て" 36 (36): 1922
85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C.H.Beck 2017
86 Bernhard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d.1-3" 1906
87 Benno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GB für das Deutsche Reich" Neudruck 1979
88 Otto v.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d.1-3" 1916
89 Otto v. Gierke,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 Bd.1-4" Neudruck 1954
90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해설, 민법총칙․물권편" 법무부 2017
9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법무부 2013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법사학회
- 한상권
- 2019
- KCI등재
-
- 한국법사학회
- 최호동
- 2019
- KCI등재
-
- 한국법사학회
- 김대홍
- 2019
- KCI등재
-
다수설을 따라야 하나? 법률사료의 번역과 이해 ― Inst.4.6.3 et 5 (Publiciana rescissoria actio)를 예증 삼아―
- 한국법사학회
- 최병조
- 2019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 | 1.1 | 0.9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1 | 0.76 | 1.284 | 0.33 |




 KCI
KCI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