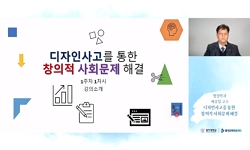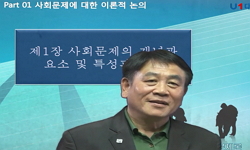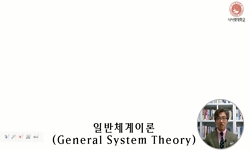1. 개요 □ 연구추진 배경 ○ EU 및 OECD를 중심으로 서구의 혁신정책학자들은 ‘Innovation for social challenge’ or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Challenge’를 주창하며, 일련의 정책대안과 전략...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과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프레임과 정책수단 탐색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E1678268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21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KDC
300
-
자료형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추진 배경
○ EU 및 OECD를 중심으로 서구의 혁신정책학자들은 ‘Innovation for social challenge’ or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Challenge’를 주창하며, 일련의 정책대안과 전략을 내놓고 있음
○ 이들에 의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빈곤, 자살 등 현대사회 삶의 질 저하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가능성 향상’,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확실히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의 정책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가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 사회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임무중심의 정책 시행 (mission oriented policy)
-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새로운 문제해결방법탐색을 위한 리빙랩 확산,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혁신적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시장진출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수요 발굴 등이 제안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거버넌스, 정부부처 산하기관 역량강화 등이 제시됨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때부터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대응을 국가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 관료,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혁신본부의 설립과 더불어 ‘혁신정책’과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대응’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
○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도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정책적 화두가 되어 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혁신’ 이 주요 혁신정책의 목표로 등장함
- (예시) ‘혁신’을 통한 고령화 대응
· 돌봄경제 육성전략,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혁신’과 ‘포용’을 연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조기기 기술개발, AI/IoT 등이 결합된 제품 보급 등이 있음
○ 또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기획과 사업추진 시도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협력사업‘ , ’미세먼지대응사업‘, 고령화 대응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돌봄로봇개발사업‘ 등
□ 연구목적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틀(프레임)을 가져야 할지를 기존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주로 해외자료에 의존하여 도출된 정책프레임이 한국에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기초작업으로서 한국의 정책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함
- 한국에서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혁신정책사업들이 수립/시행되는 관행과 그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표
○ 정부가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을 통해 산업창출, 사회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이론적 검토
○ 사회기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의 틀(프레임) 제시 및 한국의 정책관행 예시
○ 향후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있어 견지해야 할 관점과 연구주제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리뷰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리뷰
-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른 혁신정책프레임의 변화
- 니치창출 및 확장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목적, 적용사례 등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의 주요 동향 및 연구계의 논의 초점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주요 국내 정책 이슈 : 정부측에서 제기한 이슈 및 연구계에서 제기한 이슈
- 국가 기본계획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
-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
-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과 이를 실행하는 정책관행
- ‘혁신’과 ‘사회문제’ 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프레임 영역별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 제시
- 정책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참고사례 고찰
- 정책평가에 기반한 정책개발 사례 : 독일의 FONA 사업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사업 사례 : 독일의 EUREF 사업
○ 향후 연구주제 제시
3. 연구결과
□ 해외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 논의 리뷰
○ ‘사회적 도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목표를 둠
- EU 와 OECD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사회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은 기술적 도전을 넘어, 사회부문의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는 ‘사회적 도전(social challenge)’ 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환적 혁신정책’ 의 맥락에서 의 프레임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Social Challenge’를 지향하는 정책프레임은 연구개발 및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더 나아가 시민의 소비방식의 변화까지도 촉발시키고자 하는 광범위한 내용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요소로 함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특징
○ 정책목표는 거대하게, 정책 프레임은 국지적이고 지역적
-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더라도,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요소들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난제’, ‘사회적 도전’, ‘사회혁신’ 등을 내건 다양한 정책사업들의 경우, 거의 유사한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서로 달라, 정책 목표나 방향성에 따른 적합한 정책 틀과 정책수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양상임
- ‘사회문제’ 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목표에 대한 논의는 취약한 가운데,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연계한 관련 정책사업에서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산업성장 지향적 혁신정책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임
- 해외 ‘social challenge’ 또는 ‘전환적 혁신정책’에서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프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시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지적’ 이고, ‘지역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
○ ‘사회문제’의 특성 및 혁신주체 역량에 따른 개입전략의 차별성 부재
- ‘사회문제해결’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풀어야 할 문제의 범위, 관련 기술의 성숙도, 관련 주체들의 혁신역량 등에 따라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문제해결 지향의 정책사업들에서는 ‘지역’, ‘리빙랩’, ‘사회적 경제주체’ 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음
- 해당 사회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탐구,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탐색과 적용의 기회가 적음
○ 혁신은 기술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혁신’은 혁신본부의 과업이거나,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의 과업으로 여겨지며, 유관부처들은 이와 관련한 부처별 하위 사업계획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전반의 혁신을 궁극적 목표로 둔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정책부문의 정책목표를 전 부처가 공유하여 협업체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혁신’은 과학기술정책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혁신’은 기술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정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거시적 정책 디자인은 취약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탄소중립 2050 등 거시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각 부문별(보건/복지/교육/산업 등) 정책과제들 간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못함 (각 부문별 정책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기존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관행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업 또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인 문제발굴과 보완이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 기술개발 성과확산 측면에서도 공공서비스 공급채널을 활용한 ‘제품보급’에 치중하여,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구축(인재양성, 시장형성, 혁신적 기업육성 등)은 간과됨
- 시장실패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채널(공적시장)을 활용한 초기시장형성이 필요하나, 이는 과도기적 정책수단임
- 민간시장 형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기업을 공적시장 영역에 안주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 실험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모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밀한 실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산출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니치확장’ 에 있어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실험공간으로 리빙랩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리빙랩의 결과가 연구계와 산업계의 main stream에 수용되기 위한 ‘실증’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
○ 또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회적 경제, 시민참여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산주체, 제도시행 주체, 제도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주체 들과의 연합도 유효한 전략임이 간과된 측면이 있음
○ 한국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관행에서는 ‘성찰적’ 정책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
□ ‘성찰적’ 정책관행의 정착과 ‘니치확장’에 관한 해외사례 고찰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고찰
- 정책평가를 통한 성찰성 제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hG ISI)의 FONA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독일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사례 제시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의 중요성 : 독일 에너지시스템 전환 실증사업(EUREF)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례 제시
○ 특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리빙랩 구축과 운영전략 모색이 필요함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이 리빙랩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만한 ‘신뢰받는’ 연구성과 도출
4.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부문의 정책수단은 하드웨어 중심의 R&D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법의 적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마련 등 무형의 ‘지식 창출·공유’를 위한 자원배분과 성과확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 기술이 개발되면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기술공급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
- ‘사회문제해결’ 과 관련한 기술개발에서는 기술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현상, 사회구성원의 수요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병행될 때 문제해결에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음
○ 미래 장기전망 속에서 진행되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형 정책사업이라면, 리빙랩의 기능을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
- 기존에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기술 및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리빙랩은 ‘니치확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의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을 구축하여, ‘대규모 실증’을 수행해야 함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가 실제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증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신뢰할 만한’ 기술 및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림 1] 과학인프라로서의 ‘Real World Lab’
○ 과학기술 R&D 의 결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들과 결합해야 함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한국의 정책관행, 정책 관계자의 행동방식 등을 고려한 정책수단 개발과 목표설정이 필요함
- 유럽 및 선진국의 전환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답습하여, 한국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접근을 지양하고, 한국의 혁신 풍토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정책과 사회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현상, 사회구성원 그룹별 수요의 차이점, 혁신정책이 미치는 사회문화,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영향 분석 등과 같은 사회과학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
-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주도 혁신정책의 관행이 매우 강하여, 정권 교체나 행정부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데,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사업에서는 정책의 장기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됨
- 정부주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수요발굴, 잠재된 부정적 영향의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들(예시)
1. 개요
□ 연구추진 배경
○ EU 및 OECD를 중심으로 서구의 혁신정책학자들은 ‘Innovation for social challenge’ or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Challenge’를 주창하며, 일련의 정책대안과 전략을 내놓고 있음
○ 이들에 의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빈곤, 자살 등 현대사회 삶의 질 저하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가능성 향상’,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확실히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의 정책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가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 사회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임무중심의 정책 시행 (mission oriented policy)
-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새로운 문제해결방법탐색을 위한 리빙랩 확산,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혁신적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시장진출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수요 발굴 등이 제안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거버넌스, 정부부처 산하기관 역량강화 등이 제시됨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때부터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대응을 국가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 관료,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혁신본부의 설립과 더불어 ‘혁신정책’과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대응’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
○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도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정책적 화두가 되어 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혁신’ 이 주요 혁신정책의 목표로 등장함
- (예시) ‘혁신’을 통한 고령화 대응
· 돌봄경제 육성전략,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혁신’과 ‘포용’을 연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조기기 기술개발, AI/IoT 등이 결합된 제품 보급 등이 있음
○ 또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기획과 사업추진 시도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협력사업‘ , ’미세먼지대응사업‘, 고령화 대응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돌봄로봇개발사업‘ 등
□ 연구목적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틀(프레임)을 가져야 할지를 기존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주로 해외자료에 의존하여 도출된 정책프레임이 한국에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기초작업으로서 한국의 정책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함
- 한국에서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혁신정책사업들이 수립/시행되는 관행과 그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표
○ 정부가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을 통해 산업창출, 사회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이론적 검토
○ 사회기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의 틀(프레임) 제시 및 한국의 정책관행 예시
○ 향후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있어 견지해야 할 관점과 연구주제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리뷰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리뷰
-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른 혁신정책프레임의 변화
- 니치창출 및 확장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목적, 적용사례 등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의 주요 동향 및 연구계의 논의 초점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주요 국내 정책 이슈 : 정부측에서 제기한 이슈 및 연구계에서 제기한 이슈
- 국가 기본계획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
-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
-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과 이를 실행하는 정책관행
- ‘혁신’과 ‘사회문제’ 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프레임 영역별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 제시
- 정책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참고사례 고찰
- 정책평가에 기반한 정책개발 사례 : 독일의 FONA 사업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사업 사례 : 독일의 EUREF 사업
○ 향후 연구주제 제시
3. 연구결과
□ 해외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 논의 리뷰
○ ‘사회적 도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목표를 둠
- EU 와 OECD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사회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은 기술적 도전을 넘어, 사회부문의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는 ‘사회적 도전(social challenge)’ 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환적 혁신정책’ 의 맥락에서 의 프레임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Social Challenge’를 지향하는 정책프레임은 연구개발 및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더 나아가 시민의 소비방식의 변화까지도 촉발시키고자 하는 광범위한 내용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요소로 함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특징
○ 정책목표는 거대하게, 정책 프레임은 국지적이고 지역적
-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더라도,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요소들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난제’, ‘사회적 도전’, ‘사회혁신’ 등을 내건 다양한 정책사업들의 경우, 거의 유사한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서로 달라, 정책 목표나 방향성에 따른 적합한 정책 틀과 정책수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양상임
- ‘사회문제’ 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목표에 대한 논의는 취약한 가운데,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연계한 관련 정책사업에서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산업성장 지향적 혁신정책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임
- 해외 ‘social challenge’ 또는 ‘전환적 혁신정책’에서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프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시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지적’ 이고, ‘지역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
○ ‘사회문제’의 특성 및 혁신주체 역량에 따른 개입전략의 차별성 부재
- ‘사회문제해결’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풀어야 할 문제의 범위, 관련 기술의 성숙도, 관련 주체들의 혁신역량 등에 따라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문제해결 지향의 정책사업들에서는 ‘지역’, ‘리빙랩’, ‘사회적 경제주체’ 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음
- 해당 사회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탐구,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탐색과 적용의 기회가 적음
○ 혁신은 기술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혁신’은 혁신본부의 과업이거나,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의 과업으로 여겨지며, 유관부처들은 이와 관련한 부처별 하위 사업계획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전반의 혁신을 궁극적 목표로 둔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정책부문의 정책목표를 전 부처가 공유하여 협업체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혁신’은 과학기술정책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혁신’은 기술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정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거시적 정책 디자인은 취약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탄소중립 2050 등 거시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각 부문별(보건/복지/교육/산업 등) 정책과제들 간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못함 (각 부문별 정책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기존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관행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업 또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인 문제발굴과 보완이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 기술개발 성과확산 측면에서도 공공서비스 공급채널을 활용한 ‘제품보급’에 치중하여,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구축(인재양성, 시장형성, 혁신적 기업육성 등)은 간과됨
- 시장실패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채널(공적시장)을 활용한 초기시장형성이 필요하나, 이는 과도기적 정책수단임
- 민간시장 형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기업을 공적시장 영역에 안주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 실험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모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밀한 실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산출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니치확장’ 에 있어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실험공간으로 리빙랩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리빙랩의 결과가 연구계와 산업계의 main stream에 수용되기 위한 ‘실증’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
○ 또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회적 경제, 시민참여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산주체, 제도시행 주체, 제도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주체 들과의 연합도 유효한 전략임이 간과된 측면이 있음
○ 한국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관행에서는 ‘성찰적’ 정책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
□ ‘성찰적’ 정책관행의 정착과 ‘니치확장’에 관한 해외사례 고찰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고찰
- 정책평가를 통한 성찰성 제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hG ISI)의 FONA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독일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사례 제시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의 중요성 : 독일 에너지시스템 전환 실증사업(EUREF)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례 제시
○ 특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리빙랩 구축과 운영전략 모색이 필요함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이 리빙랩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만한 ‘신뢰받는’ 연구성과 도출
4.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부문의 정책수단은 하드웨어 중심의 R&D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법의 적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마련 등 무형의 ‘지식 창출·공유’를 위한 자원배분과 성과확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 기술이 개발되면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기술공급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
- ‘사회문제해결’ 과 관련한 기술개발에서는 기술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현상, 사회구성원의 수요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병행될 때 문제해결에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음
○ 미래 장기전망 속에서 진행되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형 정책사업이라면, 리빙랩의 기능을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
- 기존에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기술 및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리빙랩은 ‘니치확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의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을 구축하여, ‘대규모 실증’을 수행해야 함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가 실제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증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신뢰할 만한’ 기술 및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림 1] 과학인프라로서의 ‘Real World Lab’
○ 과학기술 R&D 의 결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들과 결합해야 함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한국의 정책관행, 정책 관계자의 행동방식 등을 고려한 정책수단 개발과 목표설정이 필요함
- 유럽 및 선진국의 전환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답습하여, 한국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접근을 지양하고, 한국의 혁신 풍토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정책과 사회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현상, 사회구성원 그룹별 수요의 차이점, 혁신정책이 미치는 사회문화,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영향 분석 등과 같은 사회과학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
-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주도 혁신정책의 관행이 매우 강하여, 정권 교체나 행정부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데,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사업에서는 정책의 장기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됨
- 정부주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수요발굴, 잠재된 부정적 영향의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들(예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projects for the 'social challenge' were examined, and second,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it was attempted to explore a policy frame suitable for the social challeng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olicy frame for the social challenge is still dependent on theoretical research on innovation policies or the results of discussions centered on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as the third task, we tried to examine the policy tools involved in operating this frame in Korea and the policy practices to implement it.
The combi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and 'social problem' seems to be very focu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In many ‘social challenge’ policy projects, ‘creation of new industries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ppears as a policy goal. In addition, 'social wicked problems', 'social transformation', and 'solution of social problems' have almost similar policy directions and are progressing within a similar policy framework. Rather than a macro-policy frame that seeks to change the lifestyle and production method of society as a whole, the focus is on solving “local” problems. The policy frame aiming at a social challenge consists of a wide range of contents and a long-term roadmap that aims to trigger not only the structure of R&D and industry, but also changes in scientific knowledge and industrial production methods, and even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itizens.
There are three common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s for social challenge to the Korean political scene.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partial introduction of anticipatory policy governance through stakeholder consultation, it has not been able to deviate from the policy decision-making method by government official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econd, the feedback system of evaluation-planning, which revises policy project goals and strategies through policy evaluation, is weak. Third, the living lab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as an experimental space for social challenge, but the results of the living lab are not being accepted by the main stream of research and industry.
If the policy to promote the interconnection of the 'social challenge' is focused on expanding investment in R&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hanging the support method, and promoting the linkage to commercializ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so far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the social challeng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cover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inuously cause 'social problems' and to chang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In addition, efforts to implement anticipatory policy planning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on the premise of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innovation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the necessity of a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ging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mid-2000s. Since then, 'green growth'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creative economy' p...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the necessity of a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ging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mid-2000s. Since then, 'green growth'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creative economy'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ve also become the policy topic of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innovation'. ' has emerged as the goal of major innovation policies. As such, ‘social problem’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Korea’s innovation policy.
In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projects for the 'social challenge' were examined, and second,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it was attempted to explore a policy frame suitable for the social challeng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olicy frame for the social challenge is still dependent on theoretical research on innovation policies or the results of discussions centered on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as the third task, we tried to examine the policy tools involved in operating this frame in Korea and the policy practices to implement it.
The combi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and 'social problem' seems to be very focu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In many ‘social challenge’ policy projects, ‘creation of new industries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ppears as a policy goal. In addition, 'social wicked problems', 'social transformation', and 'solution of social problems' have almost similar policy directions and are progressing within a similar policy framework. Rather than a macro-policy frame that seeks to change the lifestyle and production method of society as a whole, the focus is on solving “local” problems. The policy frame aiming at a social challenge consists of a wide range of contents and a long-term roadmap that aims to trigger not only the structure of R&D and industry, but also changes in scientific knowledge and industrial production methods, and even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itizens.
There are three common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s for social challenge to the Korean political scene.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partial introduction of anticipatory policy governance through stakeholder consultation, it has not been able to deviate from the policy decision-making method by government official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econd, the feedback system of evaluation-planning, which revises policy project goals and strategies through policy evaluation, is weak. Third, the living lab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as an experimental space for social challenge, but the results of the living lab are not being accepted by the main stream of research and industry.
If the policy to promote the interconnection of the 'social challenge' is focused on expanding investment in R&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hanging the support method, and promoting the linkage to commercializ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so far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the social challeng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cover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inuously cause 'social problems' and to chang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In addition, efforts to implement anticipatory policy planning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on the premise of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innovation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5
- 요약 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5
- 제2장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 제1절 혁신정책 틀(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 1. 기존 문헌 리뷰 9
- 2. 쟁점 27
- 제2절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32
- 1. 전환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리뷰 32
- 2. 전환 관리 개요 34
- 3. 전략적 니치관리 35
- 4. 시장의 전환 42
- 5. 이해관계자 참여 및 리빙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 제3장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52
- 제1절 주요 정부 계획에서 나타난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52
- 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52
-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 현황 65
- 1. 국가 상위 계획 상에서 제시된 고령화 대응 정책목표와 비전 65
- 2. 고령화 대응 추진전략 66
- 3. 고령화 대응 주요 정책과제 72
- 4. 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계에서의 논의 78
- 제3절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80
- 1. 정부 계획에 대한 논의 80
- 2. 사회문제해결 혁신정책 프레임과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82
- 3. 시사점 84
- 제4장 ‘성찰성 강화’와 ‘니치확장’을 위한 정책수단 적용 사례 8
- 제1절 ‘사회전환’을 위한 정책프레임의 유연성과 성찰성 향상을 위한 기제 : 독일의 FONA 88
- 1. 소개 88
- 2. FONA 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결과로 살펴 본 성과 93
- 3. 시사점 101
- 제2절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갖는 의미와 쟁점 103
-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의 기능 103
- 2. 에너지시스템전환을 위한 실증: 독일 EUREF 106
- 제5장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관행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주제 113
- 제1절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과 정책관행 113
- 1. 프레임과 정책관행 113
- 2. 전환정책 프레임에 비춰 본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32
- 3. 정책관행 고찰의 시사점 137
- 제2절 종합 및 향후 연구주제 142
- 1.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연구 143
- 2. 리빙랩에 대한 연구 주제 146
- 3.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 사업의 혁신적 효과에 대한 연구 150
- 4. 정부의 공공시장 창출의 리스크 154
- 참고문헌 159
- Summary 171
- Contents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