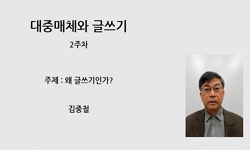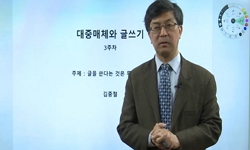3.1운동 이후 신문 및 잡지의 출판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지면도 증가했다. 특히 1930년대는 소위, “레코드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면서 대중예술계에 종사하는 인물들에 대한 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1930년대 한국음반산업에서 활용된 여성예술인들의 이미지 연구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88148
- 저자
-
발행기관
-
-
발행연도
2018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1930년대 음반산업 ; 1930‘s Record Industry ; gramophone record ; mass media ; female records ; female singers ; actress ; female Image ; The Good Housewife Ideology ; 유성기음반 ; 대중매체 ; 여성음반 ; 여가수 ; 여배우 ; 여성 이미지 ;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따라서 본 연구는 1930년대에 음반을 취입한 여가수 및 여배우 가운데 배우 출신으로 유행가 음반을 남긴 이애리수와 전옥, 1930년대 최고의 인기가수였던 평양기생 출신 가수, 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 등 다섯 명의 여성 대중예술인을 중심으로 당시 미디어 권력이 표상하고자 했던 여성 이미지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당시 레코드회사 문예부에서는 전국 각지로부터 유행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대중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던 배우 출신 및 기생 출신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안정적인 레코드시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의 대중들의 심성에 맞는 ‘조선적인 정조’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의 가난했던 배경, 그들의 가냘프고 애상적인 목소리 등이 적절히 결합되고 있었다.
당시 대중잡지에서는 여성 레코드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에게 동정과 연민을 일으키는 서사(이야기)를 만듦으로해서 가난한 출생 배경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레코드 가수가 되었다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 예술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스위트 홈을 향한 욕망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음반산업의 토대적인 구조가 부실한 상태에서 초국가적 양상을 띤 매체가 일본을 통해 밀려들어 오면서 당시 조선의 도시민들은 글로벌에 대한 상상력만 확장시킨 채 자신이 자리잡을 주체적 시선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식민지 경성의 문화풍경은 대중매체의 위력이 가시화되고 이에 맞추어 조선인 예술가의 참여와 성장이 있었지만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던 식민지 근대성의 한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신문 및 잡지의 출판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지면도 증가했다. 특히 1930년대는 소위, “레코드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면서 대중예술계에 종사하는 인물들에 대한 기획기사가 많이 실렸다. 이 가운데 여성 대중예술인들에 대한 기사는 이들의 사생활- 출신배경, 몸매, 캐스팅된 동기 등-에 집중하는 가십성 기사가 많았다. 그런데 당시 대중지에서는 여성예술인들을 묘사할 때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령, “눈물의 여왕”, “민요의 공주” 등 여성적이고도 슬픈 애상적 이미지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0년대에 음반을 취입한 여가수 및 여배우 가운데 배우 출신으로 유행가 음반을 남긴 이애리수와 전옥, 1930년대 최고의 인기가수였던 평양기생 출신 가수, 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 등 다섯 명의 여성 대중예술인을 중심으로 당시 미디어 권력이 표상하고자 했던 여성 이미지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당시 레코드회사 문예부에서는 전국 각지로부터 유행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대중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던 배우 출신 및 기생 출신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안정적인 레코드시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의 대중들의 심성에 맞는 ‘조선적인 정조’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의 가난했던 배경, 그들의 가냘프고 애상적인 목소리 등이 적절히 결합되고 있었다.
당시 대중잡지에서는 여성 레코드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에게 동정과 연민을 일으키는 서사(이야기)를 만듦으로해서 가난한 출생 배경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레코드 가수가 되었다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 예술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스위트 홈을 향한 욕망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음반산업의 토대적인 구조가 부실한 상태에서 초국가적 양상을 띤 매체가 일본을 통해 밀려들어 오면서 당시 조선의 도시민들은 글로벌에 대한 상상력만 확장시킨 채 자신이 자리잡을 주체적 시선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식민지 경성의 문화풍경은 대중매체의 위력이 가시화되고 이에 맞추어 조선인 예술가의 참여와 성장이 있었지만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던 식민지 근대성의 한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u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uthority of mass media in 1930s generalised women as weak, pathetic, and desperate existence by providing examples of Gisaeng musicians & Actress such as Wang-Su-Bok, Sun-Wu-Il-Sun, and Kim-Bok-Hee, Jeon-Ok, Lee-Ae-Ri-Su. During that era, record company ‘Munye-Bu’ had a lot of applicants who wanted to become a star, but ‘Munye-Bu’ decided to focus on the proven actors in order to make a guaranteed record industry. Furthermore, it focused on the image of Chosun such as desperate, tragic and poor life in order to buy the attention and sympathy of the public. Popular magazines of the era made sympathising stories in order to advertise the female record musicians, which produced a story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s newspapers and magazines become more active pop-culture was dealt more as well. It was called “Golden age of records” in 1930s, thus a lot of people in pop culture industry became more newsworthy. And the News fo...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s newspapers and magazines become more active pop-culture was dealt more as well. It was called “Golden age of records” in 1930s, thus a lot of people in pop culture industry became more newsworthy. And the News focused on the gossips of female artists such as their private life- background, appearances, and the reasons why they were casted. At that time, female artists were portrayed by a specific image. For instance, they were portrayed as a sad and desperate character such as “queen of tears”, “princess of folksong” and et cetera.
Thu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uthority of mass media in 1930s generalised women as weak, pathetic, and desperate existence by providing examples of Gisaeng musicians & Actress such as Wang-Su-Bok, Sun-Wu-Il-Sun, and Kim-Bok-Hee, Jeon-Ok, Lee-Ae-Ri-Su. During that era, record company ‘Munye-Bu’ had a lot of applicants who wanted to become a star, but ‘Munye-Bu’ decided to focus on the proven actors in order to make a guaranteed record industry. Furthermore, it focused on the image of Chosun such as desperate, tragic and poor life in order to buy the attention and sympathy of the public. Popular magazines of the era made sympathising stories in order to advertise the female record musicians, which produced a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