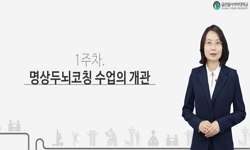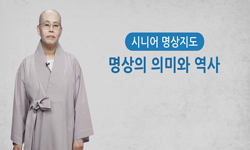현재 한국불교의 주류는 선종이고 그 중에서도 간화선이 정통적 수행방법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간화선 이외의 수행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수행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대 한국불교 명상수행 문화의 종교학적 의미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담론을 중심으로(프리프린트)
한글로보기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삼국시대 이래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선종은 한국불교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중 당, 송을 거쳐 확립된 간화선의 공안 즉 화두선은 고려 보조 지눌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이래 현대 한국 조계종의 중심 명상수행법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금 한국불교 집안 내 깨침의 방법(수행론)에 조용한 반란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껏 주도적 입장을 고수한 간화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거해 스님의 안내로 미얀마의 우판디타 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 스님이 체계화한 위파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한 이래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부 스님과 지식층, 재가자들 사이에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서울 시내와 근교 그리고 지방에 이르기까지 위빠사나를 가르치는 선원이나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절에서는 불교의식에까지 남방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이전에 간화선 즉 화두를 참구하는 스님일지라도 요가나 단전호흡, 국선도, 기공과 같은 도가적 수련법을 병행하는 스님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정통 간화선 수행자들은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고 있는 다양한 불교 내·외적 수행문화에 스님이나 재가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현상에 대한 고찰은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현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우선 명상수행이라는 실천적인 행위가 종교의 구성 요소로서 어떠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종교학적 안목에서 살펴본 뒤,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과 관련된 담론을 교차 문화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요컨대 선불교(禪佛敎)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불교는 기복의 성격을 띠는 정토 계열의 염불 신앙이나, 간화선과 같은 구도적인 신행(信行), 범사회적 성격을 띠는 개벽형의 신행,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신행 현장에서는 중층적이고 매우 복합적인 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한국 간화선의 발생 배경과 현대 한국불교의 간화선이 조사선 전통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살펴보고, 남방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현시점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를 간화선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한국불교의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비교종교학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물론 고전적 비교방법론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비교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불교 명상수행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대일의 비교방법은 비교종교학의 가장 초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연구방법인데, 이는 큰 소득을 가져다주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오류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리, 개념 하나라도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상 유사하다고 하여 단순비교를 감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비교연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고의 논제를 다루어 가고자 한다. 즉 비교작업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동일성과 차이성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여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을 것, 비교 대상과 비교 주체가 놓여 있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철저히 인식할 것, 비교연구의 전제와 결과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수행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논제를 고찰하도록 의식적 작업의 긴장을 놓지 않았다.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는 선종이고 그 중에서도 간화선이 정통적 수행방법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간화선 이외의 수행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계 주류 특히 전통불교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측(조계종)에서는 간화선만이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행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때로 간화선 수행법의 유용성 혹은 절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교계 주류의 반응은 이들과 대화하기보다 간화선이 한국불교의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점인양 간화선 수행의 우수성만을 피력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수행법인 간화선을 통한 조계종의 한국불교 주도적 자의식이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현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시대 이래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선종은 한국불교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중 당, 송을 거쳐 확립된 간화선의 공안 즉 화두선은 고려 보조 지눌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이래 현대 한국 조계종의 중심 명상수행법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금 한국불교 집안 내 깨침의 방법(수행론)에 조용한 반란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껏 주도적 입장을 고수한 간화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거해 스님의 안내로 미얀마의 우판디타 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 스님이 체계화한 위파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한 이래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부 스님과 지식층, 재가자들 사이에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서울 시내와 근교 그리고 지방에 이르기까지 위빠사나를 가르치는 선원이나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절에서는 불교의식에까지 남방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이전에 간화선 즉 화두를 참구하는 스님일지라도 요가나 단전호흡, 국선도, 기공과 같은 도가적 수련법을 병행하는 스님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정통 간화선 수행자들은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고 있는 다양한 불교 내·외적 수행문화에 스님이나 재가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현상에 대한 고찰은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현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우선 명상수행이라는 실천적인 행위가 종교의 구성 요소로서 어떠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종교학적 안목에서 살펴본 뒤,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과 관련된 담론을 교차 문화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요컨대 선불교(禪佛敎)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불교는 기복의 성격을 띠는 정토 계열의 염불 신앙이나, 간화선과 같은 구도적인 신행(信行), 범사회적 성격을 띠는 개벽형의 신행,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신행 현장에서는 중층적이고 매우 복합적인 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한국 간화선의 발생 배경과 현대 한국불교의 간화선이 조사선 전통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살펴보고, 남방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현시점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를 간화선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한국불교의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비교종교학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물론 고전적 비교방법론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비교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불교 명상수행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대일의 비교방법은 비교종교학의 가장 초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연구방법인데, 이는 큰 소득을 가져다주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오류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리, 개념 하나라도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상 유사하다고 하여 단순비교를 감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비교연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고의 논제를 다루어 가고자 한다. 즉 비교작업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동일성과 차이성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여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을 것, 비교 대상과 비교 주체가 놓여 있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철저히 인식할 것, 비교연구의 전제와 결과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수행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논제를 고찰하도록 의식적 작업의 긴장을 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