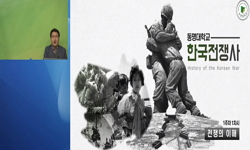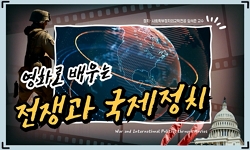이 논문은 냉전 시대 진영 간 단절이 심화되는 중에 제작된 영화 <모란봉:한국의 모험>(1960)을 둘러싼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 영화를 신생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랑스 지식인들과 전후 북한의 조우, 영화 <모란봉>(1960) = French Intellectuals’ Encounter with Postwar North Korea, the Film Moranbong (1960)
한글로보기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냉전 시대 진영 간 단절이 심화되는 중에 제작된 영화 <모란봉:한국의 모험>(1960)을 둘러싼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 영화를 신생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서구 지식인들의 매혹과 북한의 국제적 문화 교류의시도가 만난 사건으로 다룬다. 북한-프랑스 합작영화 <모란봉>은 북한과 사회주의권 국가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들과 달리, 비수교 국가인 프랑스와의 제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북한은 프랑스 지식인들을 통해 서방에 ‘북한의 진면모’ 를 전하겠다는 취지로 영화의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영화는 북한 각지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재현하는 데에 큰 비중을두었으며, 와이드스크린이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스펙타클한 북한을 보여주고자 시도했다. 또한 영화에 삽입된 창극 <춘향전>은 두 주인공의 상황과 분단상태의 한반도를 유비하며, 공중폭격 중에도 <춘향전>이 공연되는 모란봉지하극장은 재건과 최후의 승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얻는다. 영화는 전쟁 중 북한의 상황을 전달하는 매개자로 프랑스에서 온 기자를 전략적으로 위치시켰다. 1958 년의 북한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프랑스와 북한 사이 진영을 가로지른 합작은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긴장과 협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춘향전> 을 변주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제시한 영화 <모란봉>에서 한국전쟁은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던 역사적장소로서, 한반도를 넘어 다른 전쟁들과 보편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construct the context surrounding Moranbong, une aventure coréenne (1960), a cinematic endeavor that transpired amidst the escalating schism of the Cold War era, this paper examines the film as an event in which Western intellectuals’...
In order to reconstruct the context surrounding Moranbong, une aventure coréenne (1960), a cinematic endeavor that transpired amidst the escalating schism of the Cold War era, this paper examines the film as an event in which Western intellectuals’ fascination with the emerging Asian socialist state encountered North Korea’s endeavors in international cultural interchange. Unlike other examples of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cialist countries, this North Korean-French co-production stands out due to its unconventional partnership with France, a non-diplomatic country. North Korea was ardently instrumental in facilitating the film’s creation, driven by its aim to impart ‘the veritable essence of North Korea’ to Western audiences through the conduit of French intellectuals. The film focuses heavily on recreating North Korea’s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through location shooting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attempts to showcase a spectacular North Korea through a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of wide-screen. Moreover, the traditional Korean opera Chunhyangjeon, which is embedded in the film, parallels the situation of the two protagonists and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Within this cinematic framework, the Moranbong Underground Theater, where Chunhyangjeon is performed even during aerial bombardment, acquires profound symbolic significance as a locus of reconstruction and ultimate triumph. Notably, the film strategically situates a French journalist as a pivotal mediator who understands and convey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war. In the specific time and space of North Korea in 1958, co-production between France and North Korea created a space of tension and negotiation in a clash of ideological interests. In Moranbong, which presents a different version of the Korean War through a variation on Chunhyangjeon, the Korean War is connected on a universal level to other war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s a historical site where people had to find a reason to live in inevitable Grenzsitu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초머 모세,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 학자 북한을 만나다 : 쇠베니 얼러다르의 1980년대 북한 문화에 관한 기억들" 노스모스 2015
2 김보국, "헝가리 외교문서로 본 북한의 문예" 선인 2016
3 박소영, "한국전쟁 이후 개성주민의 삶의 변화 연구" 인문학연구원 66 : 197-233, 2016
4 정명환,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5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6 한상언, "칼라영화의 제작과 남북한의 <춘향전>" 구보학회 (22) : 571-599, 2019
7 편집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예술인들의 결의" 1958
8 아르망 가티, "오늘의 조선을 그리려고" 1958
9 송미경, "영화 <모란봉>(1958)과 음반
10 알망 가띠, "연출 대본:예술영화 <모란봉>"
1 초머 모세,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 학자 북한을 만나다 : 쇠베니 얼러다르의 1980년대 북한 문화에 관한 기억들" 노스모스 2015
2 김보국, "헝가리 외교문서로 본 북한의 문예" 선인 2016
3 박소영, "한국전쟁 이후 개성주민의 삶의 변화 연구" 인문학연구원 66 : 197-233, 2016
4 정명환,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5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6 한상언, "칼라영화의 제작과 남북한의 <춘향전>" 구보학회 (22) : 571-599, 2019
7 편집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예술인들의 결의" 1958
8 아르망 가티, "오늘의 조선을 그리려고" 1958
9 송미경, "영화 <모란봉>(1958)과 음반
10 알망 가띠, "연출 대본:예술영화 <모란봉>"
11 편집부, "불란서 영화인들이 제작하는 광폭 예술영화 <모란봉>(가제)" 1958
12 정태수, "북한영화의 국제 교류 관계 연구(1945-1972):소련⋅동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86) : 77-113, 2020
13 유 우,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사:1945~1955" 박이정 2018
14 LIU YU,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1956~1966)" 비교문화연구소 59 : 137-196, 2020
15 이준엽 ; 한상언,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형성과정과 특징(1950-1957)" 현대영화연구소 14 (14): 111-140, 2018
16 이준엽 ; 함충범, "북한 영화의 컬러‧와이드스크린 담론 전개 과정 연구 (1957~1966)" 한민족문화학회 70 (70): 203-234, 2020
17 크리스 마커, "북녘 사람들" 눈빛 2008
18 김일환, "미군 푸티지 영상으로 본 한국전쟁 포로교환과 그 이면" 역사문제연구소 26 (26): 221-257, 2022
19 Jean-Claude Bonnardot, "모란봉(Moranbong, une aventure coréenne)"
20 문지영, "냉전초기 프랑스 공산주의 지식인들과 반미주의, 1947-1957" 한국미국사학회 26 : 125-157, 2007
21 고자연,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서만일의 인도기행 (1957)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소 (66) : 309-339, 2022
22 노지승, "남북한 춘향전 영화를 통해 본 <춘향전>의 국민문학적 의미" 국문학회 (34) : 115-146, 2016
23 모순영,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24 배인교, "국립민족예술단과 북한의 민족음악" 국립국악원 (47) : 275-297, 2023
25 안영일, "국립민족예술극장의 빛나는 길" 1956
26 송미경, "『조선창극집』 및 『조선민족음악전집(초고)』 수록작 비교로 본 1950년대 북한 창극 <춘향전>의 양상" 동아시아고대학회 (64) : 67-110, 2021
27 김은정, "『문학예술』에 나타난 폭격의 서사 ― 한국전쟁기 미국 폭격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소 (54) : 443-474, 2014
28 전우형, "“평양 로케이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는 사람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31) : 103-127, 2021
29 김성수, "‘한국-조선’ 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 서만일, 김창석의 복권·복원" 민족문학사연구소 (76) : 191-223, 2021
30 Jean-Pierre Thibaudat, "«Moranbong»:l’incroyable histoire du premier film franco-nord-coréen"
31 Bruce Cumings, "Violet Ashes : A Tribute to Chris Marker" 23 (23): 2015
32 Claude Lanzmann, "The Patagonian Hare:A Memoir" Farrar, Straus and Giroux 2012
33 David Caute, "The Fellow-travellers : Intellectual Friends of Communism" Yale University Press 1988
34 Elena Razlogova, "The Cultural Cold War and the Global South" Routledge 2023
35 Paul Hollander, "Political Pilgrims:Travels of Western Intellectuals to the Soviet Union, China, and Cuba 1928-1979"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36 Antoine Coppola, "Moranbong, un film français en Corée du Nord" 19 (19): 2011
37 Mark Morris, "Korean Screen Cultures:Interrogating Cinema, TV, Music and Online Games" Peter Lang Ag 2015
38 Georges Sadoul, "Histoire du cinéma mondial : Des origines à nos jours" Flammarion 1963
39 Chris Marker, "Coréennes" Noonbit Publishing 2008
40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41 Antoine Coppola, "Ciné-voyage en Corée du Nord : l’expérience du film Moranbong" Atelier des cahiers 2012
42 Agnieszka Sobocinska, "Australian fellow-travellers to China : devotion and deceit in the People’s Republic" 32 (32): 2008
43 Dorothy Knowles, "Armand Gatti’s Two Theatres:‘Théátre Institutionnel’and ‘Théátre d’Intervention’" 49 (49): 1995
44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45 박유리, "1958년 북한 모스크바 유학생 ‘집단 망명’ 사건, 그 후"
46 WANG FEIYAN,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춘향전」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민족어문학회 (71) : 95-124, 2014
47 이지수, "1950년대 재소 유학생의 소련 망명 사건과 북한의 폐쇄체제 강화 : 허웅배의 미출간 회고록과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서한을 중심으" 한국세계지역학회 38 (38): 49-78, 2020
48 쟝크로드 보날드, "120분간에 이야기 할 진실" 1958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과학과 계몽 사이: 1900년대의 「해저여행(기담)」과 동아시아 수용 계보 -『태극학보』의 평역(評譯) 실천을 중심으로-
-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역사첩
- 2023
- KCI등재
-
식민지의 기억:남성수난사와 실패한 관계들-1960년대 식민지기 회고서사 최정희 『인간사』와 손소희 『남풍』 다시 읽기-
-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강지윤
- 2023
- KCI등재
-
1980년대 초중반 핵전쟁의 위험, 핵전쟁 서사의 인류 종말과 핵 불감증- 구드룬 파우제방 『핵전쟁 뒤의 최후의 아이들』과 팀 오브라이언 『핵무기 시대(그래도 살고 싶다)』
-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이행선
- 2023
- KCI등재
-
포스트구조주의적 서사의 조건 고찰: 배수아의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2019)를 경유하여
-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이인표
- 2023
- KCI등재




 KCI
KCI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