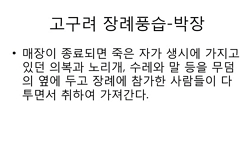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 of actual dresses of early times of Yi-dynasty based on Joˇgori(저고리), the upper garment of Korean traditional dress(한복), which is conserved at Chungbuk University Museum. The social behaviour of dressing in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8674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 1985
-
발행연도
198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81.30911 판사항(3)
-
DDC
391.095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3 p.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ze of Joˇgori investigated was 1.6 times as large as that of modern Joˇgori except several parts such as sleeve length(화장), rear collar(고데) and collar lengths (동정길이). However, the ratios of each part relative to the whole length of Joˇgori were similar with those of modern Joˇgori.
Although it has generally been reported on the material of ancient Joˇgori that the outer cloth is composed of silk and the line is solely composed of silk or cotton, it was found that blends of silk and cotton were also used as the line of Joˇgori which is supposed to be made in 16th and 17th centries. It was also found that inter-weaving of textile was carried out after dyeing of threa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 of actual dresses of early times of Yi-dynasty based on Joˇgori(저고리), the upper garment of Korean traditional dress(한복), which is conserved at Chungbuk University Museum. The social behaviour of dressing in the early times of Yidynasty was estimat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Joˇgori made in the vicinity of Imjinwaeran(임진왜란).
The size of Joˇgori investigated was 1.6 times as large as that of modern Joˇgori except several parts such as sleeve length(화장), rear collar(고데) and collar lengths (동정길이). However, the ratios of each part relative to the whole length of Joˇgori were similar with those of modern Joˇgori.
Although it has generally been reported on the material of ancient Joˇgori that the outer cloth is composed of silk and the line is solely composed of silk or cotton, it was found that blends of silk and cotton were also used as the line of Joˇgori which is supposed to be made in 16th and 17th centries. It was also found that inter-weaving of textile was carried out after dyeing of thread.
국문 초록 (Abstract)
고증학적으로, 어떤 사실의 확실한 연대기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현상 또는 현상군에 대한 고찰에 의해 고도의 개연성에 도달하는 일은 가능하다.
따라서, 임진왜란 전후에 만들어진 저고리의 특징을 조사하여 조선초기의 사회적인 복식행위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불시의 결합의 일종인 무덤에 수맥이 형성되어 부식되기 쉬운 실물 복식이 보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존된 실물 복식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저고리는 현대의 저고리보다 약 1.6배 컸으나 신체적인 제한성이 있는 부분, 즉, 화장, 고데, 동정길이 등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저고리 전장에 대한 각 부위의 비율은 현대 저고리와 유사하였다.
봉재상의 특징에서는, 과거 저고리의 대부분의 경우 겉감은 명주로, 안감은 무명이나 명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16세기 내지 17세기에 만들어진 저고리의 안감에는 무명과 명주의 혼방도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통설과는 달리 선염후 제직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중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저고리를 통하여 조선초기 실물복식의 특징을 유추한 것이다. 고증학적으로, 어떤 사실의 확실한 연대기를 추정하는 것...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중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저고리를 통하여 조선초기 실물복식의 특징을 유추한 것이다.
고증학적으로, 어떤 사실의 확실한 연대기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현상 또는 현상군에 대한 고찰에 의해 고도의 개연성에 도달하는 일은 가능하다.
따라서, 임진왜란 전후에 만들어진 저고리의 특징을 조사하여 조선초기의 사회적인 복식행위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불시의 결합의 일종인 무덤에 수맥이 형성되어 부식되기 쉬운 실물 복식이 보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존된 실물 복식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저고리는 현대의 저고리보다 약 1.6배 컸으나 신체적인 제한성이 있는 부분, 즉, 화장, 고데, 동정길이 등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저고리 전장에 대한 각 부위의 비율은 현대 저고리와 유사하였다.
봉재상의 특징에서는, 과거 저고리의 대부분의 경우 겉감은 명주로, 안감은 무명이나 명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16세기 내지 17세기에 만들어진 저고리의 안감에는 무명과 명주의 혼방도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통설과는 달리 선염후 제직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초록 = II
- Ⅰ. 서론 = 1
- Ⅱ. 복원의 의의 및 유물의 실제. = 4
- 1. 복원의 의의. = 4
- 목차 = I
- 초록 = II
- Ⅰ. 서론 = 1
- Ⅱ. 복원의 의의 및 유물의 실제. = 4
- 1. 복원의 의의. = 4
- 2. 유물보존 및 실제. = 5
- Ⅲ. 조선초기 사회와 저고리 개관 = 11
- 1. 조선초기 사회적 배경 = 11
- 2. 조선초기 저고리 개관 = 18
- Ⅳ. 조선초기 실물저고리 (충북 대학교 박물관 소장 中心) = 22
- 1. 중요성과 발굴경위 = 22
- 2. 능촌리 = 23
- 3. 외남리 = 26
- 4. 초정리 = 33
- 5. 후곡리 = 39
- 6. 막계리 = 58
- Ⅴ. 조사한 저고리의 비교 분석 = 63
- Ⅵ. 결론 = 75
- Ⅶ. 참고문헌 = 81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