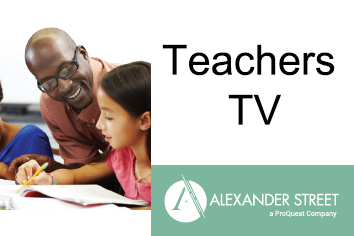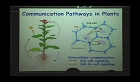본 연구는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논의를 무(巫)계 집안의 공연활동, 특히 그들이 활동했던 유랑연희단체였던 포장극단의 활동을 통해 그 양상을 살폈다. 20세기에도 여전히 무업이 문화의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랑예인의 무(巫)업과 연희활동 -포장극단 연희자 활동을 중심으로- = Shamanic Profession and Theatrical Activity by Wandering Artists -Focused on the Activity by Theatrical Performers in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418549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49-166(18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논의를 무(巫)계 집안의 공연활동, 특히 그들이 활동했던 유랑연희단체였던 포장극단의 활동을 통해 그 양상을 살폈다. 20세기에도 여전히 무업이 문화의 전반에서 주목받는 상황에서, 무(巫)계 집안에서 태어나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연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활동을 주목한 것이다.
이들이 속했던 포장극단은, 이전의 창극단, 여성국극단, 여성농악단에서 활동했던 연희자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포장극단의 연희자들은 권번과 국악양성소에서 판소리와 연극을 배우기도 하고, 포장극단의 활동을 통해서 판소리를 배우고 연극을 익히며, 새로운 연희를 이어갔다. 이들은 무계 집안에서 태어나 무업을 잇던 후손들이 20세기에 무업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콘텐츠로 발전한 현상과 맞물린다.
포장극단에서 활동했던 전남지역의 대표적 연희자로는, 진도 박석화 무계 후손으로 현재국가무형문화재 다시래기 보유자인 강준섭, 경남오광대와 무계후손으로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다시래기 전수조교인 김애선, 해남안초네 무계 후손으로서 전남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보유자 추정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포장극단에서 무계의 연희활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전문예인으로써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참여한 포장극단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은 무(巫)업을 통해 연희를 자연스럽게 체화한 후손으로서 그 역량과 기능을 이어받아, 20세기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변화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무업을 잇는 후손들은 포장극단에서 공연활동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연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mong the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has examined the theatrical activity and characteristic of descendants who continued the shamanic profession and its pattern through the activity by the theatrical c...
The present study, among the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has examined the theatrical activity and characteristic of descendants who continued the shamanic profession and its pattern through the activity by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who was the wandering theatrical group. Under such a situation that the shamanic profession still attracted an attention in overall culture even in 20<sup>th</sup> century, the present study has paid attention on the activity of those who were born in the line of shaman to have made a performance content of various types.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where they belonged was the major activity stage by theatrical performers who were active in previous Changguk Theatrical Company, Women`s Changguk Theatrical Company, and Women`s Nongak Theatrical Company. Theatrical performers in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used to learn Pansori and play at the gisaeng call-office and the training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songs or learn Pansori through the activity by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and mastered the play to continue new theatrical performance. These activities link to the phenomenon developed to a performance content of various types by the descendents who were born in the shaman family to have continued the shamanic profession based on the traditional pattern of shamainc profession in 20<sup>th</sup> century.
Representing theatrical performers in Jeonnam area who were active in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are Kang Joon Seop who is the descendant of shaman line of Jin-do Park Seok Hwa and the holder of Dashiraegi (the funeral play) which is currently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Kim Ae Sun who is the descendant of Gyeongnam Okwangdae (five clowns) and shaman line and the transfer assistant of Dashiraegi, and Chu Jeong Nam who is the descendant of shaman line of Haenam An Cho Ne and the holder of drum beat method for Pansori which is Jeonnam`s intangible cultural asset. Such theatrical activities by the line of shaman in the theatrical company on the road were not exceptional. Later, these people continued various art activities and were appointed fo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continued its tradition as a professional theatrical performer until now.
참고문헌 (Reference)
1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7
2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3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73
4 차하순, "한국사 시대 구분론" 소화 1995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6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7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학교출판 1984
8 양승국,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 인간 2001
9 이미원, "한국 대중극사" 한국연극사학회 6 : 13-, 2003
10 유수영, "포장극단의 연희활동 고찰 - 대본구성을 중심으로 -" 남도민속학회 (32) : 183-202, 2016
1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7
2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3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73
4 차하순, "한국사 시대 구분론" 소화 1995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6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7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학교출판 1984
8 양승국,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 인간 2001
9 이미원, "한국 대중극사" 한국연극사학회 6 : 13-, 2003
10 유수영, "포장극단의 연희활동 고찰 - 대본구성을 중심으로 -" 남도민속학회 (32) : 183-202, 2016
11 유수영, "포장극단의 공연활동으로 본소리꾼의 역할변화 -강준섭의 활동을 통해-" 한국민요학회 44 : 135-149, 2015
12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재미와 극적 갈등" 민속원 2012
13 白賢美, "창극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6
14 윤광봉, "조선후기의 연희" 박이정 1998
15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역락 2008
16 이영배, "전라_윗녘_무풍에 관한 기억과 독해" 24 : 188-, 2012
17 이경엽, "유순자 상쇠와 호남여성농악단" 심미안 2012
18 윤광봉, "유랑예인과 꼭두각시놀음" 밀알 1994
19 유수영, "유랑연희 활동을 통해 본 전통문화콘텐츠 전개 양상-근대 이후 ‘포장극단’을 중심으로-" 남도민속학회 (29) : 205-219, 2014
20 박노홍, "영화시대" 영화시대 4-15, 1964
21 이영배, "여성농악의 문화적 의미망과 위상 재인식" 한국민속학회 61 : 235-265, 2015
22 최승연, "여성국극의 혼종적 특징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원 (49) : 251-283, 2008
23 김기형, "여성국극 6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24 이윤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25 이경엽, "마지막 유랑광대 강준섭 공연대본" 민속원 2017
26 유영대, "도동곡, 창극, 옹기장" 국립문화재연구소 46-, 2013
27 유수영, "근대이후 유랑극단의 공연활동-1950년 이후 ‘포장극단’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61 : 267-288, 2015
28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단체활동과 쇠퇴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27 (27): 1-33, 2011
29 위경혜, "1950년대 ‘굿쟁이’ 이동영사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역사문화학회 15 (15): 197-228, 2012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시 ㆍ 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
- 남도민속학회
- 홍태한 ( Hong Teahan )
- 2017
- KCI등재
-
- 남도민속학회
- 정명철 ( Jeong Myeong-cheol )
- 2017
- KCI등재
-
- 남도민속학회
- 이창식 ( Lee Chang-sik )
- 2017
- KCI등재
-
- 남도민속학회
- 이옥희 ( Lee Ok-hee )
- 2017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3 | 0.33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4 | 1.024 | 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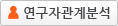
 KCI
KCI KISS
KISS